-

-
태고의 시간들
올가 토카르추크 지음, 최성은 옮김 / 은행나무 / 2019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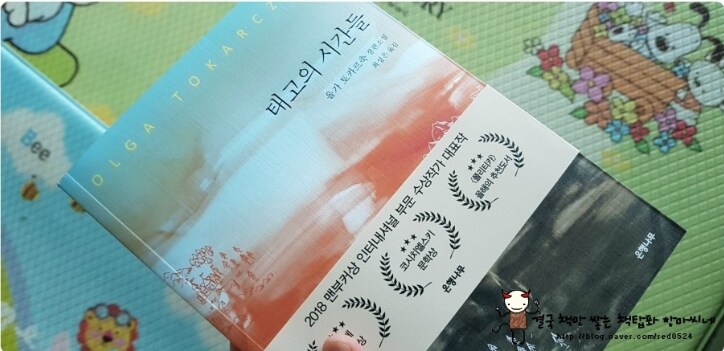
결코 재미없는 책이 아니다. 게다가 읽을수록 뭔가 빠져드는 느낌이 있다. 한 챕터 한 챕터 읽어나갈 수록 비록 등장인물이 헷갈릴때도 있었지만 읽어갈 수록 매력이 있는 책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도가 안나가서 꽤 고생한 책이기도 하다. 지난달부터 얼른 읽을려고 책을 들었는데 몇 장 안 읽었는데도 일주일이 훌떡 가버리고, 가버리고.... 그렇게 서너주를 보낸거 같다. 결국 이 책을 읽는 중간에 도저히 안돼서 (혹은 책태기 올까봐) 다른 책에 눈을 보내는 바람도(?) 피웠더랬다. 분명 의미있고 재미도 없진 않은데 진도가 안빠지는 책.
아, 어쩌면 나는 맨부커상이랑 안 맞는건가? 아마도 한강 역시도 그 상을 받지 않았었나? 나는 진심 그때는 그 책이 이해 안되기도 했고, 그런류의 소설이 싫기도 했었지만 이 책은 그게 아니었는데...... 물론, 완전 이해 안되는 부분도 꽤 있긴 했다. 태고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죽은사람에 대한 이야기,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의인화한 이야기 등등..... 등장인물 한명 한명에 대한 챕터들이 나오는데 거기엔 물건도, 죽은사람의 이야기도, 신의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나름 이름이 헷갈려 누가 누군지 몇페이지 앞으로 돌아가봐야 한다는 거. 그런건 있었지만 읽는 재미 또한 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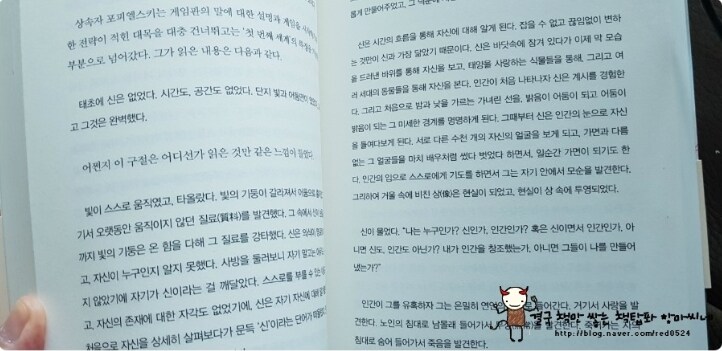
폴란드, 독일, 러시아의 전쟁상황들.... 아무래도 시대상은 제 2차대전 즈음인 듯 하다. 폴란드라는 소설을 잘 접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폴란드의 그 시대적 의미나 상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전쟁에 참여한 그들의 이야기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쟎아 있었다. 러시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독일군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감을 잡지 못했고, 태고라는 마을이 정말 있는 마을인 듯해서 잠시잠깐 헷갈리기도 했고, 신의 이야기를 정말 옆동네 사는 사람처럼 묘사해 놔서 종교이야기인가 싶기도 했던 헷갈린 소설이긴 했다. 하지만, 태고의 이야기는 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김약국의 딸들이나 왕룽일가처럼 몇대에 걸친 한 집안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긴 하다. 물론, 이 곳은 태고라는 마을을 아우르는 이야기긴 하지만 말이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혹은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야기가 이어갈 수록 마치 우리 옛날 전쟁시대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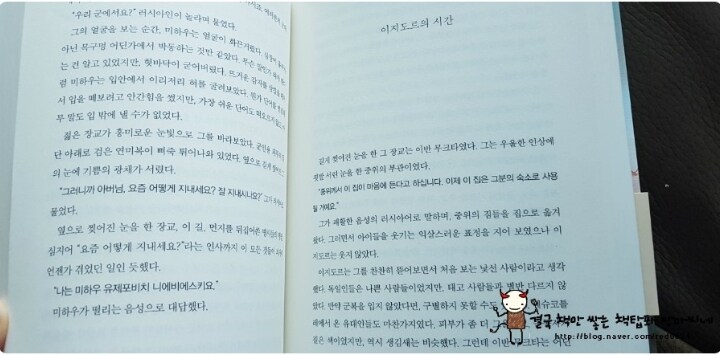
수많은 등장인물중에서 이지도르에게 애정이 갔고, 상속자 포비엘스키던가? 암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영 이해가 안가서 대체 이사람 왜 이러나 싶기도 했다. 분명 본인만의 게임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게임속으로 잠식해 가는 모습은 뭔가 안타깝다 못해 애잔한 느낌까지 갖게 했다. 그는 왜 그렇게 별 것 아닌 게임에 빠져 그 게임을 클리어 하기위해 모든 일생을 바친걸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성격탓인가? 아니면 정말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을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한명한명 누구하나 평범한 인물이 없다. 그런데도 뭔가 우리 시골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보는 듯한 기분은 왜 생기는가 싶기도 하다. 그만큼 친숙한 듯 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등장해 그 시절 폴란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듯한 일상을 들려주는 기분도 들게 한다.
보통은 이런 책 읽고나면 좀 머리가아파서 뭔 메세지를 찾아야 하나? 이런 압박감이 있을때가 있거나 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이 책의 역자후기가 나를 살렸다. 몰랐던 부분도 역자후기에서 나름 자세히 읽고나니 아하~ 싶은 기분. 나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맸는데 역자는 그 걸 캐치해 내서 이야기 하고 있어서 오~ 그런 의미구나. 라며 공감할 수 있었다. 물론 뭐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는건 아니지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해주니 오랜만에 역자후기 길게 써도 짜증 안 난 기분. 그만큼 또 쉽게 읽을만한 책은 아니었던 책이기도 했다. 수많은 삶과 수많은 이야기 공존해서 그 모든것을 머릿속에 담아내자니 머리아프지만 그래도 몇 세대간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관망하며 마치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과 함께 한 기분이 들게 한 책이다. 그러고보니 <백년의 고독>을 이 책 읽고나니 다시 재독하고 싶어지네. 비교하며 읽는 맛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상 받는 다고 내 눈에 다 좋아보이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은 상 받든 안 받든 멋진 책이라는 느낌적인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