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엄마는 이제 미안하지 않아
다부사 에이코 지음, 윤은혜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8년 5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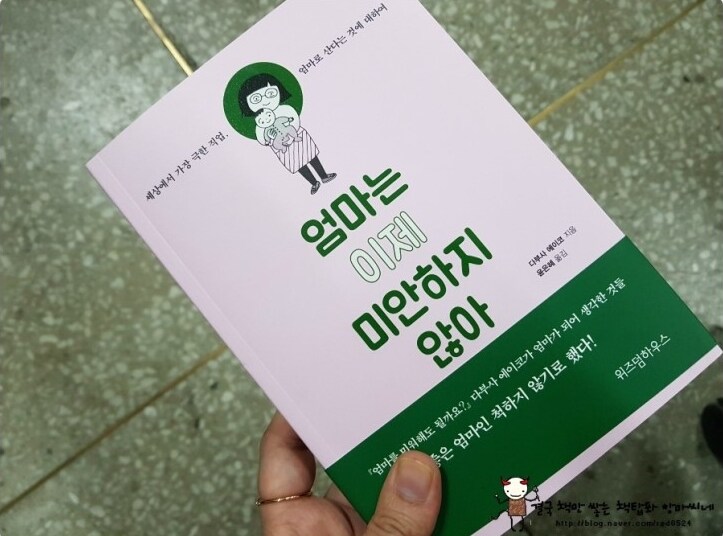
일부러 요즘 이런 책을 찾아 읽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저항(?)하는 느낌의 이런 책을 읽게 된다. 페미를 추구하지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어중간함에 있는 인간인지라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회색분자인데, 요즘은 약간 페미관련 책으로 많이 쏠리는 기분이다. 물론,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나 요즘 여자들이 목소리가 커져가고 "여자란 무엇인가"에서 부터 시작해, "나라는 존재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다보니 여러 사람과의 관계보다 일단은 "나", "여자"에 집중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어쩌면 그동안 소리내 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나 역시도 이런 책을 일부러 찾아 읽는 건 아닌데 여기저기 손이 가게 된다.
엄마라는 이름에 묻혀서 뭔가 입밖으로 내면 "엄마라는 사람이"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 하고 있다. 엄마라는 호칭이 경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커다란 무게감과 스트레스로 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랄까? 출산에 대한 겁이 초고조에 달해 있는 막달이 오면 아이를 만난다는 기쁨보다는 아픔에 대한 겁이 나서 잠을 자다가도 문득문득 겁을 먹곤 한다. 나도 그랬고, 주위 엄마들도 그랬더랬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아이를 낳는 아픔을 기다리는 정도로 기대감이 컸었는데 누구나 "아이 낳을때는 아프지, 너무 너무 아프지. 근데 그 아픔을 아이가 상쇄시켜주니까." 라는 말을 들을때마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오히려 기대감을 감소시키고 겁을 주는 엄마선배들의 겁주기. 물론, 그게 겁주기가 아니라 진실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그저 그런 위로는 임신부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한다. 그외 소소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엄마들이 겪는 이야기 그리고 여자들이 겪는 이야기를 감히(?) 내 뱉지 못한 우리네를 대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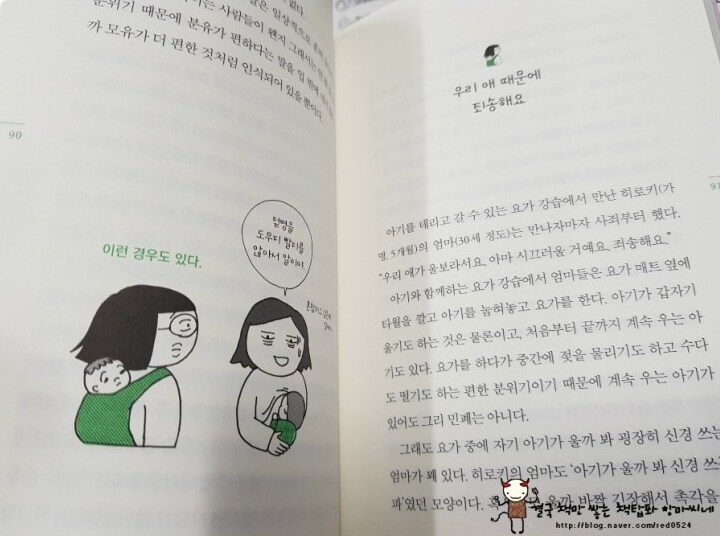
아이들은 울음으로 모든 언어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을정도로 우는게 일상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많이 우는 아이의 엄마는 죄인이 된다. 아이를 어르고 달래도 울기만 하는 아이때문에 남들의 눈치를 보며, 미안해 하고 사과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엄마들. 물론 아이가 많이 울게되면 다른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시끄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의 표현을 어르고 달래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엄마가 아닌건 아니다. 엄마라고 해서 뭐든 다 알아듣고 아이의 언어를 다 이해 할 거라는 건 오해다. 단지 아이와 같이 생활하면서 그동안 관찰한 결과이고 아이와 교감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아이의 패턴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보면 나는 첫 아이를 낳았을때 과연 이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 볼 수 있을까?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다른 엄마들은 자신이 아이의 신호를 모두 캐치해내는데 나는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가 보내는 신호도 모른다면 엄마로서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비관하고(?) 자책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의 모든걸 다 알아야하고 아이의 모든것을 책임지면서 아이를 제대로 케어못하면 미안해 해야하는 존재가 됐던 것이다. 아빠는 어느정도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되는데, 엄마가 아이에 대해 제대로 알 지 못하고 실수를 하면 '무슨 저런 엄마가 다 있어?' 라는 눈초리를 견뎌야 한다. 엄마라고 해서 다 아는건 아닌데...... 하긴, 그러면서 나 역시 다른 엄마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봐왔으니 할말이 없긴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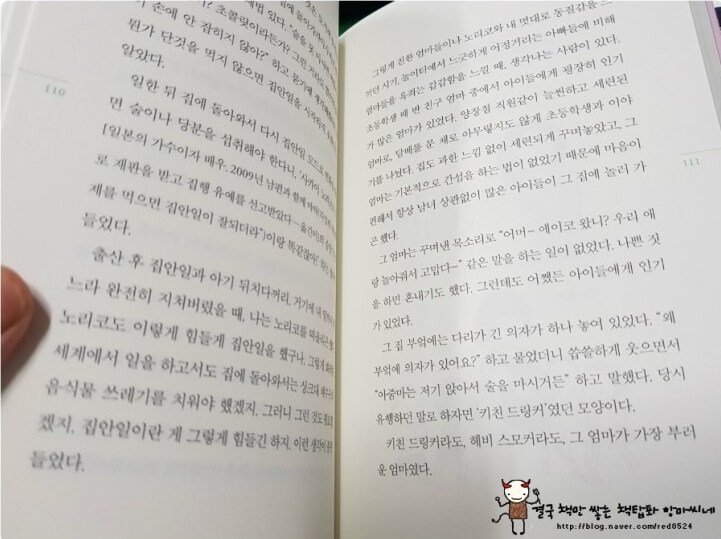
엄마라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하고, 엄마니까 이러저러 해야하고.... 물론 우리가 엄마의 자리를 내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엄마지만 우리도 초보고 배워나가는 사람이다. 무조건 엄마라고 해서 아이의 모든것에 희생하면서 미안해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그래도 뭐 어쨌든 엄마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맘에서 스스로 엄마가 더 죄책감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다반사긴 하지만서도. 나 역시도 아이가 아프면 내가 잘 못 한 거 같고, 내가 제대로 된 식사를 안 줘서 그런거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지경이니 이런 죄책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다 파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되,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들은 훠이 훠이 날려버리는 걸로.
저자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며, 뭔가 짠한 느낌이 들었다. 푹신한 따듯한 엄마에게 안기고 싶어하는 저자의 마음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더해서 보듬어 주고 싶은 기분. 엄마라서 미안해 하지 않을거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걸로. 대신 그 만큼 웃음을 많이 줄 수 있는 엄마이길. 엄마라는 무게감이 더 묵직하게 다시한번 다가오는 책이었다. 비록 "엄마지만 미안해 하지 않겠다."고 야심차게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엄마라서 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는 걸 더 새기게 된 책이기도 하다. 단지, 무조건적인 미안함은 배제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