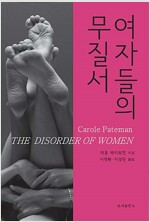2월의 책은 <여자들의 무질서>.
조금만 집중이 흐트러지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고 마는 신비로운(?) 책이라서 요며칠 머릿속이 복잡해 펼치지 못했다. 번역, 어려운 일이라는 건 잘 알겠다. 그래도 이건 좀. 논문은 원래 어려운 말을 많이 써야 하는 건가. 사실 이렇게 어렵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한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외국어 책을 읽는 것 같은 경험은 새롭다. 아니, 외국어책을 읽을 때 자주 느끼니 그 기분은 아주 익숙하지만 ㅠㅠ 한국어인데! 이런 경험은 자책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바보구나. 외국어 책이라면 난 요만한 바보구나, 한국어 책이라면 좀더 나아가 나는 모국어도 이해 못하는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진짜로 바보가 되는 것 같으므로 얼른 나의 덜 바보같은, 좀은 똑똑한 점을 찾아 머릿속을 뒤진다. 쉽게 나오진 않겠지만 말이다.
문득 바보,라는 단어가 걸려 뜻을 검색한다. 역시. 찜찜한 느낌이 맞았다. 비하. 순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젠 쓰지 말아야지. 나더러 바보라고 하지 않을 핑계가 생겼다. 그럼 이제 똥멍충이,라고 해야 하나. 신이 났다가 풀이 죽는다.
오늘은 25일이고 이미 오후이고 2월은 28일로 끝이다.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