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언 반스의 [시대의 소음]은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다.
불친절하다.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반스에 의해 선택된 온갖 자료들, 글들, 단상들의 흐름이다.
많은 음악가들, 쇼스타코비치가 원망하거나 조롱하거나 숭배했거나 염려했던 당대 음악가들이 소환되어 나오지만 독자로서 그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판단이 쉽지 않다.
[플로베르의 앵무새]에서는 플로베르를 탐구하는 가상의 화자라도 세웠지만 [시대의 소음]은 그마저도 없다.
'그'. 뭔 대명사 사용이 이리많나.
내가 이상한건가. 유난히 그, 그, 걸린다.
조금씩 읽고 있다.
줄러언 반스라면, 읽을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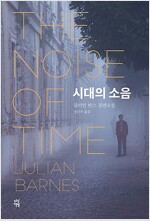


솔로몬 볼코프가 엮은 쇼스타코비치의 [증언]이라는 책도 있군.
쇼스타코비치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책 같다.
솔로몬 볼코프의 문화사도 들여댜볼만 한듯.
미처 몰랐던 책들.
쉽게 읽히지 않는 책들은 단숨에 읽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읽어도 괜찮다는 걸 배워야겠다..
그렇다면.
20170610
반스가 쓴 쇼스타코비치의 전기를 읽었다고 해야겠다.
예술이 시대의 폭력과 만날 때 예술가는 어떠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
반스의 형식.
쇼스타코비치의 내적 투쟁이라 할 수 있는 시대와 자신의 갈등의 내면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한편으로는 당대 음악가들의 또다른 모습들도(쇼스타코비치의 내면을 거쳐) 적절하게 등장한다.
쇼스타코비치 인생의 주요한 국면들을 윤년이라는 모티프를 잡아 구성한 것도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뛰어나다고 할만하다.
문장들은 원숙하고 통찰력에 감탄할만하고 공감가는 것들로 꽉 차 있다.
특히 죽음과 관련한 반스의 통찰에 책을 놓고 잠시 묵상하곤 했다.
언젠가부터 내가 줄곧 생각해왔던 것들. 나 또한 희망했던 것들.
때가 되면, 제게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그 때.
뛰어난 작품이다. 그렇지만 반스가 취한 쇼스타코비치의 스탠스가 거리를 두게 만든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례들, 어쩌면 더 기가막히고 풍부한 사례들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작가가 어떻게 전달하는가.
최근에도 볼 수 있던 장면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그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던 80년 광주의 버스운전기사.
수많은 이낙연과 김훈들.
"늑대는 양의 공포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재판에서 유영하라는 작자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시행 지시를 놓고 내적 투쟁을 했을지도 모를 공무원들에게 '구질구질'하다고 내뱉은 언사.
우리가 결정했던 운명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쇼스타코비치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그건 단적으로 개인의 용기와 단호함만으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없는 변명같은 현실들.
간혹 내가 저질렀던 겁쟁이의 모습에 지금도 가끔 이불킥을 한다.
몸서리처지는 부끄러움이 나를 휩쓸때면 나는 큰소리를 내며 기억을 떨쳐낸다.
왜 그때 나는 굴종했을까. .............
말년의 쇼스타코비치에게 있었다던 틱장애.
많은 우리가 가지게 된 이러저러한 틱장애.
이제 일흔하나가 된, 우리 나이로 일흔둘이 된 줄리언 반스가 더 많은 작품을 써줬으면 좋겠다.
더 나이 들어 젊은시절 가장 경멸했던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반스의 말이 틀리길 바란다.
그러고보니 반스의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아직 읽지 못했다.
또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도 다시 읽어봐야겠다.
반스는 죽음에 대해 하루이틀 생각한 게 아닌 것이다.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