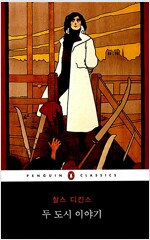2022년이 먼 미래 SF에나 나올법한 연도라고 생각했다.
6년밖에 남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날짜감각이 둔해지며 진짜인가 싶었다.
2022년은 '위대한' 모더니스트 문학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온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존 서덜랜드가 [문학의 역사](결코 작지 않은 역사 시리즈)에서 꼽은 1922년은 "모든 것을 바꾼 해"였다.
그 선봉에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조지 엘리엇의 <황무지>가 있고, 비록 출간은 1925년이었지만 버지니아 울프가 [댈러웨이 부인]을 구상하고 착수한 것도 바로 이 해였다.
모더니즘 문학은 "당대의 압도적인 대중문화 속에서 소수 취향을 강력하게 표현했다." 엘리엇, 에즈라 파운드, 버지니아 울프, 예이츠.. 이들에게 대중은 무관심했다.
존 서덜랜드는 위대한 문학작품은 시간을 견디고 계속 누군가의 서가에 꽂혀있는 것임을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듯하다.
1922년 계관시인 로버트 브리지스는 잊혀졌지만 <황무지>는 살아남았다.
조이스는, 울프는 또 어떤가.
내 서가에도 있지만 읽지는 못했다.
어쨌든 2022년 100주년에 나도 동참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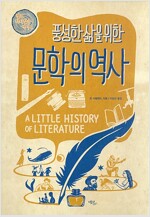
당장 병신년에 끝내야 할 일은 끝냈으면 좋겠다.........만은 해를 넘기고도 긴 싸움을 통과해야 할 것 같다.
문제는 언제나 직접과 대의인것 같다.
대의는 직접의 정확한 비례여야 한다.
지금은 너무 왜곡되어 있어 대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벽이다.

관심저자들의 새책이 나왔다.
저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책을 쓰고 펴내고 ...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는 열심히... 놀고 있다 라라랜드~



김용규의 [철학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1 - 혁명 이데올로기 편], [철학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 2 - 시간 언어 편]
테리 이글턴의 [인생의 의미]
그리고 책 무지하게 닥치는대로 읽고 그중에서 골라 글을 쓰는 저자들의 책
이런 책들은 원작을 읽어보고 싶게 하는 후크북이다. 그런데 정작 원작을 읽는 일은 얼마나 고된 일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민음사판으로는 2권에서 멈춰있다. 흑.

채사장의 [열한계단]
팟캐스트 지대넓얇으로 알려진 채사장의 책.
자주 듣는 편은 아니고, 저서도 읽어본적이 없는데 이번책은 아마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책을
선정해서 다루고 있는 듯하다. 이번엔 읽어볼 생각이다.

정시몬의 [세계문학브런치]
저자는 이미 원전을 곁들인 인문학 시리즈로 세계사와 철학을 다룬바 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이진숙의
[롤리타는 없다 - 그림과 문학으로 깨우는 공감의 인문학]
처음 보는 저자.
고전작품과 그림을 통해 '공감'을 다룬다는데 고전작품을 보는
몇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해줄 것 같아 흥미를 끌었다.

그리고 커트보네킷(보네커트)의 [제5도살장]이 문학동네에서 정영목의 번역으로
재출간되었다.
절판된 책을 도서간에서 빌려 읽었는데 재출간되면 꼭 소장했다가 두고두고 읽어야겠다고 생각 했던 책이다. 긴 기다림끝에 결국 나오긴 했다.
그리고 새로나온 제인오스틴의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작품들.
오스틴의 소설들은 [오만과 편견] 외에 읽은 게 없고 영화도 ... 기억이 없다.
[오만과 편견]도 그닥 흥미롭게 읽은 건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읽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던 오스틴의 작품과 함께 전작읽기에 도전해...볼까............
요새 표지들은 벽지가 유행인가.
웬 꽃무늬벽지 잔치들? 민음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도 꽃벽지들이던데.
곷무늬벽지는 영국 모던 빈티지 브랜드 캐스 키드슨의 작품이라고 한다.
벽지가 아니고 패턴이고...
어쨌든 난 이 세권만 구입하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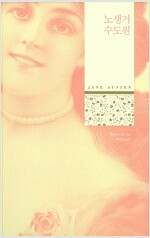

정은궐의 [홍천기]
[해를 품은 달] [규장각 각신들의 나날] 등으로 유명한 작가의 새 작품.
모두 드라마화되어 흥미롭게 봤던터라 이번에는 원작을 좀 읽어볼까 한다.
정은궐이란 작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는 걸로 들었다. 이름도 가명이고.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꽤 오래전 들었던터라 지금은 밝혀졌나 모르겠다.
회사를 다니면서 초대박 흥행작을 쓴 것이다.
작가 자체가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설을 읽어본적이 없어 어느 수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조선의 역사나 풍속에 대한 공부가 탄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소설을 쓰기 위해 필요한 취재에 당연히 공을 들였겠지만 지식과 상상력이 제법 명랑해서 궁금했다.
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읽다 던져버리지 않을 정도면 된다.


플로베르의 [세가지 이야기]가 문학동네에서 나왔다.
줄리안 반즈의 [플로베르의 앵무새]를 읽다가 알게 된 플로베르의 마지막 작품. 세편의 단편이 들어있는 단편집.
역시 기억이 잘 안난다. 아마도 [순박한 마음]한편 읽었던 것 같은데 앵무새에 대한 얘기였던 걸로만 기억한다.
플로베르는 내겐 어려운 작가다.
내용은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이 특별하다.

11월은 서성거리다가 한달이 지나가버렸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달이다.
12월에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기에 읽을 수 있는 책이 뭘까 ...
꺼내든 책은 디킨스의 [두도시 이야기]이다.
1775년, 그리고 1794년.
파리와 런던.
혁명
......
밥말리의 자메이카도 있지만 난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우리에겐 지금이 최고도 아니고 ... 안타깝게도 최악도 아닐 것이다.
군부쿠데타가 불가능한 것처럼 민중의 폭력적 혁명도 불가능한 시대라고 본다.
물론 어긋날 수 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분노하는 한편 주권적 우울도 있다.
"주권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부정되는 과정에서 생긴 마음의 부서짐." (김홍중)
부서지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