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권 더 읽기보다는 한 해를 돌이켜보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 싶다. 주변의 우울한 소식들, 특히 올해는 아픈 사람들이 많다. 물론 안타깝게 젊음을 고스란히 갖고 떠난 이들을 보내며 살아왔지만 건강을 잃은 지인들을 보는 중년의 겨울, 세밑은 칼바람이 드는 느낌이다. 별일 없이 살다가 별일을 맞게 되면 알짤 없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줄줄이 들이닥친다. 어쩔 수 없이 지난 삶과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가 있다. 과거는 지나갔고 앞으로는 어쩔 것인가. 지난 날 걸어온 길이 있는데 새날이 뭐 그리 또 새로울 것도 없겠지만 지난 길이라도 수습할 것들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주부터 읽고 있는 책이 [살인의 숲]인데, 이제 딱 절반 읽었다. 본문만 575페이지인데 글자 포인트도 작고 한 페이지가 빽빽하다. 엄청난 분량이라는 거다. 각종 상의 신인상을 휩쓸었다는 배경을 갖고 있어 이 상들이 기획사 나눠먹기에다 참석한 가수들에게만 상을 주는 한국연말 가요상이 아닌 바에야 나름 권위를 가질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책을 대했는데 이건 뭐 기대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
작품해설이라고 붙은 글을 보면 이 작품에 대해 분명한 자기 해설을 갖지 못한 어정쩡함이 아쉽기도 하다. '이 작품은 어떠한 형태의 작품이라고 딱 잘라서 뭉뚱그리기가 어렵다'. 이게 뭐야.
여튼 끝까지 가보긴 해야겠지, 책 뿐만 아니라 세상사 모든 일에는 모험도 필요한 거니까, 좋은 경험했다고쳐도 괜찮을 것이고, 다 읽고 나면 지금까지 짜증낸 거 사과해야 할지도 모를만큼 좋은 작품일 수도 있고.

문득 클리프턴 페디먼이 여행갈 때 읽곤 한다는, 아주 재밌게 읽는다는 책, 앤서니 트롤럽(트롤로프)Anthony Trollope의 책들이 생각났다. 여행갈 때 비행기 안에서 페이퍼백으로 읽는 그런 소설인 모양인데 국내에는 이 작가의 작품이 번역된 게 없다. 궁금하다. 19세기 소설, 그 '막대한' 이야기속으로 빠져볼 수 있다는 건 독서가 주는 즐거움이겠다. 나는 찰스 디킨스에 도전해볼까 해서 사들여놨다. 앤서니 트롤럽 작품 한 권이라도 맛보기,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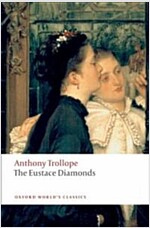

[The Eustace Diamonds]는 귀족출신의 정치가인 플란타제네트 팰리서와 그의 똑똑하고 야심많은 아내의 생애를 추적한 작품인데, 돈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했다고 클리프턴은 소개했다. [The Way We Live Now]는 어둡고 냉소적인 소설로 멜몬트라는 음모를 잘 꾸미는 금융가가 주인공인 모양이다. 두 작품 모두 자본주의라는 괴물같으면서도 매혹적인 시대를 배경삼아 방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소설같다. 디킨스와 트롤럽(혹은 트롤롭). 이들 작품을 대하는 나의 환상은 대충 이렇다. 봄바람 살랑대는 어느 봄날, 컨디션 최고인 날, 아무 걱정거리 없이 따스한 햇살받으며 책에 흠뻑 빠져 사는 나날, 내 생의 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