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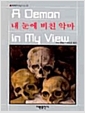
-
내 눈에 비친 악마 ㅣ 해문 세계추리걸작선 33
루스 렌들 지음, 강호걸 옮김 / 해문출판사 / 2003년 9월
평점 :

절판

에드거 앨런 포의 시 <Alone>에서 제목을 따온 이 작품은 이상성격자인 한 남자의 일생과 일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그 시는 다름과 같다.
From childhood's hour I have not been
As others were; I have not seen
As others saw; I could not bring
My passions from a common spring.
From the same source I have not taken
My sorrow; I could not awaken
My heart to joy at the same tone;
And all I loved, I loved alone.
Then in my childhood, in the dawn
Of a most stormy life was drawn
From every depth of good and ill
The mystery which binds me still:
From the torrent, or the fountain,
From the red cliff of the mountain,
From the sun that round me rolled
In its autumn tint of gold,
From the lightning in the sky
As it passed me flying by,
From the thunder and the storm,
And the cloud that took the form
(When the rest of Heaven was blue)
Of a demon in my view.
이 시의 해석은 책 앞에 쓰여 있다. 아서에 대해 참 잘 설명된 시다. 어려서 이모에게 억압받고 자란 한 소년. 그 소년은 이모가 세상의 전부이면서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는 남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한다. 그의 삶은 이모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 그리고 가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날 때 지하살에 가서 이모의 옷을 입고 있는 하얀 살결의 마네킹의 목을 조르는 일이 전부다. 그의 이런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은 그가 세 사는 아파트에 그와 성이 같은 또 한 명의 존슨이 이사 오면서부터다. 그 남자는 가이 포크스 데이에 태울 인형으로 아서의 마네킹을 선택하고 이제 사라진 인형으로 인해 아서는 지난날의 일을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심지어 그런 사람에 대한 논문을 쓰는 또 다른 존슨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마지막 결말이 조금 허무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이상성격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내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고 희생자가 나만, 내 가족만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그 자체가 이상성격자가 아닌가 싶다. 루스 렌델의 작품은 이런 스며드는 서스펜스를 선사한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과연 누가 더 나쁜가 생각하게 한다. <유니스의 비밀>에서도 그랬다. 사회적 관점에서 개개인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약간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여백의 미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작가의 대표적 단편 <열병 나무>와 <유니스의 비밀>을 보고 기대가 컸던 작품이다. 초기 도서 추리 소설과 요즘 등장한 범죄자의 심리 위주의 작품들 사이에 놓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작품인데 그래서 그런지 초기 도서 추리 작품에 비해서는 범인의 심리 묘사가 디테일한 점을 알 수 있지만 요즘 작품에 비하면 긴박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요즘 작품의 긴박함이 과도한 잔인함의 확대 묘사와 독자가 생각할 수 없게 뇌를 마비시키는 중독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차라리 이 작품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내내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비둘기>를 떠올렸다. 그 주인공의 삶과 아서의 삶이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다. 각각의 작품에서 비둘기는 자신의 마조히즘에 대한 표출로, 마네킹은 새디즘의 표출 대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병들은 내 눈에 비친 것만이 아닌 우리 눈에 비친 악마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장에서 나타나듯이 그런 우연으로 없어지거나 마치 심판 받은 것처럼 보여 지는 그런 행동에 의해 단죄되지는 않음을 아이러니컬하게도 느끼게 해 준다. 기대했던 것만큼 대작은 아니었지만 볼 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보기를 기다렸던 작품이므로.
내 눈에 비친 악마는 섬세한 작품이다. 지루할 정도로 아서의 심리와 일상을 묘사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읽다 보면 조금 실망을 느끼게도 되지만 그것이 루스 렌델이 구상한 작품 방식이 아니었나 싶다.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어떤 사람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전율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듯 보여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하면서 그의 주변 인물들이 모두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할 리 없다. 또 다른 존슨이 이상 성격자에 대한 논문을 쓰는 사람이고 처음 아서를 보고 그가 이상한 편집광적 인물임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내면에도 악마가 있어 다른 악마를 느낄 수 없다는 의미 아닐까. 조금 다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런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무심함과 무지에 의한 전율을 선사하려는 것 아닐는지. 그의 단편 <열병 나무>처럼. 그래서 이 작품이 평이해 보이면서 어떤 작품에 대한 평가를 망설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다시 읽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