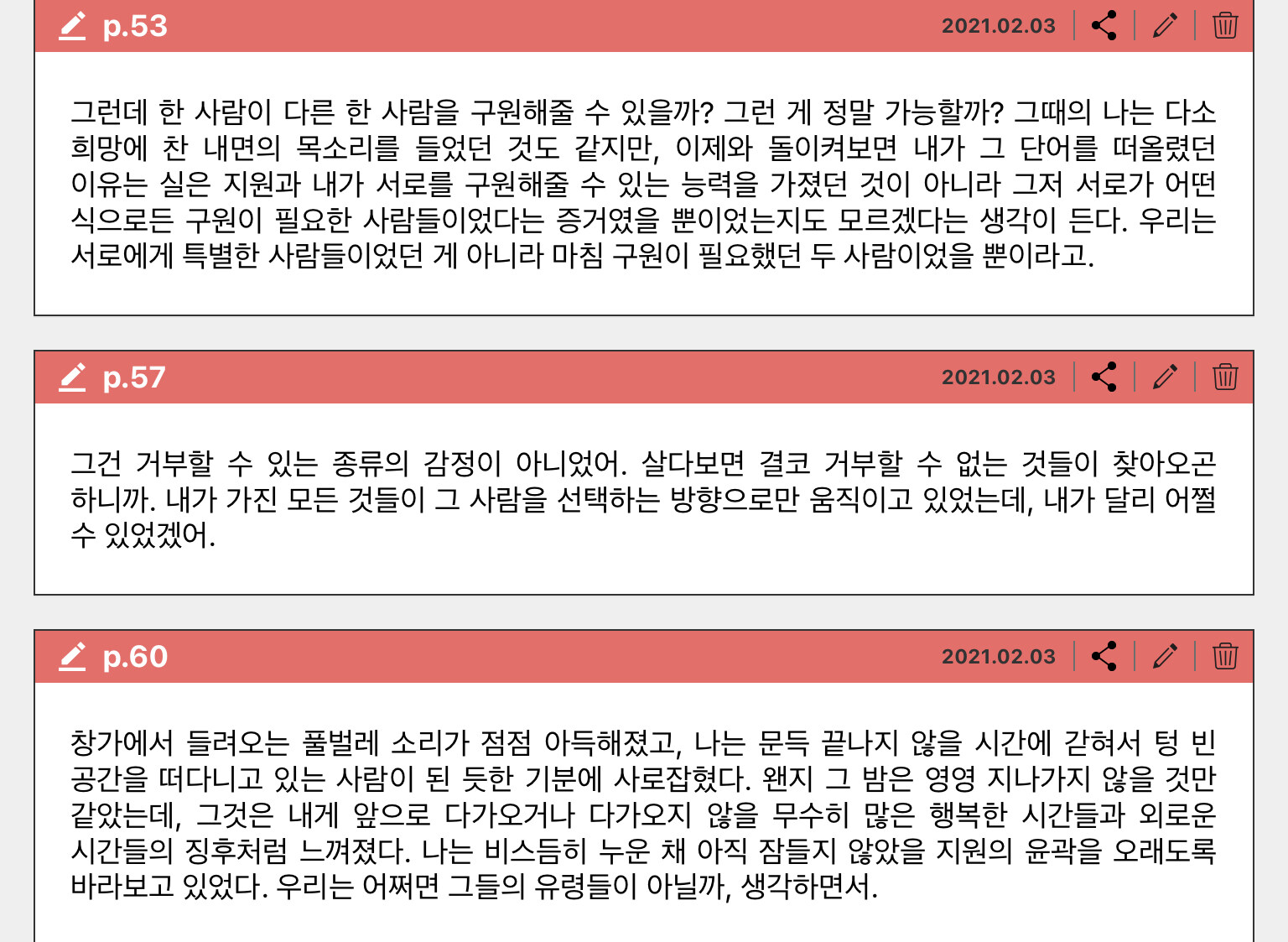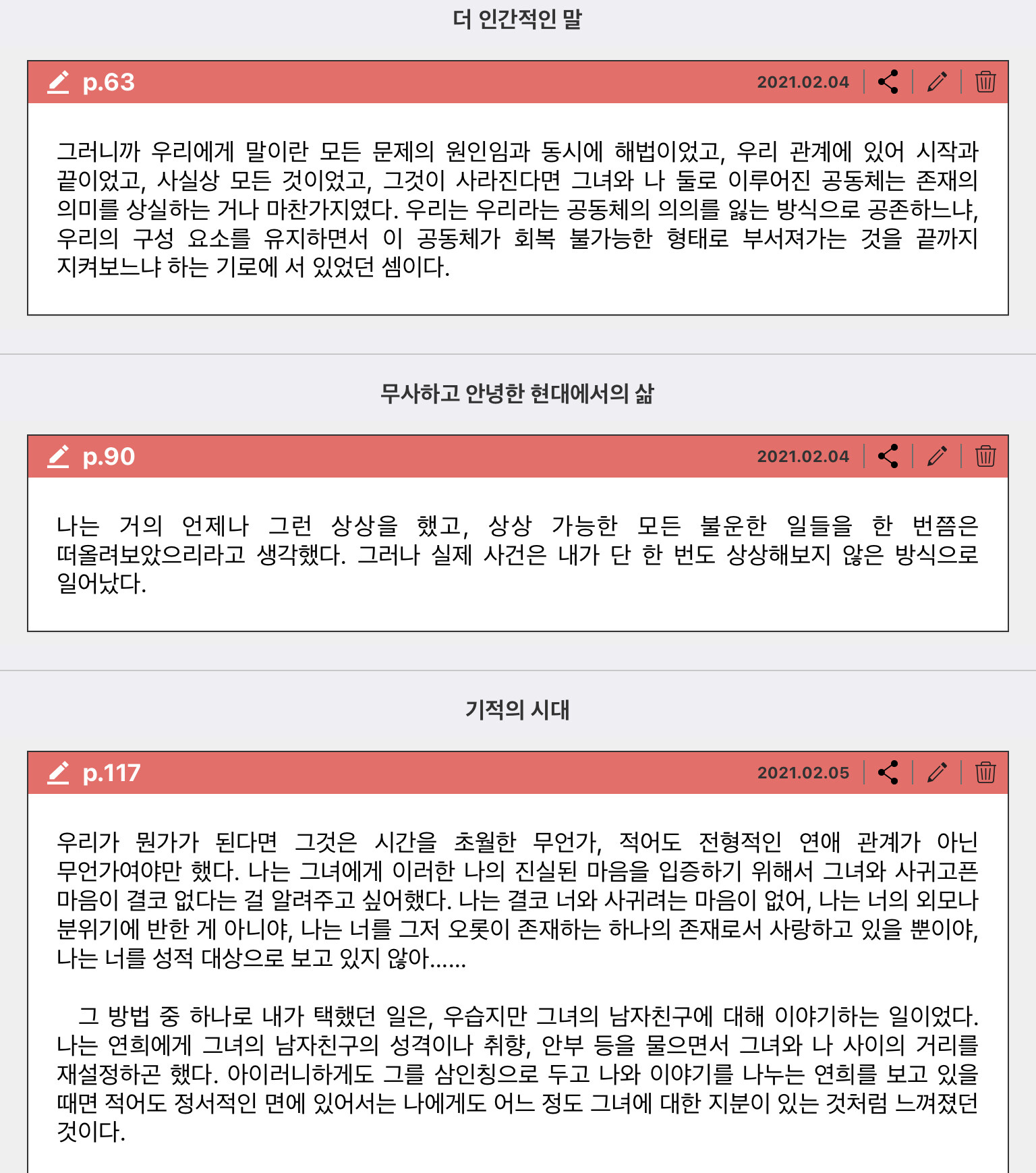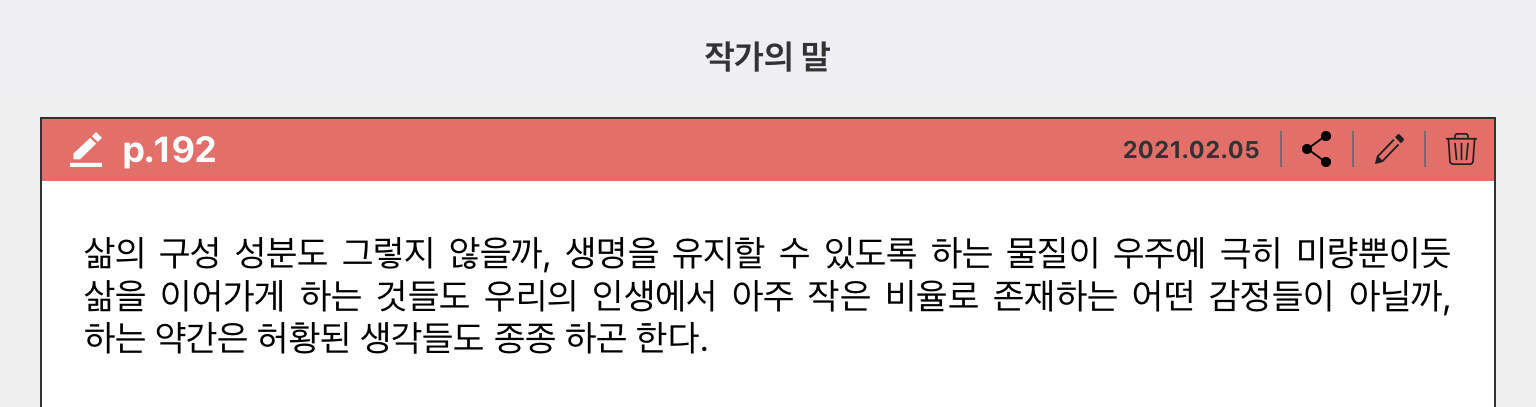-

-
[전자책] 내일의 연인들
정영수 지음 / 문학동네 / 2020년 11월
평점 :



-20210205 정영수.
나는 장성규를 싫어하는데, 식구의 몇 안 되는 취미 중 하나가 주말에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켜고 워크맨 채널을 보는 일이다. 그 옆에 앉아 책을 읽다가 장성규가 욕설을 내뱉을 때마다 쟤 싫어, 하고 눈살을 찌푸리고는 억지로 책에 집중하려다가…어느새 화면에 눈길을 빼앗기곤 한다. 그걸 반복하다 보니 꿈에서 장성규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놀랍게도 꿈 속의 나는 장성규와 썸을 타고 있었다.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밀당하듯 막말을 주고받다가 토라지고, 그러다 또다시 그리워했다. 잠을 깨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장성규를 덜 미워하게 되었냐 하면, 여전히 워크맨을 틀면 눈살을 찌푸리고, 싫다, 소리는 마음 속으로만 한다. 자꾸 싫다 하면 그것도 미운 정이 드나 싶어서…
아, 장성규 얘기 왜 했냐면, 예전에 장성규가 문학동네에서 일하는 에피소드를 보았다. 거기에 김영수라는 편집자가 나왔다. 뭐야, 저 이상한 머리스타일이랑 수염은 소설가 정영수인데. 검색해보니 편집인일 때는 김영수이고 소설가일 때는 정영수라고 한다. 와 그럴듯한 체인지업이야. 인생을 두 개로 살고 있잖아. 문득 정영수랑 같은 문학팀에 있었다는 김봉곤이 그리워졌지만 김봉곤은 안 나왔다. 대신 이원하 시인이 나와서 귀여운 척해서 (그때는 아직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는 안 봤던 때였다. 결국 이 방송을 계기로 시집을 읽게 되지…) 왜 귀여운 척이야 했다. 갑자기 박상영 소설가랑 영상통화해서 원고 독촉하고, 박상영은 막 택시에서 마감하고 있다고 해서 괜히 반가웠다.(나는 반가운데 반가운 상대는 내 존재도 모름…)
정영수의 소설은 2018, 2019 젊은작가상 수상집에서 단편 하나씩을 접했다. 그때 끄적인 감상을 찾아보니 기억한대로 별로야, 오그라들어, 잘 쓰지도 않네, 였다.
이번에 나온 소설집을 별 기대 없이 펼쳤는데 조금 놀랐다. 두 번째 읽는 ‘우리들’이 너무 좋아서 밑줄을 왕창 쳐놓았다. 이렇게 잘 썼었나? 내가 그간 정영수를 읽을 공력이 안 되었던 건가? 그동안 과소평가해서 미안해 영수님, 했다.
그러다가 ‘내일의 연인들’을 읽는 순간 아아...내가 알던 영수네, 했다.ㅋㅋㅋ 소설이란 쓰는 게 아니란다. 몇 년을 두고 고치는 일이란다. 새삼 깨달았다. ‘더 인간적인 말’을 읽고는 그런 깨달음이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다. 이 소설 처음 읽는 거 같은데 화자의 배우자 이름이 큰애 이름이랑 같아서 전에 읽었던 소설인 걸 눈치챘다. 역시나 처음 읽은 때보다 훨씬 좋았다.
정말 다시 고쳐 써서 나아진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수상작품집을 다시 찾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로 부지런하진 못했다.
같은 소설을 다시 읽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어떤 소설은 한 번 읽어서는 좋아하기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다. 좋기 위해 그 사이에 뭘 먼저 잔뜩 읽어야 하는 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첫 감상과 두 번째 감상이 다른 이유를 나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글을 후지다고 할 때 조금 더 고민하고 후지다고 해야 할까? 아마 하던 대로 할 것 같긴 해…(모진 새끼야...언젠가 너도 당해봐라)
-우리들
두 번째 읽기는 소설 첫머리에서 언급되는 정은과 현수에 관해 이미 알고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소설에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처음 읽을 때와 내가 선 자리도 달라져 버렸다. 분명 아는 장면이고 관계의 흐름과 두 연인의 병치 같은 큰 줄거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사이 아니에르노도 읽고 하여간에 같은 소설인데 읽는 사람이 달라져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그랬구나, 독자가 달라졌구만.
- 내일의 연인들
남현동은 내가 사는 관악구의 어느 부분인데, 나는 오랜동안 신림동 봉천동 구석을 빙빙 돌았지만 남현동에는 못 가 봤다. 그런데도 그 비탈과 비탈 위의 빌라와 지원과 화자가 머문 공간이 내가 가본 어딘가 인 것 마냥 느껴졌다. 너희는 어쩜 우리의 유령일 수도 있겠다.
- 더 인간적인 말
비슷한 이야기가 ‘도어’에서도 한 에피소드로 등장하는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 앞에서 남을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기다리는 일 말고는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그건 모든 죽음 앞에서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더 괴로워하거나 유난 떨 필요도 없는 건가? 싶었다. 그만큼 고상하게 선택하는 것조차 누구에게나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무사하고 안녕한 현대에서의 삶
화자처럼 나도 엉뚱한 불행과 사고에 대해 상상한다. 그 상상의 결과물인지 끔찍한 사건이 현실에 설정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도 결국 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몇 개의 인상 깊은 결말을 보여준 소설을 제외하면 마무리가 김이 빠지는 소설이 이 책의 대부분이다. 나 또한 끝맺음이 늘 어렵다.
-기적의 시대
친구의 친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 이루기는 커녕 펼쳐 놓지도 못한 사랑, 혼자 좋아하면서 괜히 누군가의 집 앞을 기다리는 마음, 제목은 딱히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소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나는 저래 본 적도 없는데 괜히 저랬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누굴 좋아하는 마음, 감정 같은 걸 되돌아보는 걸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흔하긴 한데 그냥저냥 괜찮았다.
- 서로의 나라에서
싸이월드 시절부터 남 염탐하는 게 취미였던 나는 슬쩍 찔렸다. 여기에 나같은 놈이 나오는 걸 보니 나만 이상한 놈 아니네...하고 또 슬쩍 자기위안도...어쩌다 알게 되고 온라인으로 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다 또 멀어지고 하는 관계가 내 세대에는 많았다. 그런 사람과 재회한 공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도 아니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불가능? 인연의 유한성?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들긴 했는데, 암튼 괜히 소설보다가 구글창에 아주 오래전 스친 사람들의 아이디 같은 걸 슬며시 적어보았다…
-길을 잘 찾는 서울 사람들
답답한 차 안의 짧은 소설. 사분 거리가 사십분 되면 빡치긴 하겠다. 점점 더 얘 나랑 성격 비슷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두 사람의 세계
모르긴 몰라도 나도 언젠가는 내 모부의 이야기를 픽션인 양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다 이미 여러번 변주해서 쓰긴 했지… 화자가 두 연인의 자녀라는 건 처음부터 너무 명확한데도 너스레 떠니까 조금 아쉽긴 했다. 결말도 마음에 안 들었다. 엄마 네가 결코 떠나지 못할 사람일 걸 알아 하고 두드려패는 아빠로부터 놓아주지 않는 결말은 상상력이 부족하지 않니. 소설에서라도 좀 도망가게 해주면 안 되냐. 나쁜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