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준비 차 불가코프의 소설을 읽는다. 내가 짠 커리큘럼이 아니라, 기왕지사 짜놓은 커리큘럼에 대한 강의라, 작품이 정해져 있다. <젊은 의사의 수기>. 이 책은 2011년에 번역본이 나왔는데, 마침 조리원에 있었던 나는 애 젖 먹이면서 책장을 들춰보던 기억이 있다. 소위 몸도 '풀리지' 않은 상태고 신생아 젖먹이르라 연일 잠도 너무 부족하여 눈이 아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책을 보면서 내가 그저 출산한 암컷이 아닌, 인간임을 실감하여 위로했던 기억이 있다. 아무튼 그런 인연의 책인데, 수록된 소설 자체는 초기 불가코프의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이점 외에, '의학과 문학'이라는 큰 주제에 부합한다는 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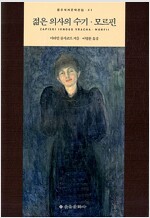


오랜만에 쭉 다시 읽어본 <젊은 의사의 수기>(덧붙여 <모르핀>까지)는 말하자면 잠재태다. 좋게 말해, 이후 불가코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쓰게 된다. 소위 의사작가로서 그가 쓴 작품 중 진짜 수작은 <개의 심장>이 아닌가 싶다. 수업 시간에 보충자료(?)로 언급하던 작품인데, 이 참에 다시 읽어봤다. 얇으니 여러분도 한 번 보시라.
소설의 내용은 말하자면 장기이식. 개의 뇌와 생식기를 사람(이 경우 범죄자)의 그것으로 대체한다. 이후, 개-사람은 사람-개(즉, 개 같은 사람)가 된다. 이름 '샤릭'과 '샤리코프'가 이것을 의미. 의사-작가의 소설인 만큼, 이번에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 읽으니, 수술 장면의 묘사가, 아, 정말 돋는다! 역시 소설가는 자기가 잘 아는 것을(-만) 써야한다! 명심할 일이다.
* 생식기 이식:
“가위가 마치 마법사 손에서 놀듯이 의사의 손에서 번쩍거렸다. 필리쁘 필리뽀비치가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몇 번을 회전시키더니 샤리끄의 몸에서 지스러기가 붙은 정자분비관을 떼어냈다. 열정과 흥분으로 온몸이 홀랑 젖은 보르멘딸리가 유리병 쪽으로 황급히 달려가서 밑으로 축 늘어진 다른 정자분비관을 꺼냈다. (....) ”
“14분 걸렸습니다.”
* 뇌이식:
“보르멘딸리가 그에게 타래송곳을 건넸다. 필리쁘 필리뽀비치는 입술을 깨문 채 타래송곳을 찔러넣은 후 샤리끄의 두개골을 따라 1센티미터 간격으로 작은 구멍을 뚫었다. 구멍 하나를 뚫는 데 5초 이상 걸리지 않았다. 그런 다음 괴상하게 생긴 톱을 들어 톱 꼬리 부분을 가장 먼저 뚫은 구멍에 집어 넣은 후 마치 부인용 수공예품 상자를 만드는 것처럼 톱질을 시작했다. 두개골이 떨리면서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다. 3분 정도가 지나서 샤리그의 두개골 뚜껑을 떼어냈다.
그러자 푸르스름한 정맥과 불그스레한 반점들이 있는 둥근 모양의 샤리끄의 회색빛 뇌가 드러났다. 필. 필.가 가위를 찔러 넣어 뇌막을 자르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분수처럼 피가 솟구쳐올라 하마터면 교수의 눈에 튀거나 모자 위에 뿌려질 뻔했다.보르멘딸리가 마치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회전 핀셋으로 출혈부위를 틀어막았다. 몸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얼굴은 기름기로 인해 여러 가지 색깔을 띠었다. 그의 눈길이 교수의 손에서 수술용 기구가 놓인 탁자 위의 접시로 급히 이동했다. 그 순간 필. 필.가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변했다. 코에서는 쉭쉭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잇몸이 다 드러나도록 입술이 벌어졌다. 그는 뇌막을 벗긴 후, 엎어놓은 찻잔처럼 생긴 반구(半球)로부터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어딘가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다. 이때 보르멘딸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한 손으로 샤리끄의 가슴을 잡은 채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맥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89-90)
이어, 스토리 전개. 이놈의 샤리코프가 공산당에 들어가 못 된 짓만 골라 하고 다닌다.(참고로, 불가코프는 귀족 집안 출신이라 굳이 말하자면, 반혁명쪽, 즉 '백위군'이다.) 그래서 결국, 재수술(!)을 통해 그를 다시 개로 되돌린다는 것. 이후 불가코프가 쓸 대작 <거장과 마르가리타>에 비하면 너무 가볍고 얇은 작품이지만,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 이 작품에 대해 말하도록 만든다. 그런 유혹이 있는 작품이다. 뭐냐, 바로 이것.
샤릭은 샤리코프로 바뀌면서 제일 먼저 말을 배운다. 그와 더불어 못된짓(!!!)을 배운다. 당연히 '금지'가 쏟아진다. (보다시피 이게 사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열받은 샤리코프가 한 소리 한다.
“그래, 당신은 항상 그랬어... 침 뱉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저리로 가지 마라... 이게 정말 뭐야? 여기가 전차 안이라도 되는 모양이군. 어째서 날 못살게 구는 거지?! 그리고 ‘아빠’란 단어와 관련해서 이건 순전히 당신 잘못이야. 내가 수술해달라고 청한 적이나 있냔 말이야?”
사내가 흥분해서 계속 짖어댔다. “그래, 정말 멋들어진 일이야! 나 같은 동물을 잡아다가 칼로 머리를 길쭉하게 잘라서 줄무늬처럼 만들어놓고는 이제 와서 이렇게 경멸한단 말이지. 난 수술을 허락한 적이 없어. 마찬가지로... (사내가 무슨 간단한 공식이라도 기억해내려는 듯 천장 쪽으로 눈을 돌렸다) 내 친척들도 허락한 적이 없어. 따라서 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단 말이야.”(117)
정말 치명적인 물음이다. 더불어, 러시아문학답게, 또 불가코프의 특징답게 거칠게, 조잡하게, 극단적으로 던져힌다. 일단 소재부터가 그렇지 않나. 오래 전 영문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기되었다.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저주받은 창조자! 어째서 자기마저 역겨워 등을 돌릴 흉악한 괴물을 빚어냈단 말인가? 신은 연민을 갖고 자신을 본떠 인간을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창조했다. 그러나 내 모습은 당신의 더러운 투영이고, 닮았기 때문에 더욱 끔찍스럽다."
더 오래 전, 고전에서는 더 점잖은(?) 절규가 있었다. 밀턴, <실낙원>. 아담의 절규.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달라고?”
요컨대 <개의 심장>에서 돋는(!!) 것은 수술 장면(만)이 아니다. 문제는 주제의식, 강조하건대, 주제의식이다. 창작적 관점에서 볼 때, 솔직히 수술 장면 같은 건 자료를 찾아보고 출처 밝히고 인용하면 된다. 하지만 저 주제의식, 그에 맞는 소설적 전개에서 바로 소설(가)의 급이 결정되는 거다. <개의 심장>은 충분히 잘 쓴 좋은 소설이지만, 후자에서 아쉽게도 많이 나아가지 못해 이른바 걸작-대작까지는 못 간 듯하다. 하지만 괜찮아, 작가는 아직 젊고, 죽기에 앞서 <거장...>을 유작으로 남긴다. 어느 부분이 겹치는지, 이건 다음 기회에...
다시금, <개의 심장>의 주제. 결국 생명을 만든다는 건 이런 거다. 내가 낳아달라고 했냐. 사실 이건 엄청나게 무거운 물음인데 우리가 안일한 휴머니즘으로 포장하여(생명을 낳고 어쩌고~~~ 하나는 외로워 , 동생을 낳아줘야 어쩌고저쩌고~~~ 제 숟가락은 물고 태어나니~~~ ) 너무 쉽게(!) 대하는 건 아닌지. 최근 불거진 낙태 합법화 논란까지 포함하여, 또 장애아(주로 염색체 이상이나 심한 기형) 출산 여부 결정권 등과 관련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리라. 특히, 나처럼 발달지체-장애아 부모에, 연일 다양한 스펙트럼의 장애아를 보는 엄마라면 누구나 그러리라.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 언제 한 번 진지하게 다뤄볼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