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동, 삶과 죽음 사이 -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1564-1616), <햄릿>(1601)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초연 년도는 1601년으로 추정된다. 그로부터 400여년이 거뜬히 지났음에도 이 작품은 여전히 살아있는 고전으로 추앙받고 있다. 작품의 골조를 이루는 중세 덴마크 왕정의 비극(물론 셰익스피어의 순수 창작물은 아니다) 속에는 각종 서사 장르의 단골 메뉴(유령, 복수, 정쟁, 연애, 광기, 살인, 자살, 결투 등)가 총동원되어 있다. 인물들도 주인공뿐만 부차적 인물과 단역에 이르기까지 또렷한 형상과 성격을 자랑하고 대사 하나하나가 어지간한 시구나 철학적 아포리즘에 맞먹을 만큼 도발적이고도 함축적이다. 아버지의 복수를 미루는 햄릿의 우유부단함, 즉 ‘행동’이 아닌 ‘행동 없음’이 희곡의 플롯을 이끌고 가는 것도 흥미롭다. 부왕-유령이 즉각적인 복수를 명령했음에도, 이어 그 스스로 올린 연극을 통해 숙부(클로어디스)의 죄를 확인했음에도 햄릿은 쉽사리 그를 죽이지 못한다. 유혈 복수가 장려, 심지어 요구되는(“살인에는 정말 성역이 있어선 안 되고, 복수에 한계는 없어야지.”(169) 시대였고 햄릿이야말로 용맹한 다혈질의 전사였음을(폴로니어스 살해 장면을 보라) 상기한다면 더더욱 놀라운 대목이다. 5막 내내 복수-행동은 없고 그것에 대한 “말, 말, 말”(70)뿐이다. 이는 “짐승 같은 망각”인가, 아니면 “결과를 너무 꼼꼼하게 생각하는 비겁한 망설임”(149)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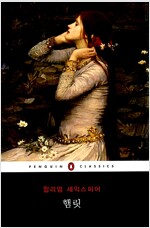
햄릿에 대해 괴테는 “지극히 도덕적인 한 인물이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던져버릴 수도 없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파멸”한다고(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말했다. 즉, 영웅이 되는 데 필요한 ‘억센 감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훗날 프로이트가 내놓은 해석은 주지하다시피 무척 당돌하고 발칙하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햄릿이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차지한 남자”, 즉 억압돼 있던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실현한 남자에게 복수하는 일만은 양심상(!) 할 수 없었다(프로이트, <꿈의 해석>)는 것이다. 햄릿을 근친상간과 친부살해의 틀로 읽어내려는 유혹은 여전하지만(어니스트 존스, <햄릿과 오이디푸스>) 그렇다고 수수께끼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햄릿>을 (<맥베스>와는 달리) 인물의 내적 정황을 담아낼 수단, 즉 ‘객관적 상관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위 실패작이라고 보는 견해(T. S. 엘리엇, 「햄릿과 그의 문제들」)도 있다. 한편, 투르게네프를 비롯한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은 햄릿을 (행동의 대명사인 돈키호테와 비교하여) 비대한 자의식과 사유에 얽매인 인텔리겐치아의 전형(‘잉여 인간’)으로 이해했다.



실상 햄릿의 가장 큰 매력은, 작품 자체가 그렇거니와, 그 성격상의 모호함과 흐릿함인 것 같다. 가령, 유령의 출현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햄릿과 그의 대화는 호레이쇼와 마셀러스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즉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어머니의 내실에서도 그는 유령을 보고 심지어 말도 주고받는데, 거트루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부왕-유령은 곧 햄릿(‘말-지식인’)의 내면에 깃든 또 다른 자아(‘행동-전사’)의 극대화된 표현이 아닐까. 다른 인물들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 시동생과 결혼한 거트루드는 아들의 날선 비난에 시달리지만, 당시 여성의 입지를 생각하면 별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녀를 향한 클로어디스의 감정도 단순히 정치적 야욕과 육욕의 발로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 내 죄 썩은 내가 하늘까지 나는구나. 난 인류 최초의 ― 형제를 죽인 저주를 받고 있다.”(123) 회한에 사로잡힌 이 카인의 후예에게는 분명 복잡한 전사(前事)가 있었을 것이다. 오필리어의 광기와 자살을 비롯, 모두 상서롭지 못한 결말을 맞는 폴로니어스 집안도 그 나름의 얘깃거리를 제공한다.
결국 문제는 삶과 죽음 사이의 길항이다.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94-95)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이라는 문장은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김정환 번역, <햄릿>)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말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를 끄는 인물은 묘지 인부이다. 그는 오랜 세월 시신을 다루어온 까닭에 생로병사에 무감각한데, 오필리어의 시신을 묻을 무덤을 파다가 나온 해골 중 하나가 선왕의 어릿광대 ‘요릭’의 것임을 금방 알아본다. 그것을 손에 든 채 햄릿이 호레이쇼 앞에서 늘어놓는 말이 새삼스럽다. “안됐다, 불쌍한 요릭. 그를 안다네, 호레이쇼. 재담은 끝이 없고, 상상력이 아주 탁월한 친구였지. 자기 등에 나를 수도 없이 업었는데, 지금은 ― (…) 알렉산더 대왕도 땅 속에선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나?”(183-184)

셰익스피어라는 작가에 대해 어떤 표상을 갖기가 힘들다. 그는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잘 썼고, 과장하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와 모든 인간형을 두루 섭렵한 유일한 작가였다. 그가 엄연한 영국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민족(지역) 문학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문학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인 듯하다. 극작가였을 뿐더러 연출가이자 극장 소유주이기도 했던 그는 살아생전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으며 여덟 살 연상의 부인과도 백년해로했다. 작품 창작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을 테지만 이 역시 오늘 날의 영화 작업처럼 흠이 아니라 그의 인화력을 방증하는 것이다. “뒤틀린 세월. 아, 저주스런 낭패로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내가 태어나다니.”(52) 1막 5장에서 이렇게 한탄하는 햄릿과 달리,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1세 치하 ‘황금시대’의 주역, 즉 시대와도 호응한 작가였다. 과연 천재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 <책앤>7월호.
-- <햄릿>을 좋아해본 적이 없다. 이번에도 (투르게네프의 <돈키호테와 햄릿>을 읽던 참에) 일종의 의무감에서 읽었고,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더라(나는 오히려 <맥베스>를 좋아한다). 반면, <햄릿>에 대해 쓰려고 이런저런 참고서를 뒤지던 중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정말 십수년만에(!) 다시 봤는데, 반가워서 가슴이 다 콩당거리더라. 취향이란 참, 이런 것이다!



-- 겸사겸사 <오셀로>와 <리어왕>을, 역시나 십수년만에(!), 슬쩍 다시 봤다. <오셀로>는 사랑(질투)보다는 오히려 (오셀로의) 계급의식이 더 돋보이고, 주인공들 보다는 이아고가 좀 수상쩍게, 즉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리고, <리어왕>은... 재산이 얼마가 되든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꼭 쥐고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노후 생활 지침서로 꼭 읽어야 하는 명작임을 새삼 확인했다..^^;; 글구, 딸도 소용없다는, 잘 키운 아들 하나, 세 딸 안 부러워...~~ -_-;;
-- 덧붙여, 가장 훌륭한 <리어왕> 중 하나는 구로사와 아키라가 만든 이 영화! <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