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 불문, 문제는 '사랑'이다.
세계사에 문제적인 인간이 많지만 나폴레옹은 과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법하다. 특히 19세기 소설을 전공한 나에게는 더 그렇게 여겨진다. 비단 러시아문학만이 아니다. 나폴레옹 이후 얼마간 문학(다른 예술도 그렇겠지만)은 이 이름, 이 신화에 무척이나 매달렸던 것 같다.



세 소설 모두 공히 '나-옹' 신화를 다룬다. 누가 제일 잘 썼나?^^; 이런 질문은 이미 무의미하고, 세 작가(소설)의 나-옹 신화에 대한 접근법을 논해야 할 것이다.
사실, 나폴레옹을 가장 객관적으로(과연? 러시아 작가가?) 그린 소설은 물론 <전.평.>이다. 아시다시피, 나-옹의 러시아 침공과 몰락,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조국전쟁(1812), 특히 보로지노 전투 등을 다루니까. 그러나, 내가 괄호 속에 썼듯, 러시아 귀족 작가의 눈에 나-옹은 프랑스 군인도 아닌, 코르시카 섬 출신의 꼰질꼰질하고 천박한 출세주의자, 야만적인 살인자, 애면글면 아등바등 천민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 반해, 러시아의 총사령관이었던 쿠투조프는 허벅지 위에 얹힌 물렁물렁하고 두툼한 뱃살과 (늙어서!!!^^;) 작전 회의에 꾸벅꾸벅 조는(아마 침도 흘렸을^^;;) 모습까지 포함하여 러시아적, 민중적 '지혜'를 대변한다.
반면, <적과 흑>은 쥘리앙 소렐을 내세워, 나-옹 신화의 내면을 추적한다. 대처로 나가 성공하고자 하는 목수 아들(기억이 맞나?)의 야망, 그것이 문제다. 한편으론, 연애 소설이다. 남자나 여자나, 19세기나 지금이나, 밑천 없는 자가 소위 '성공'하려면, 일단은 공부와 학력(자신의 머리, 재주), 그 다음은 결혼(흔히들 '취집'이라고 하지만 남자에게도 적용될 법하다)이다. 아시다피, 이 소설은 소렐이 레날 부인이 쏘고 그 일로 인해 사형 당하는 걸로 끝난다. 뱃속에 그의 아이를 담은 남작의 딸(?) 마틸다는 승승장구, 이 점을 지적하는 소렐을 통해 당시 프랑스의 계급 갈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여기서도 나-옹의 흔적이 보인다.
나아가, <죄와 벌>. 러시아땅에 정착한 나-옹은 프랑스 본토의 그것(<적과 흑>)보다 더 신화스러운 신화가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마 러시아의 특성인 것 같다. 가령, E. T. A. 호프만은 독일 작가이지만, 러시아 작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바이런 역시 마찬가지. 그는 영국시보다 러시아 낭만주의 시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다들 그 자체로, 그 문학으로가 아니라, 뭐랄까, 아우라로, 요즘으로 치면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 (영국, 혹은 프랑스 브랜드라면, 일단 사본다, 그리고 입는다^^;)
그래서 <죄와 벌>에는 나-옹은 고사하고 그의 초상화조차 나오지 않지만(소렐은 그의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다) 주인공 라스-프의 존재 자체, 그의 욕망 자체가 통째로, 지라르의 분석대로, 나-옹에게서 오는 것이다. 천재 = 나폴레옹. '이'가 아닌 '천재'를 꿈꾸는 가난한 청년에게 '나-옹'은 훌륭한 매개자가 된다. 그리고 소설은 그의 '형이상학적 욕망'을 통렬하게 단죄한다.
문제는, '사랑'.
스탕달과 도-키는 나폴레옹을 좋아한 것 같다. 그의 주인공들도 그렇다. 톨스토이는 나폴레옹을 무척 싫어했고, 그 역시 대놓고 드러난다. 그를 반영한 세 명의 남자 주인공이 공히 그러한 신화에 빠졌다가 이내 환멸을 느낀다. 니콜라이 로스토프 백작의 경우, 이런 욕망은 알렉산드르 황제에게로 향한다. 피에르(베주호프 백작), 안드레이(볼콘스키) 공작에게 있어 나-옹은 (극복되어야 마땅한) '청춘'과 거의 동의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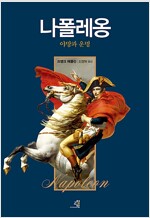
(마지막 책은 지금 검색해보고 알았다, 사봐야지.)
주경철의 책에 묘사된 나폴레옹은 조금도 매력이 없다. 아마 저자가 나-옹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나, 추정해본다. 그래서, 그의 신화를 벗기는 데(탈신화화^^;) 도움을 받은 글이다.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된 나-옹을 얘기하면서, "눈꺼풀을 드는 데도 힘이 필요한(?)" 곳이라고 나-옹이 썼다는 말이 왠지 기억에 남는다. 어릴 때는 '세인트헬레나 섬'하면 유럽 근처 어디인 줄 알았는데, 말이 대서양이지, 뭐, 당연하지만, 아프리카. 아, 더웠겠다! 지난 여름의 폭염을 상기해보면, 정녕 눈꺼풀을 드는 데도, 눈을 뜨고 있는 데만도 엄청난 힘이 필요한 곳이리라.
다시금, 사랑.
나는 톨스토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음, 굳이 싫은 건 아니지만 음, 아무튼 좋지 않다. 이런 화법은 어째 시댁과 시댁 식구들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 역시나 비슷한 맥락에서 '도리'라는 것이 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그 '도리'를 다 해보려고 하는데, 연구서들도 썩 재미있지 않다. 이른바 '소련' 학자들의 연구서들은 심지어 서문부터 '레닌' 어쩌고 아주 참을 수 없는 수준이다. 곧 죽어도 제사는 자정에 드려야 하고 곧 죽어도 삼년상을 차려야 한다는 꼰대 느낌^^;;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는 논문은 또 쓰일 수 없는 것도 맞다. 이게 싫으면("인용과 각주", 흑 ㅠ.ㅠ) 논문을 쓰지 말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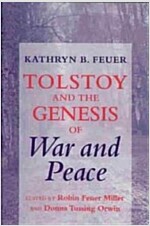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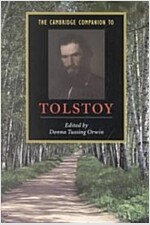
그래서 다시 나폴레옹. 오래 전에 본 소설인데 읽지는 않았다. 아마 이제는 영영 못/ 안 읽겠다. 복지관 옆 헌 책방에서 싼값에 팔던데...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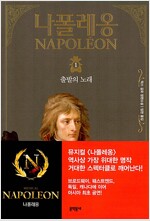


*

(Avenue-Of-The-Baobabs-Madagascar-By-Todd-Gustafson-740x497)
아프리카 하면 아무래도 <어린왕자> 덕분에 바오밥 나무가 떠오른다. 저건 마다가스카르 섬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