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해서 쭉 읽지는 못하지만, 그때그때 읽는 부분마다 감동적이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간결하고 힘있는, 접속사가 거의 없이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만으로 이어지며 훌륭한 맥락을 만들어는 그의 놀라운 문체이다. 그런데 그는 의사이고 그것도 내과나 정신과가 아닌 외과의, 심지어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외과의다. 아, 솔직히, 근래에 읽은 어지간한 소설(들) 보다 낫다. 몇 군데 옮겨온다.
"필사적으로 피를 막아내는 속도와 피를 부어 넣는 속도의 합이 파열된 장기로부터 터져 나와 쏟아지는 피의 속도에 미치지 못할 때, 핏물 속에서 환자의 장기를 더듬던 내 손은 서늘해졌다. 차갑게 식은 피와 굳어가는 장기가 손끝에 느껴지면 사신이 환자를 데려갔음을 알았다."(2, 11)
*
"내과와 외과를 구분 짓는 이유가 무엇이든, 외과를 업으로 삼는 우리의 일상은 갈라지고 짓이겨진 살과 부서진 뼈와 장기들, 끊어진 신경과 어긋난 조직, 솟구치는 핏물 속에 있었다.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다. 삶은 평범함과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나는 수술이 좋았고 수술방에 감도는 서늘한 감촉을 사랑했다."(1, 33)
*
"남자의 몸 안에는 이전에 받았던 큰 수술의 여파로 심한 유착이 남아 있었다. 복강 내 수많은 조직과 장기들은 다 엉겨 붙어 한 덩어리와도 같아 보였다. 복강 제일 얕은 곳에서 간 파열로 인한 피가, 쪼개진 간 조직 사이로 울컥거리며 뿜어져 올랐다. 환자의 피는 따뜻했다. 그것 하나가 그의 숨이 아직은 이상에 머물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 지루한 박리 수술이 끝나고 마침내 후복강까지 시야가 닿았을 때 나는 아연실색했다. 환자의 비장과 좌측 신장이 이미 적출되어 있었다." (1, 65)
수술 뒤 환자를 중환자실로 보낸 다음, 식사하는 장면, 이 챕터의 마지막인데, 이 정도면 소설작법 교본으로 써도 되겠다. 해맑은 어린아아와 사목하는(이런 표현 쓰나?) 목사의 대조. '나'(이국종)의 마지막 행위.
그날 저녁 교직원 식당이 문을 당아 외래객 식당으로 갔다. 밥맛을 느낄 수 없었으나 그냥 먹었다. 지나가던 아이가 나를 보고 물었다.
- 밥 먹어요? 혼자?
아이의 눈은 맑았다. 나는 그냥 짧게 고개만 끄덕했다. 다시 숟가락을 들려 할 때 원목인 손덕식 목사가 다가와 프린트한 기도문을 주며 말하고 갔다.
-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말없이 종이를 받아 식판 옆에 엎어두고 보지 않았다. (1, 68)
이런 부분 많지만, 읽으면서 울컥, 하는 대목.
"그는 예비역 해병이자 취업 준비생이었다.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한쪽 다리를 잃었고 인공항문까지 달았다. 20대 청년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독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래 괴로워하지 ㅇ낳았다. 좌절하는 대신 살아있음으로 가질 수 있는 나머지 가능성이 집중했다. 그 긍정이 놀라웠다. 그런 삶의 태도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보며 나는 부끄러웠다."(1, 76) "얼마 뒤 그 환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1, 77)
조직폭력배, "밤거리의 주먹들"을 수술하는 부분.
"나는 그들이 가진 적의의 근원을 알 수 없었고, 폭력과 살인의 명분도 이해하지 못했다."(79-80)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피의 박동을 느끼면서 나는 젊은 생명의 강한 힘을 확인했다. 죽어가는 환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손끝에서 사람의 생사가 갈린다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그 무게감에 짓눌렸다."(84-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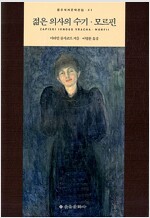
외과의사의 이런 체험을 생생하게 담은 소설로 불가코프의 초기 소설을 소개한 적이 있다. 모의대 특강에서도 읽었는데, 이국종의 책을 보니 참 무의미하다 싶다. 그때 나왔더라면 같이 읽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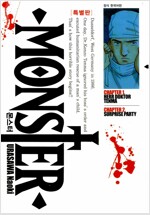

우라사와 나오키 <몬스터> 속의 외과의사 닥터 덴마.(일본 만화라, 일본인으로 설정^^;)
- 선생의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한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덴마에게 하는 말이다. 덴마는 결국 요한을 못 죽인다, 오히려 다시 살려낸다. 외과의, 이 surgeon의 손은 참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더 매혹적인지도 모르겠다. 손에 든 메스만큼이나 붓-펜을 잘 휘두르다니, 거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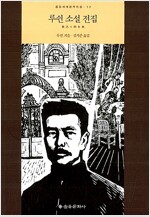
루쉰 역시 원래 일본 유학을 갈 때는 의학도였는데 돌아올 때는 작가-사상가가 되어 있었다. 사람 몸을 고치는 것보다 머리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고, 그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른바 환등기 사건. 음, 그 머리 역시 실은 몸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