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재작년인가, 계절 수업에서 한 학생이 '나'를 대상으로 소설(초고)을 썼다. '헐'이라는 말을 참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나 말고도 나를 미적(글의) 대상으로 삼는 자가 있다니. 나름 당혹스러운, 그러나 신선한 경험이었다.
시선은 권력이다. 사람을, 사물을 보고 그릴(쓸) 때 나는 권력자다.
사진 찍힐 때는 어떤가. 오랜만에 당혹스러운, 그러나 신선한 경험을 해보았다. 맞아, 이런 것이었지. 왕년에는 잘 나갔다고.
이렇게 화보 수준으로 많이 찍어야 하는 지면인 줄 알았으면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또 - 시간 맞추기도 힘들어) 안 갔을 것을, 일단 원고도 쓴 다음이라 가서 찍게 되었다. 몇 컷 올려본다.

(나는 얼굴의 정면이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

(구도와 배경은 좋았는데 '오브제'가 망쳤다.)

(전신컷은 싫어하지만 잘 나왔다.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익숙한 표정이다.)

(예쁜 배경에 비해 조금은 아쉬운 컷들.)

(책과 사람보다 빛이 좋다. 나에게 저런 표정도 있구나, 싶은 사진.)

(나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자가 없어진 지 오래라, 이런 사진 건지기(!) 참 쉽지 않다. 어깨를 좀 내려야, 허리를 세워야 디스크가 심해지지 않을 텐데.)
*
의도하지 않았으나 내가 갖고 간 책이 제일 훌륭한 소품이 되었다.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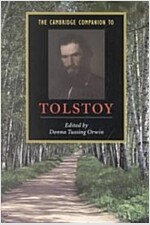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예쁜 모습은, 파마도 염색도 하지 않은 원래 나의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흰색 셔츠 블라우스에 약간 짙은색 청바지, 트렌치코트를 입고 사시사철 감기를 예방할 머플러를 두른 모습이다. 날씨가 추워서 두툼한 스웨터에 패딩 입고 가야했지만 사진을 찍으려고 무리를 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어, 한 몇 년은 쭉 쓸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문제는...
소설을 쓰는 것이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