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 올라가기 전, 집에 있던 책장을 뒤져서 가장 얇고 작은 책 한 권을 골랐다.
그리고 골방에 틀어박혀 밥때를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고 책을 읽었다.
그 때는 얇은 책이니 금방 읽겠지 했는데 일주일을 읽고 또 읽었다.
이해가 안 되어서...그게 <좁은문>이다.

처음으로 접한 사랑이야기가 이렇다보니...아마도 이후로 암암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며칠 전부터는 방에 뒹굴던 가장 작고 얇은 책을 들었다.
사놓은지 5년만인가?...그게 <독일인의 사랑>이다.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좁은문>이 생각났다...
20여년이 지나서 다시 손에 든 책이 이다지도 비슷할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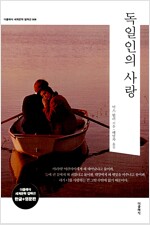
'자기 스스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말고는 그 누구도 타인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요. 또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남의 사랑도 믿게 되는 거지요.'
이와 비슷한 말을 에밀리 디킨슨이 시로 남겼다.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는 담지 못하지.
난 해피엔딩이 좋은데 요즘 읽는 책들은 죄다 슬프게 끝나고, 더럽게 짝사랑만 하다 끝난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로 끝나게 된다면, 아마 둘이 지지고 볶고 아이 키우느라 힘들고 세상사에 찌들어 플라토닉한 사랑이야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 어째던간에 결혼은 현실이니까...
이제는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책을 읽어야 할려나보다.
난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