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을 철학하다 -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에드윈 헤스코트 지음, 박근재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5년 4월
평점 :

절판

펜을 잡고
무언가를 끄적이고 싶을때, 예를들면 펜의 색깔과 느낌을 시험한다던가 할때 내가 주로 그리는 것은 몇 개의 별과 집 모양의 그림이다. 삼각형의
지붕, 사각형의 벽면, 그리고 창문을 그려놓는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현관문과 현관문에 동그란 손잡이까지 그려넣는다. 나에게 집이 무엇이기에 나는
자꾸 집을 그리는 것일까. 집을 그리고 나무 한두 그루쯤 그려놓았던게 아마 초등학교 시절부터가 아니었을까. 그만큼 나에게 집이란 무엇이길래 자꾸
집을 그리는 것일까. 나는 사실 결혼도 하지 않으려했지 않았나. 그런데도 나만의 집을 갖고 싶었던 것일까. 집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깊이
들어있었던 것인가.
퇴근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으로 향한다. 곧바로 집에 가면 아무도 없지만 퇴근후 집에 가는 게 좋다. 하루종일 긴장하며 지냈던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흥얼거리며 나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설렘이 먼저 다가선다. 음악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대충 집안
정리를 끝낸 다음 책을 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소파에 앉아 쿠션 두개는 등에 받치고, 무릎위에도 쿠션 한 개를 올려놓은 뒤 책을
편다. 출근하기 전에 읽었던 페이지를 펴고 책을 읽는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그 시간이 비록 짧더라도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는 시간이 참 좋다. 어떤 친구는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지만,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의 소중함을 자주 깨닫는다. 내가 사용하는 가구들. 거실벽과 부엌벽 양쪽벽면을 차지하는 책장. 오후까지 불을 켜지 않아도 환한
빛이 들어오는 부엌. 햇볕이 좋은 날이면 앉아 있기 좋은 거실, 발코니의 화분들. 우리집. 우리집에서의
시간.
건축과 디자인 평론가로 활약하고 있는 에드윈 헤스코트의 『집을 철학하다』라는 책을 읽었다. 다양한 모양의 집을 만날 수 있는 책인줄 알았더니
집을 이루는 각각의 공간들 즉 부엌, 거실, 침실, 서재와 창문, 문 손잡이, 책, 옷장 등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다. 저자가
각 공간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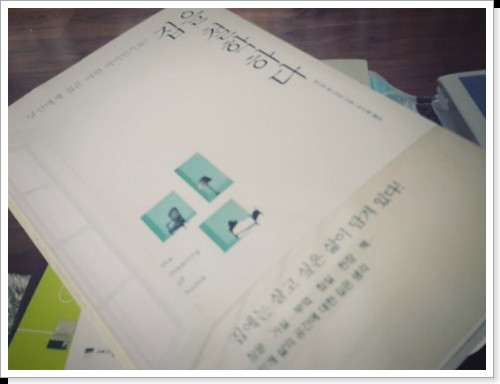
아래의 사진은 프랑수와 부셰가 그린 「퐁파두르 부인」이란 그림이다. 책 속에서도 이 그림이 수록되어 있고, 퐁파두르 부인에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는데 '침실'에 관련해 말하는 부분이다. 퐁파두르 부인은 프랑스 루이 15세의 정부였고 한때 왕궁의 안주인 역할까지 했었다. 중산층 출신인
퐁파두르 부인이 현대적 의미에 가까운 침실을 궁전에 도입했다고 한다. 베르사이유 궁전을 개조해 작은 방을 만들었고, 이런 방들은 섬세한 무늬로
장식돼 기품과 사적 공간의 개념으로 바꿨던 것이다. 이는 '로코코'라는 양식으로 불리워졌다.
저자는 책은 벽돌과 마찬가지로 건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 나는 이 사실을 책이 없는 집을 방문하고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집에 책이 없다는 사실은 내게 충격적이었고 오싹한
느낌마저 들었다. 책이 없는 집이라니! 단 한 권의 책도
없었다.
내부장식은 과도하다 싶을 만큼 완벽했지만 책의 부재로 집은 미완성의 느낌을 주었고 심지어 집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 느낌은 일종의 상실감이었다. (33페이지) 라고
말했다. 나도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맨처음 보는게 그 집에 책이 있는가, 어떤 책이 있느냐이다. 집안에서 한 권의 책도 발견할 수 없다면 나
또한 굉장히 놀랄 것도 같다. 저자는 건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책과 서재를 따로 분리해 설명하고 있었다. 서재의 용도는 집필 공간 혹은
집필에 필요한 책을 읽는 공간이라고 표현했다.
외국영화를 볼때면 신랑이 이제 막 결혼한 신부를 안고 문지방을 넘는 로맨틱한 장면이 있었다. 책에서도 문지방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는 어렸을때
복 달아난다고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들었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악한 영혼을 피하고자 신부를 안고 문지방을 건넜다고 했다.
문지방은 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벽'에 대해서 말할때 프루스트가 자신의
침실 벽에 코르크로 덧대 바깥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해 추억에 집중했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처음 결혼하고서는 아직 정이 들지 않은 내 공간이 어색했는지 부모님이 계신 친정집이 그리웠다.
가고 싶은데 못가게 되면 우울하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친정집도 불편하고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는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아마도
이건 내가 살아온 시간이 쌓였기 때문일 것이다. 쌓인 시간이 마음 저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하게 지금도 가끔 한번씩 꾸는 꿈이 있다. 꿈 속에서 나는 오래전 시골에서 살았던 집이나
언덕을 오르는 길, 논밭이 펼쳐져 있는 길들을 걷고 있었다. 가본지 20년쯤 되었는데도 어렸을때 자랐던 곳이 꿈에 나올때면 참 신기하다. 마치
그림처럼 선명하게 추억의 장소들이 떠오른다.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시절들을 그리워하기 때문일까. 내 기억의 편린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집을 지탱하는 벽은 앞서 그 집에 살았던
모든 이의 영혼과 그 집에 대한 모든 기억, 그 집을 향한 모든 그리움을 품고 있다. (맺는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