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연애에 이름을 붙인다면
시요일 엮음 / 창비 / 2024년 2월
평점 :



하루에 한 편, 시를 읽다 보면 많은 시를 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마음마저 희미해지고 시를 읽지 않고 있었다. 출근길에 책을 펴고 시를 읽는다. 너무 많이 읽지 않기 위해 애썼다. 시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하므로. 마치 마음에 새기듯 그렇게 읽었다.
사랑에 관한 시는 언제 읽어도 설렘을 준다. 가슴 떨리는 사랑을 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듯 읽게 되는 시였다. 시 큐레이션 앱 '시요일'에서 기획한 시 67편은 뭉클하고도 설레는 고백의 순간들이다. 마음을 열고 시어들을 받아들인다.
그 여름
찬물에 자주 체하고
달려가는 낮잠
폭우처럼 한꺼번에 끝나는 시간표
끝날 듯 다시 이어지던 불꽃놀이
종례는 빼먹었다 (34페이지, 최지은 「여름」 중에서)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였던 때,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웠던 때를 떠올렸다. 지나고 보면 아름답기만 한 시간이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겨울의 뒷모습과 매듭을 잊은 시간으로부터
나는 오늘 상춘객, 꽃 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차가운 손끝 혼자의 나들이 물어물어 찾아간 청매 홍매야 내 마음이 들리니 목소리가 들리니 봄의 입김으로 풀리는 살갗이 환하게 아프겠다, 아프지 않겠다
누군가 날 생각하면 신발끈이 풀린다는 말 (41페이지, 이은규 「매화, 풀리다」 중에서)
아직 겨울이 채 가기도 전 매화를 보러 갔다. 매화가 가장 먼저 핀다는 도시에서 붉게 핀 매화를 그저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면서 곧 스러질 꽃을 바라보는 게 좋았다. 마치 인간의 삶 같아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일까.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자연의 섭리에 감동했다.
당신이 오기로 한 골목마다
폭설로 길이 가로막혔다
딱 한번 당신에게
반짝이는 눈의 영혼을 주고 싶었다
가슴 찔리는 얼음의 영혼도 함께 주고 싶었다
그 얼음의 뾰족한 끝으로 내가 먼저 찔리고 싶었다 (112페이지, 이설아 「겨울의 감정」 중에서)
시는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감정을 통제한 언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때문일 것이다. 겨울의 풍경을 노래한 이설아의 시를 보라. 눈이 내리는 풍경과 당신이라는 이름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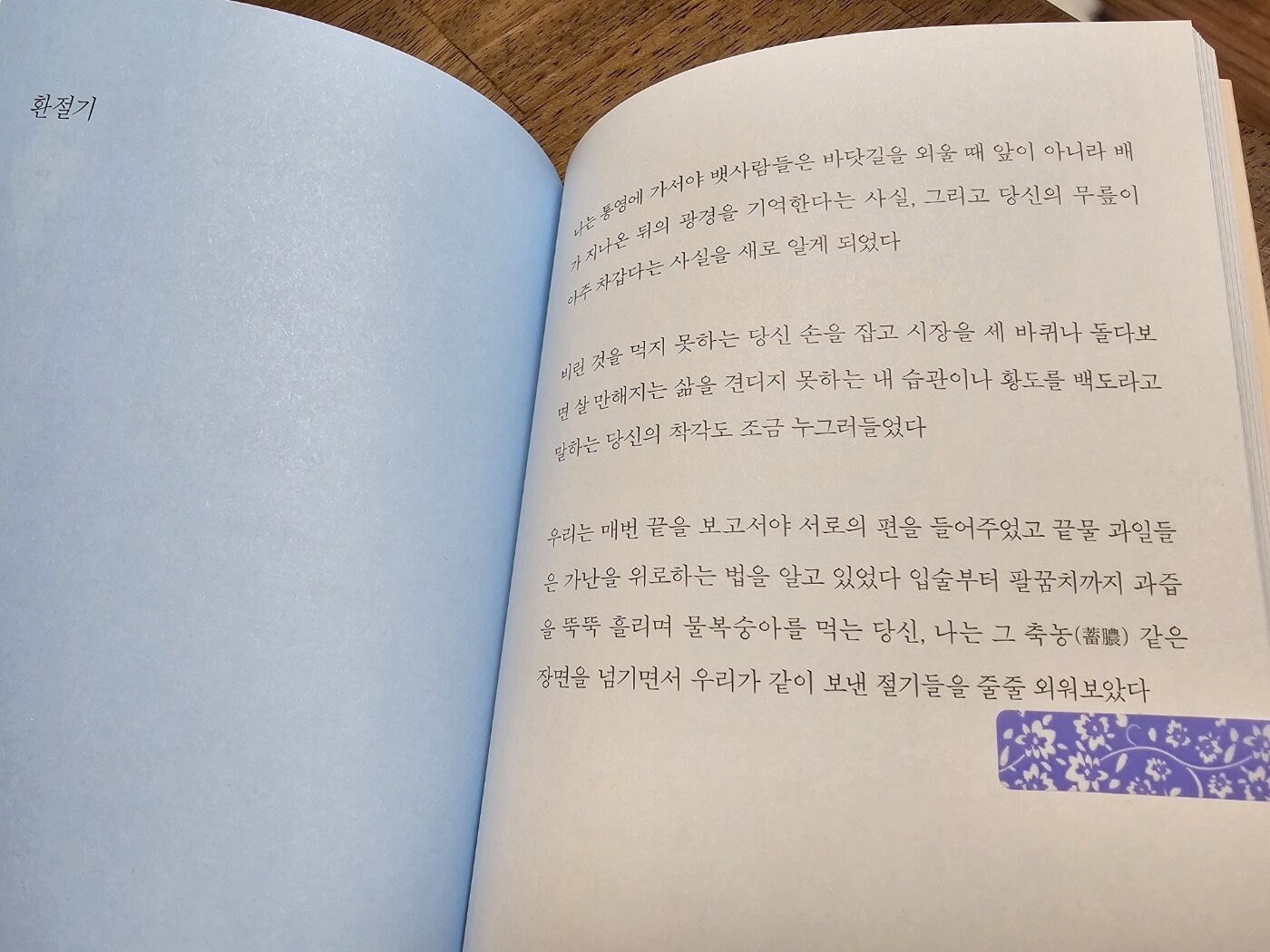
우리는 매번 끝을 보고서야 서로의 편을 들어주었고 끝물 과일들은 가난을 위로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입술부터 팔꿈치까지 과즙을 뚝뚝 흘리며 물복숭아를 먹는 당신, 나는 그 축농(蓄膿) 같은 장면을 넘기면서 우리가 같이 보낸 절기들을 줄줄 외워보았다 (145페이지, 박준 「환절기」 중에서)
박준의 시는 언제 읽어도 감동이다. 시를 읽으며 너무 좋다, 라고 하고 이름을 봤더니 박준 시인이었다.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시집이었다. 고백의 순간들, 사랑에 아파했던 순간들.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한 순간들. 아마도 사랑을 떠올릴 때면 자주 들춰볼 시선집이다.
#이연애에이름을붙인다면 #시요일 #미디어창비 #책 #책추천 #시선집 #시집 #한국문학 #한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