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눈 깜짝할 사이 서른셋
하유지 지음 / 다산책방 / 2019년 3월
평점 :



내 나이 서른셋이었던 때가 언제던가. 생각해 보면 까마득하다. 회사 생활과 첫 아이 육아를 도저히 병행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둔 때였나. 둘째 아이를 막 낳고 두 아이 때문에 내 생활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야말로 지쳐있었던 시기다. 서른셋이라는 내 나이가 없었던 때였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얼마나 젊고 좋은 시기인데, 그 시절을 우리는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이 소설 속 서른셋의 오영오가 달리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모가 말하는 서른셋의 영오는 힘들면 직장을 그만두어도 되는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은 것이다.
학습지 출판사의 국어과 편집자. 새해가 되어도 참고서를 편집하느라 밤 새우는 건 기본. 피로에 절어있다. 폐암 투병을 하던 어머니가 죽은 후 아버지를 일곱 번 정도 밖에 만나지 않았다. 서로 데면데면했던 아버지가 죽은 후 그가 남긴 것이라곤 수첩 하나와 전기밥통 뿐이었다. 아버지의 수첩 속에는 '영오에게'라는 말고 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을 뿐이었다. 홍강주, 문옥봉, 명보라. 이 세 사람의 연락처를 휴대폰에 입력하고,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새별중학교 수학 교사인 홍강주를 만나 나머지 두 사람을 찾기로 했다.
소설의 화자는 영오와 영오의 출판사로 전화를 걸어 국어 문제와 다른 일상적인 것들을 물어오는 중학생 미지다. 영오와 미지가 번갈아 가며 소설을 진행하는 식인데, 영오와 통화하는 미지를 보면 미지가 영오보다 어쩌면 한 수 위인 것만 같다. 미지는 고등학교를 안가겠다고 버티고, 치킨계의 여왕인 엄마로부터 집에서 쫓겨났다. 물론 직장에서 잘린 아버지와 함께다. 재개발되기를 바라 아직 팔지 않은 개나리 아파트 702호에서 아빠와 함께 기거하게 된다. 우연히 옆집 고양이 버찌가 발코니 틈새로 건너오게 되며 옆집 할아버지 두출의 심부름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소설 속 인물들이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을 아버지가 피는 담배라고 우겼던 영오, 형의 죽음을 함께하지 못했던 홍강주,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미지 등. 누군가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드러내야 하는 아픔이었다.
오영오. 난 너라는 문제집을 서른세 해째 풀고 있어. 넌 정말 개떡 같은 책이야.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어. 삶의 길목마다, 삶의 고비마다, 지뢰처럼 포진한 질문이 당장 답하라며 날 다그쳐. (40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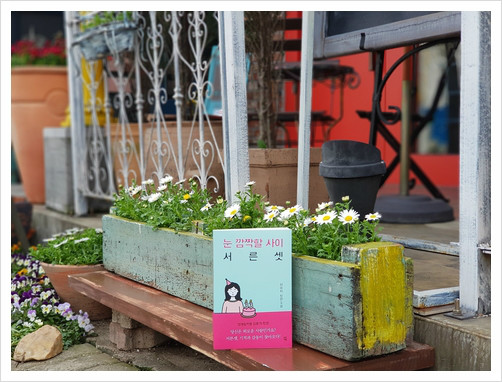
누군가의 죽음은 늘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 그 죽음이 가족일 경우와 타인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죽음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고,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 아마 죽음에 대한 회피를 하는지도 모른다. 엄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에게 지우고, 형의 죽음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괴로움을 안고 있고, 어떤 아이의 죽음에 대한 고통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모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뒷편의 모습이었다.
상처를 가진 자들이 모여 함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상처에 가까이 다가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더는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 죽음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소설이 슬프지 않고 오히려 따스하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이처럼 하나처럼 움직일 수도 있구나 싶다. 나이를 떠나 친구가 되고 처음에 다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한다.
사람을 안다는 건 참 어려워. 그렇지? 이해한다는 건 더 어렵고. 그 사람이 나든 남이든 말이야. (193페이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혹은 부모님이 죽었다는지 하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다. SNS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말들을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못하듯 말이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듯 다가갔다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이런 소설이 좋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지도 모른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운다.
벽을 뛰어넘은 우정이라고 해두죠. 나이의 벽, 사고방식의 벽, 살아온 역사의 벽, 집과 집 사이의 벽, 등등. (290페이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볼 일이다. 모르는 사람들과는 친해질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은 싫은. 그렇지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곳,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을 내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움을 얻는다. 그걸 잊지 말자.
덧. 이 책을 모집할 때 작가, 표지, 제목, 분야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블라인드 서평단 모집이었다. 최근에 챙겨 본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 나왔던 방식.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소설 만으로도 안도했던. 정작 책을 읽고난 뒤에는 무척 감동한 소설이기도 하다는 걸 밝히고 싶다.
난 너라는 문제집을 서른세 해째 풀고 있어. 넌 정말 개떡 같은 책이야.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어. 삶의 길목마다, 삶의 고비마다, 지뢰처럼 포진한 질문이 당장 답하라며 날 다그쳐. (40페이지)
사람을 안다는 건 참 어려워. 그렇지? 이해한다는 건 더 어렵고. 그 사람이 나든 남이든 말이야. (19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