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지 뉴욕의 맛
제시카 톰 지음, 노지양 옮김 / 다산책방 / 2018년 4월
평점 :

절판

어딘가로 여행갔을때 맨먼저 검색해보는 게 그 도시의 맛집이 아닐까. 물론 그 지역의 '가볼만한 곳'도 곧잘 검색해 보지만 말이다. 맛집을 검색했을 때 어떤 식당의 홍보를 위해 쓴 사람의 글도 있기에 그다지 믿을 건 못된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블로거들이 쓴 맛집이 진짜 맛집인 경우도 있더라. 만약 여행중인 지역에 지인이라도 있다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우 말고 현지인들이 맛집으로 꼽는 장소를 찾게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최근에 가보았던 통영에서도 다찌집을 찾을 때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곳을 찾았고, 완도 여행시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곳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경우도 있으니 여전히 검색하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 글을 쓴 작가가 실제 푸드 블로거라고 한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소설이라 미식업계에 대해 상당히 직접적이다. 어떻게 별점이 매겨지는지 민낯을 알게 되었다. 물론 블로그에 책 리뷰를 쓰는 이들도 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지 않을까 싶다.
책 속의 주인공 티아는 뉴욕대 대학원생으로 음식학 석사 과정이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음식 작가를 꿈꾸었다. 그녀가 쓴 글 하나로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그녀의 글을 칭찬했던 헬렌 란스키의 밑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싶었다. 헬렌은 뉴욕타임스의 푸드 섹션 에디터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인턴이 되어 헬렌을 도우고 싶지만, 뜻하지 않게 미각을 잃은 마이클 잘츠의 푸드 고스트 라이터가 된다. 여기에서 마이클은 뉴욕타임스의 미식 칼럼니스트다. 마이클이 사례로 주는 명품 드레스, 백, 구두를 무시하지 못한다. 헬렌과 친분이 있는 마이클이 그녀의 인턴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제안때문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미각을 잃은 음식 칼럼니스트가 고스트 라이터를 내세워 그녀가 쓴 음식평의 단어 하나까지 그대로 칼럼을 싣는 일이었다. 어떻게든 음식 칼럼니스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을테고, 자신이 미각을 잃었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의 글이 신문에 그대로 나타나자 괜한 우쭐함까지 느끼는 티아가 점점 변해가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잘생긴 셰프가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사랑을 속삭이는데 반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을까. 티아에게는 이미 예일 시절부터 사귀었던 남자 친구 엘리엇이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여자들에게는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레스토랑의 서비스, 분위기를 무시하지 못한다. 맛있다고 소문난 레스토랑, 셰프가 빼어난 미모의 남자라면 여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고, 음식을 접대하는 웨이터들조차 잘생겼다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때로는 좋은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나타내 준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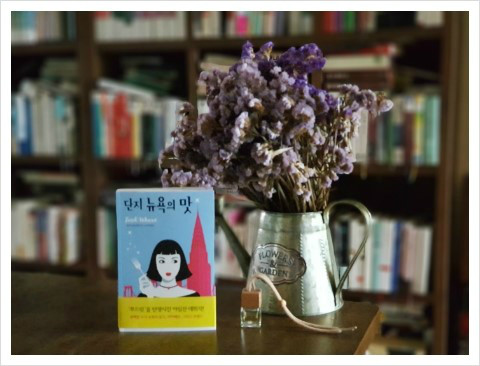
이십대와 삼십대 미혼 여성의 일과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을 칙릿이라 부른다. 『단지 뉴욕의 맛』은 칙릿 소설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티아가 음식을 주제로 한 글을 쓰기 때문에 푸드릿이라고 평하기도 한 것 같다.
글 쓰는 건 항상 좋아했고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보다 저는요, 뭔가 나만의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나로 정의하는 특별한 것 말이에요. (363페이지)
별 갯수에 따라 식당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레스토랑은 어떻게든 별점을 많이 받고 싶다. 푸드 칼럼니스트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가 도착하는 즉시 관리에 들어간다. 직원들은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원을 내세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무리 변장을 해도 금방 알아보지 않을까. 소설에서 마이클이 티아와 함께레스토랑 순례를 할때 변장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처럼 꾸며도 그 사람 고유의 인상이 있지 않은가. 눈가리고 아웅, 식이다.
그럼에도 소설은 재미있게 읽혀진다. 티아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취향의 엘리엇과는 어떻게 될까. 매력적으로 다가온 바쿠샨의 셰프 파스칼은 과연 티아를 사랑하는가. 그녀가 그토록 염원했던 헬렌의 인턴은 할 수 있을까. 궁금함에 계속 읽게 되는데, 작가의 첫소설이라 처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온다. 풋풋함이라고 해야할까. 전부터 그랬지만 맛집 블로거들의 글은 딱 반만 믿기로 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훌륭한 맛이지만 나에게는 아니듯 음식 취향이란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에 맛집으로 유명한 어느 식당은 점심 시간에 번호표까지 빼고 줄을 서지만, 나에게는 질색인 경우처럼 말이다.
티아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다.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지만 좀처럼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마침내 찾았다고 여기지만 이 또한 이용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럼에도 진정한 '나만의 것'을 찾으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