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공간에서 통제되는 행동과 언어들 [대리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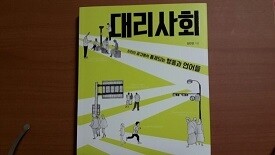
저자는 309동 1201호라는 필명으로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대학에서 8년간을 현대소설 연구자로 살아왔지만 2015년 12월,
안락하다면 안락하고 불안정하다면 한없이 불안정한 대학에서 나왔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와 아이 둘 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의 암담함을 느끼고 기꺼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감수한 것이다.
남들이 보면 번듯한 화이트 칼라지만 그 안에서 부대끼는 사람들에겐
화이트 칼라는 무슨, 번듯한 건강보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유령'일 뿐이었다.
지방대 시간강사의 안과 밖에서 느끼는 괴리, 그 거대한 틈을 과감하게 까발리고
기어이 대학의 틀을 벗어났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 추켜세우고 싶지만 그가 살아내고 부딪쳐야 할 현실이 녹록지
않기에
그 감탄의 말조차 내기 조심스럽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 사회가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이라고 했다.
나자신의 두 발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뜬금없는 강펀치를 날리는 셈이다.
은밀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대리사회의 괴물'은 그 누구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행동하고, 발화하고 사유하지 못하게 한다. -7
대학의 연구자가 아니라 거리의 언어를 기록하는 작가로 서있는 그가
바라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그러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대학이라는 곳에 대한 애정을 과감히 차버리고 삭막한 사회로 들어선 저자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우리가 처한 사회가 균형잡힌 평균대 위에 똑바로 놓인 채 서술되었다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신성한 노동의 현장에서
두 발로 직접 뛰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리의 인문학을 펼쳐낸 것이라면
일독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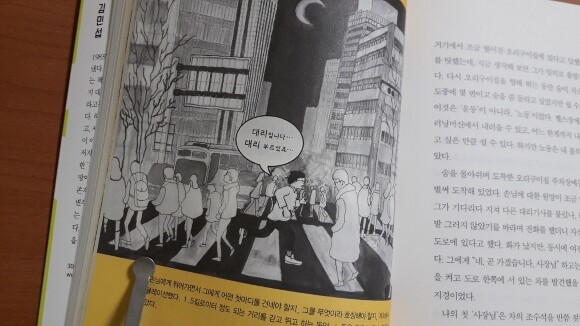
첫 손님에게 뛰어가면서 그에게 어떤 첫마디를 건네야 할지, 그를 무엇이라
호칭해야 할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했다. 1.5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걷고 뛰고 하는 동안, 노동은 운동이 될 수 없음을
알았다.-44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우치게
해주었다. 대리 운전석에 앉는 순간, 주체로서의 저자는 사라지고 대신 대리로서의 인간이 그 자리를 채운다.
타인의 운전석에서는 호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내 코는 냄새의 주인이 아니며, 나는 내
귀의 주인도 아니다.
마침내 자신이 가장 합리적인 공간으로 믿었던 '대학'도 역시 우리 사회의 욕망을 최전선에서
대리하는 공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제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고 박사과정의 논문을 쓰고 강의 하는 동안 그는 계속 '경계인'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대학에서 밀려난(?) 처지가 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설
용기를 내어 다시 거리로 나아갔다.
거리의 언어를 몸에 새기고 계속해서 글을 써나갈 것이라고 한다.
대리인간으로 밀려날 것인지, 스스로 물러서고 다시 나아오는 주체가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