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밤에 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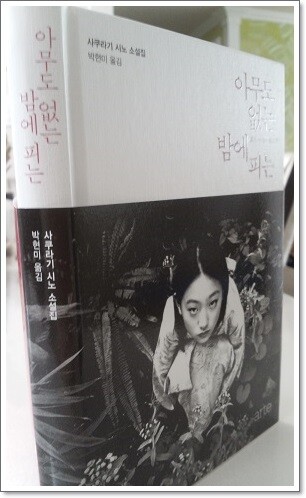
단편을 참 잘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쿠라기 시노. 아르테에서 이번에 소개된 건 장편 [순수의 영역]과 단편집 [아무도 없는 밤에 피는]인데, 왠지 단편에
끌리더라니...
어쩐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싫어서 책을 아무렇게나 펼쳐 처음 만나게 되는 작품부터 읽으리라 마음먹고, 짠~ 하고 펼쳤더니 [바다로]라는
작품이 나왔다.
으~ 기둥 서방 겐지로와 겐지로에게 속수무책으로 약해지는 여인 치즈루의 정사 씬이 한창이었다. 흠칫 하며 눈을 살짝 들어 책 속에서 빠져
나오려 했지만, 도무지 그 분위기를 더 들여다보고 싶어져서 참을 수가 없었다. 보려면 처음부터 봐야지.
치즈루는 자신을 모욕하는 남자인 겐지로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회사를 경영한다던 가토의 전속계약 제의를 받아들이고 억지로 쾌감을
느끼는 척 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돈을 받고 사라진 겐지로는 어색한 전화를 끝으로 연락이 없고, 가토는 실은 기름 냄비로 튀김을 만들어내는,
쇼핑몰 매장 간이 점포 '가토 상점'의 주인일 뿐이었다.
창문 너머에 평평하고 잔잔한 강 표면이 보였다. 날이 밝기 전에 나가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하고 만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진다.
치즈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겐지로와 가토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82
뭔가가 내 기억 속의 한 장면을 건드리고 갔다.
특별히 모난 데 없이 수더분하고 대부분의 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나의 유순한 성격은 내 밑의 두 여동생들과 딴판이다. 첫째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는 그저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아, 내 성격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진 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 시장 입구에 살았던 환경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맹모삼천지교라고, 부모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 좋은 환경으로 옮겨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네 전통을 이루고 있을 진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 좀 더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다 자리잡지 않으시고 어쩌다 시장입구에다 보금자리를 마련하셔서 어린 시절, 미리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게 하셨는지 원망하고 싶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그 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세상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시장 입구에서 중국집을 하셨던 부모님. 배달이 주를 이루는 곳인지라 배달을 하는 부모님을 따라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게 되기도 했고, 앞집,
옆집, 뒷집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도 다니던 곳들이 횟집, 여관, 이발소, 레코드점, 돈까스집, 미용실, 쌀집 등등이어서 여러 형태의 가게들에
대해서 빠삭했던 어린 시절이었다.
특히 단정한 어른 여자가 되면 갈 기회가 없는 곳이, 아저씨들이 가는 이발소(안마 시술소라고 하나?^^), 나이트 클럽 등이 아닌가
싶은데, 어린 여자아이였던 나는 그 곳을 놀이터 삼아 놀 수가 있었다. 이발소 언니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이발소 특유의 뒤로 젖혀
지는 안마 의자에 드러누워 보기도 하고 솔에 묻혀 바르던 면도 크림의 향기를 한껏 맡아볼 수도 있었다.
나이트 클럽은 낮에 가면 맥주 냄새, 양주 냄새가 스며든 퀴퀴한 카펫의 냄새가 베어든 빨간 계단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샹들리에의
반짝반짝하는 파편들을 만지작거리며 놀 수 있었고, 어느 날 밤엔가는 쿵쾅거리는 비트의 음악에 맞춰 둥근 무대위에 올라가 요염하게 춤을 추는
댄서도 살짝 볼 수 있었다.
만화방을 가다가 살짝 다른 골목으로 빠지면 재래시장의 으슥한 골목에 일렬로 작은 쪽방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안이 다 비치는 하얀 커튼
뒤에서 짧은 치마 속옷만 입은 머리 긴 언니들이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몹시나 퇴폐적인 몸짓으로 앉아 담배를 피거나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음. 말하자면 어린 나이에 천천히 알아도 될 세상의 비의를 일찍 깨치게 되었다고나 할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커가면서 어른의 세계에 노출될 때마다 또래 여자 친구들은 "밤에 피는 그녀"들의 일상에 대해 사춘기적 감상에 젖어 호들갑을 떨며 얘기꽃을
피울 때, 나는 담담하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 때에는 이미 "그녀"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무대의 스트리퍼이건, 몸을 파는 창녀이건, 환한 대낮에 맨숭맨숭 혹은 푸석푸석한 맨얼굴을 드러낸 그녀들은 가끔 나에게 웃음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가까이 불러 먹을거리를 쥐어주기도 했던 "언니"들이었기 때문에...
아, [아무도 없는 밤에 피는]에서는 그렇게 내 기억 속에 넣어 두고 별다른 구획을 정해 놓지 않았던 "그녀"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다.
특히나 밤무대 스트립 댄서인 시오리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바람 여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 작가가 쓴 이야기였기에 특이하기도 했지만 나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로 너무나 공감가는 글이어서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다.
여자라서 여자의 이야기를 더 잘 쓸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 또한 여자라서 관능적이고 섹시한 묘사, 올바른 몸가짐을 가진
진짜 무희의 삶을 진지하게 적어내려간 작가의 이야기에서 더 깊은 떨림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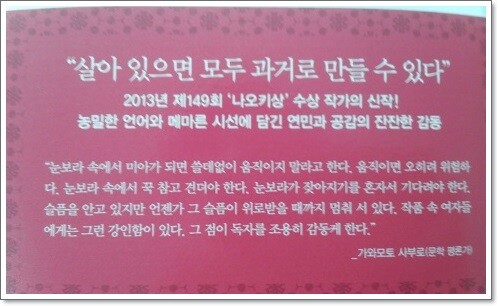
여자가 쓴 여자 이야기. 쓸쓸함을 안은 채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지만 휭하니 불어오는 시린 바람에 몸을 움츠리고 기어들어가는 여자들이
아니어서 좋았다. 나약하고 여자에게 빌붙고 뭐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남자들에 비해 유독 강인하고 대찬 여자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문장 속에서
"밤에 피는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