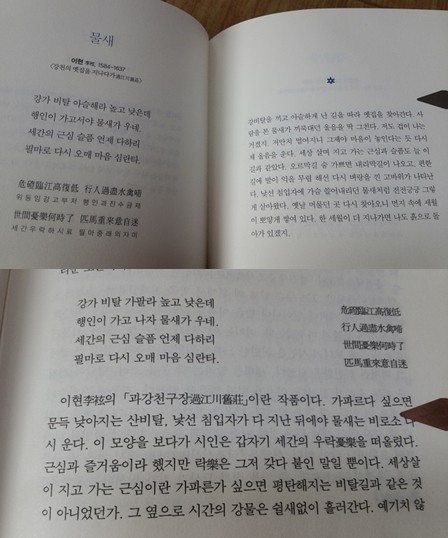그때의
지금인 옛날-[우리
한시 삼백수]
괜히
시를 멀리 하고 살았다. 짧게 함축된 언어 속에서는 도무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이해되는 것이 없어서 시가 어려웠다. 예전에는
그저 짧기라도 했지, 요즘의 시는 점점 장문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더 말을 뱅뱅 꼬아놓아서 이건, 이해해달라는 말인지 그저 눈으로 감상하라는
말인지...점점 화가 날 뿐이어서 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한자로 된 시가 아닌데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농도
짙은 방-이혜미
재채기
하기 직전 너의 부푼 가슴에서 벼려진 바람을 본다
몇
움큼의 공기와 뼈를 스친 액체들과 안으로 뻗은 촉수로
제
속을 잘게 잡아뜯는 패각의 오랜 습관을 안다
열쇠없는
몸을 가져 온몸으로 한 방이 된
손을
넣어, 불안한 가장자리를 만지며,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오랜
면벽 뒤에 남는 아름다운 껍질들이 있다
숨을
크게 내쉬면 하늘을 뒤덮는 나 아닌 것들
모든
스킨십은 뼈를 향한다 예의를 모르는 손님처럼
그저
분위기만을 감지해낼 수 있을 뿐, 언어는 둥둥 떠나녔다.
시가
점점 멀어져갔다.
그런데도
오래된 유행가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음에 살포시 들어오는 구절을 한 번 따라 읊어보거나 종이에 옮겨 적어보면 그것이 그대로 시가 된다.
신기하다...신기하다.
시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문학을 심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르고 걸러낸 언어로 함축적인 상징과 비유를 쏟아내어 종이 위에 구불구불 하게 늘어서
있는 글자들의 조합인줄로만 알았는데,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참으로 오묘하다, 했다. 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번에
정민 선생님이 우리 한시 삼백수를 가려 뽑아 책으로 냈는데, 왜 하필 삼백수인가 했더니 <詩經, 시경> 3백편의 남은 뜻을 따르려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삼백은
동양 문화권에서 최고의 앤솔러지란 뜻과 같다. 최고의 걸작만 망라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전문가의 눈으로 걸러낸 최고의 시들을 감상하는 것 뿐.
우리
한시는 형식이 다양했는데, 이번 삼백 편은 그 중에서도 7언 절구만을 뽑은 것이다.
절구이니
그다지 길지 않은 압축적인 형식이긴 한데, 그래도 7언이라 또 그렇게 짧지만도 않은 것이...
우선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이...어라, 어렵지 않네? 였다.
무엇보다
시의 구성이 기존 한시가 소개된 책과는 달리, 한글로 완전하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시경>의
시가 아무리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의 정신을 반영한 최고의 시라 한들, 그것이 인구에 회자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의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한자가 종이에 도배된 책을 누가 펼쳐나 보겠는가.
일전에
정민 선생님이 <한시미학산책>이나 아이들을 위한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등을 펴내 한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때가 있었다.
지금의
이 책은 그 때보다 더 현실에 걸맞는 구성과 형식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일단은 “쉽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 것이 무엇보다 반갑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어려운 한자에 눈살을 찌푸리며 곧바로 덮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경 삼백편의 뜻을 고스란히 살린 우리 한시 삼백편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溫故知新
,옛 것을 오늘에 호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눈앞에 현실화시킨 위대한 저작물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다.
그때의
지금인 옛날.
옛날
사람들의 감정을 녹여낸 7언절구가 한자가 아닌 한글로 눈앞에 놓여 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만 있었더니 감이 굴러떨어졌다.
3,4조의
가락으로 운율을 제대로 살리고 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한시가 한 상 잘 차려져 있다.
한시의
어려운 제목 대신 아름답고 쉬운 한글 제목으로 다시 태어난 7언절구 앞에서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감사합니다가 되뇌어졌다.
7언
절구의 한시가 한글 입말로 마음 속에 살포시 걸어들어왔다.

정민 선생님의 한시 미학산책을 오랜만에 꺼내 보았다. 우리 한시 삼백수를 그 위에 살포시 놓았다. 한 눈에도 대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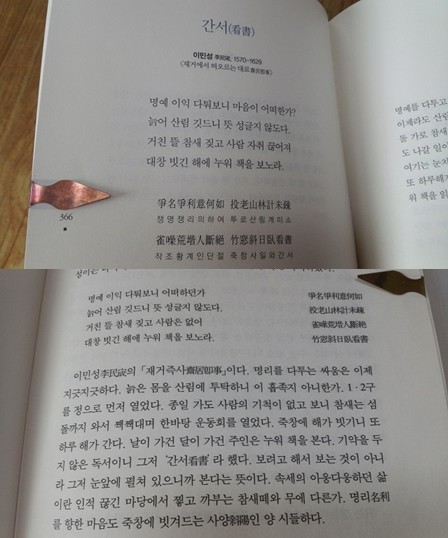
두 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한시제목이 한글 제목으로 탈바꿈했고,
시의 해석도 좀 더 자연스럽다. 부지런한 정민 선생님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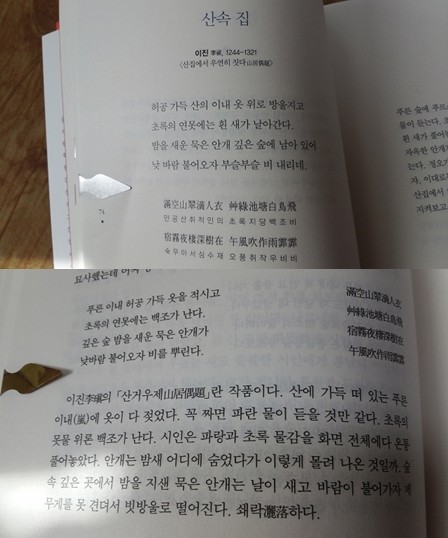
정민 선생님의 해석이라도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다.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었다. ^^
지금이나 옛날이나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움직임은
예서 거기일 테지만, 옛시를 다시 읊으니 마음이 청신해지는 느낌이 든다.
개인의 취향일 테지만, 한시가 정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