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의 환상과 역설 [나의 타자]

솔직히 이 책은 이해하기 버겁다.
정신분석학 이론에 대해 심도 있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깡이니 프로이트니 하는 대가들의 이론을 어느 정도 알아야 아는 척이라도 해볼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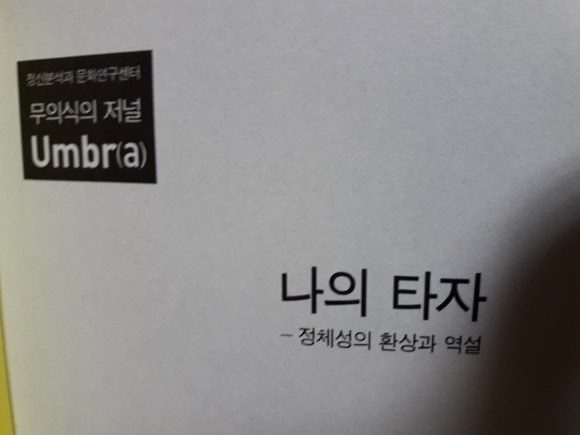
<무의식의 저널 엄브라> 총서 중 하나인 이 책은 저널 엄브라를 번역한 것이다.
이번 호는 정체성으로 향해가는 여정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각 논의가 제시하고 있는 철학적, 논리적, 성적 함의를 살피고 있다고 한다.
저널에 실린 필자의 면면을 살펴 보면 그 무게와 깊이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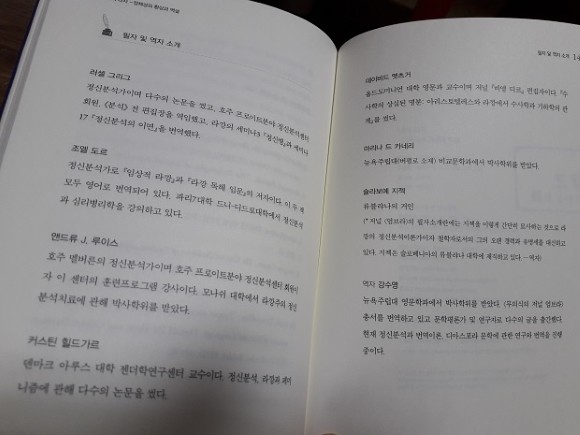
류블랴나의 거인으로 불리는 슬라보예 지젝을 비롯해 러셀 그리그, 조엘 도르, 커스틴 힐드가르 등의 필진이 눈에 들어온다.
필자들의 소논문을 읽는 느낌으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에서는 현대정신분석이론의 연구자들이 정체성과 자기 동일성 개념, 또 사회구조에 대항한 주체의 저항가능성 등을 어떻게 이론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전문용어와 이론체계 등에 문외한이라 100%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간이 눈에 띄는 문학작품, 영화 등에 나오는 인물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어렴풋이 소경 코끼리 더듬듯이 실마리를 잡아 가며 읽었다.
보통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인문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더 심도있게 파고든다.
정체성, 주체, 실체의 본질 등을 각기 다른 기호를 써 가며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역자 서문에서 밝힌 인상적인 한 문장에 밑줄을 그어 본다.
정체성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불가피한 일종의 가면과도 같은 것이라면, 주체란 그 가면 뒤의 '나'라는 어떤
실체이며, 그 실체의 본질은 틈이다.
이 주체의 틈으로부터 라깡이 이론화하고 지젝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한 '윤리적 행위'가 빛을 발하고 나온다. 결국
정신분석이론의 행식믄 상징질서에 균열을 내는 행위자는 다름 아닌 주체라는 점이다.-12
역자 서문에서 이 책의 지향하고 있는 이론적 분석의 대상을 좀 더 확실히 짚어주고 있는 셈이다.
오리무중인 것처럼 보이던 시야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치는 느낌이랄까.
이 부분을 지침 삼아 더듬더듬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 본다.
"정신분석에서 동일화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헤 대한 최초의 표현" 이라고 프로이트는 말했다.
랭보의 "나는 타자" 라는 선언은 끝없이 타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정체성에 대하여, 나와 타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틈새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주제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SNS상에 자기를 노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요즘, 진짜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자기과시욕 때문에 화면 안에서는 멋지게 포장하지만 현실의 자신은 제시되는 프레임만큼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와 실체의 나 사이의 간극은 스스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다.
정신분석은 바로 이처럼 알아채기 어려운 그 간극을,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노정된 모순과 역설을 탐색하는 것이라 말한다.
분석은 치유의 과정일 뿐이라는 말은 얼핏 냉정해 보인다.내부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툭하면 위로니 힐링이니 하며 기대려 하는 어설픈 과정에
대해 내뱉는 쓴소리다.
정신분석의 목적은 '주체의 결핍'을 겪는 것이라 주체 내부의 상처와 마주하기, 미완성의 나, 실패가 불가피한 '나'를 만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다.
세상에 던져진 순간부터 상처입고 실패하게 되어 있다, 라고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있으니 어쭙잖은 다독임을 기대하고 있는 이라면, 마음
단단히 먹고 책장을 넘기시길.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는 라깡의 유명한 문구는 주체의 욕망이 '내 것'이 아니라 대타자가 무엇을 욕망하는가의 문제,
대타자의 결여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대타자가 수수께끼라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된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나는 그에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수수께끼는 진술이 없는 발화이다. 따라서 어떤 발화도 수수께끼가
될 수 있다. -88
<환상으로서의 성과 증상으로서의 성>이라는 커스틴 힐드라르의 글이 가장 가깝게 느껴졌다. '미투운동'이 한 때 시끄럽게 사회를
달구었었는데, 도대체 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읽어보면 좋을 내용인 것 같다.
남성적 극이 더 문화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가치를 논리학적으로 차분히 풀어나가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졌기에, 여성은 남성에서 나왔다. 남성은 클리셰이고 여성은 이 형식과 규범에서 파생된다.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상징계에서 증상으로 변장한 채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환상은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대답한다. 환상은 불가능성에 대한 답이며 결여를
덮어버리고 질문이 계속되기를 막는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성의 모든 표상들은 환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과 여성은 '실재'에서 사유되어야
한다. 대충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보자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조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계속적인 수수께끼를 던지면서 우리는 여성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 같다.
얇은 책이지만 '나의 타자'라는 제목을 충실히 파고드는 책이다.
비록 용어와 이론에 있어 막히는 부분이 있지만 정체성, 특히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이라면 수수께끼를 풀어나갈
해답을 하나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