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란한 타인들>은 유이월 작가의 첫 소설이다.
모르는 작가가 쓴 첫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약간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는 유이월 작가가 SNS에 올리는 유머러스하고 재기발랄하며 돌직구처럼 대담한 글을 꾸준히 읽은 터라 두려움 없이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찬란한 타인들>을 주문했다.
하필이면 주말에만 가는 본가로 배송지를 선택한 탓에 일주일 내내 발을 동동 구르며 이 책을 읽고 싶어 했다. SNS에 재미있는 글을 대방출하는 한편 톡톡 튀는 아이템을 파는 자칭 거상이 쓴 소설이 무척 궁금하더라.
우선 작가 소개를 읽었다. 매일 그녀의 글을 읽지만 지나온 행적을 모르기 때문이다. 문학을 전공했고 글과 관련된 여러 직업을 거쳤다고 한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지금은 한국에 산다. 빛나는 혹은 재미있는 순간을 발견하길 좋아한다고.
<찬란한 타인들>을 다 읽고 나서 저자 소개를 다시 읽었는데 내가 읽어본 가장 잘 저자 소개 글이라고 생각한다. 저술과 관련한 저자의 경험과 소설의 내용을 적확하게 암시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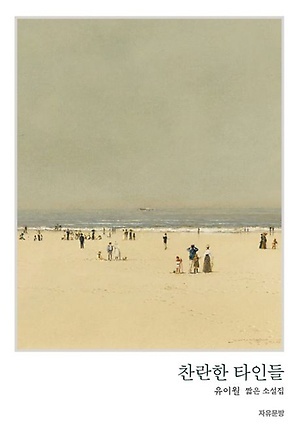 |
| ▲ <찬란한 타인들> 찬란한 타인들 |
| ⓒ 자유문방 | 관련사진보기 |
빛나며 재미있는 순간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괴테는 인간은 누구나 특별하며 고귀한 존재라고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만의 고유한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살아온 행적은 한편의 드라마틱한 소설이다. 누구나 소설 같은 인생을 살지만 누구나 소설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빛나고 재미난 순간을 수도 없이 만나지만 유이월 작가처럼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유이월 작가가 SNS에 글을 자주 올리는 이유도 알겠다. 그녀는 재미나고 신기한 순간과 에피소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글솜씨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을 캐치하는 센스와 그 순간을 기록하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한다.
<찬란한 타인들>은 신기하고 재미난 짧은 소설 모음집이다. 한 편이 몇 쪽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담긴 서사, 반전, 유머, 통찰은 하나같이 <백 년의 고독>과 같은 대작을 떠올리게 한다. 이 소설집의 가장 큰 매력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종종 문학마저 흑백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등장인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쭉 그 길을 걷게 하는 구도는 식상하며 현실감도 떨어진다. 유이월 작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여러 겹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과연 <찬란한 타인들>에는 작가의 이런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가령 '강아지 모리'를 살펴보자. 주인공은 더 이상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집에서 수십마일 떨어진 기차역에 버리고 온다. 그런데 영리한 반려견은 그 먼 거리를 되돌아온다.
반려견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만 결국 주인공은 다시 반려견을 같은 장소에 유기하기로 결정한다. 반려견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현실에 놓인 주인공의 마지막 말은 유이월 작가의 모든 역량이 발휘된 가장 기발하면서도 인간미가 넘치는 소설의 마지막 구절이다.
'거기에 버려야 모리가 또 나를 찾아올 테니까'
도벽이 있어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친구를 향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돼서 기뻐'라고 축하해준다거나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럼없이 총을 들이대는 업자가 방금 협박한 사람의 가게에서 맥주를 들이키고 값을 치르며 '그래도 양아치는 아니다'고 너스레를 뜨는 장면 들이 모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중 캐릭터를 보여준다.
게다가 고객이 의뢰한 일을 처리하느라 총으로 사람을 협박한 다음 '요샌 총 없이는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의 극한값을 맛보게 한다. 대체 유이월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찬란한 타인들>은 <신기한 타인들>로 제목을 바꾸어도 좋은 만큼 신기한 사람 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리고 톡톡 튀는 반전과 유머도 이 책의 매력을 더한다. 배꼽이 두 개인 여자, 본인과 똑같은 점을 가진 사람이 근처에 오면 그 점이 움직이는 신기한 신체를 가진 여자, 구치소에 대한 리뷰를 남기고 별점을 남기는 사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을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등.
가끔 재미난 책을 칭찬하기 위해서 '아껴가면서 읽었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쓴다. 그러나 <찬란한 타인들>은 실제로 아껴가면서 읽게 되더라. 반대로 이 소설이 176쪽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심으로 다행스럽다. 한쪽 한쪽 넘길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피식 웃게 되는 것도 만만찮은데 기발한 문장을 기록하느라 볼펜과 공책까지 찾아야 하니까 말이다. 인간은 모두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