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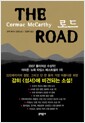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여름에 읽고는 홀딱 반한 작가 코맥 매카시. 그는 1933년생이다. 나이가 일흔을 훌쩍 넘겼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을 이 책을 꽤 오랫동안 잡고 있었다. 한번에 쭉 읽어나갈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지구가 멸망을 한걸까. 왜. 자연재해 때문인가. 아님 전쟁때문인에?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폐허가 된 그 길위에서 남자와 소년의 비참한 여정은 시작된다. 굶주림, 추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읽는 내내 엄습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늘 너무나 배가 고프다. 죽을 만하면 어디선가 부패해가는 통조림을 발견한다. 너무나 춥다. 담요와 방수포로 온몸을 감싸고 그렇게 하루밤을 길 위에서 샌다. 우리말이 아닌 번역된 소설에 이렇게 감정이입이 된다는 것은 번역을 잘 한때문도 있는 것 같다.
하루하루 지쳐가고, 누워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려 했으나 생각할 삶이 없었던 남자. 그에게 희망은 자신의 아들인 소년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실제로 그는 소년의 뒤에서 빛나는 빛을 보았다. 이 소설은 아버지와 아들의 여정이지만 특별히 부성애를 강조한 것 같지는 않다. 가족의 연이 아닌 타인이라고 설정했어도 그 의미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끔찍한 세상이라도 그저 여기에 너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걸까.
남자는 소년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사는게 아주 안좋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나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우린 아직 여기 있잖아.
생각에 따라서 그 희망의 의미가 무엇일지 찾는 것은 독자의 몫일 것이다. 옮긴이의 말처럼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소설은 무구한 상상한 낳을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