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의 <일곱해의 마지막>을 주문했더니 책 안에서 엽서가 두 장 나왔다. 그중 봄밤의 벚꽃사진에는 김연수의 친필로 짧은 메세지가 적혀있었다.
"눈 드물던 겨울과 입 다문 봄 지나 뻘써 뜨거운 여름이네요."
그렇지 입을 다물고 지낸지 반년이 지났지.. 길거리에 마스크 잘 쓰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어제는 왈칵 눈물이 나왔다. 다들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지.. 쉬이 감동하고 쉬이 울적해지는 날들이다. 작가의 말대로.. 모두들 여름의 끝까지, 아니면 올해의 끝까지가 될지라도 지치시지 말기를....
 6권에서는 북유럽의 르네상스와 제대화, 베네치아의 미술 등을 다루고 있다.
6권에서는 북유럽의 르네상스와 제대화, 베네치아의 미술 등을 다루고 있다.
다시 보게 되는 화가 반 얀 에이크와 알브레히트 뒤러(!).
뒤러는 여행하며 본 것을 낱낱이 기록했는데 사실 뒤러가 영향력있는 화가로 훗날 인정받는 것은 그가 남긴 방대한 기록때문이었다고 한다. 풀과 곤충을 그린 그림이 인상적이다.
이탈리아 화가들이 원근법을 적용한 공간에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신체를 그려넣으려고 했다면 북유럽 화가들은 피부, 머리카락, 주름 등 눈에 보이는 세부를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할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북유럽 회화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피렌체의 산타 크로세 성당,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베네치아의 프라리 성당(산타 마리아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성당)은 나중에 꼭 가보고 싶구나.

역시나 흥미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 어렸을 적 감동받아 읽은 마리 퀴리를 어른이 되어 읽으니 또 다른 감동이 있다. 그나저나 너무나 가난했고, 일을 하는 와중에 자녀를 길어내는 부분이 남의 일 같지가 않구나. 팡테옹에 나란히 누워있는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 무덤이 생각났다.
라듐 추출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류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포기했던 과학자 부부. 피에르가 죽은 뒤 다른 과학자와의 사랑은 깜짝 반전이네! 모르고 있었다.
1918-1920년의 인플루엔자, 일명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사상자 수가 900만이었다-엄청난 사건이었다.
<위대한 개츠비>는 반드시 영문판으로 읽어야한다는 말에 잭각 주문했으나 그대로 책장행... ㅎㅎ 언젠가 읽게 될 날이 오겠지.
최민석 작가의 유머는... 이런 진지한 책에서도 빛을 발해 재밌게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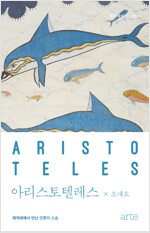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스승인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는 허구이고 진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의식활동에 대한 기술, 습성과 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수많은 정치체제에 대한 기록은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아테네의 거류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래서 말과 행동에 늘 조심을 해야했을 것이다. 기원전 사람이라 여행을 하며 발자취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여튼 그 오래전 사람의 저작물이나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구나.
윤리적으로 승인된 행동은 반복을 통해 내면의 습성으로 굳어진다.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을 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일을 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반복을 통해 내면의 습관으로 만들 것! 기억해야겠다.



매일 글쓰기를 하면 글이 이어져서 천을 짠 것처럼 또 다른 자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외국어 공부는 새로운 자기를 만드는 일, 미지의 자기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를 비롯해 일본어가 모어인 사람들은 일본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생각해선 안 되는 일, 입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이 금기로 머릿속에 일본어로 설정됐다. 다시 말해 일본어로 글을 쓰면 자동적으로 금기를 건들지 않게 된다. 대신에 외국어로 글을 쓰면 이 금기를 배척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것을 과감하게 쓰기도 하고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 나기도 한다. p.208
생각의 그릇인 언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 하나를 더 갖는 것이다.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불어를 공부해볼까... 볼까만 어언 몇 년.. 실행으로 옮겨보자.
불볕더위가 기다린다고 한다.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남은 6개월도 열심히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