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5/03/14/RQCFNNAKLVCE3J4PQ65RWABOIA/

헤더윅은 뛰어난 건축가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완성도를 찬찬히 따지지 않고, 단지 영국 런던이라는 이름값에 기대어 선택했다면 그것은 문제다. 깊이 있는 안목이 결여된 처사다.
노들섬의 사운드스케이프도 이미 헤더윅이 맡고 있다. 그외에 익히 아는 DDP는 자하 하디드, 리움은 렘 콜하스 외 3인,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했는데, 국내에서 눈에 띄는 건축물 상당수가 외국 건축가의 손을 거쳤다. 외국 건축가가 설계해야 네임밸류가 높아지고,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참여해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잠시잠깐의 반발은 지나가는 파도라고 여길 것이다. DDP의 경우도 당시 청계천 일대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비판은 거의 줄어들었다. 아마 서울시의 시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역풍은 사그라들고 가치가 결국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에펠탑 건축할 때도 프랑스인 모두가 입을 모아 철근 덩어리라고 비판했고, 아이엠페이가 루브르 앞에 유리피라미드를 박자 모든 프랑스 비평지가 합심해 비난했다. 그러나 이제 에펠탑과 유리피라미드는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다. 비슷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혹은 국내 건축가를 선정할 경우 파벌 간의 다툼과 시샘을 피할 수 없으니, 차라리 외국인을 기용하여 논란을 비켜가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 건축사무소는 볼멘 소리 일색이리라. 국내 건축가보다 외국의 명망이 선정 과정에서 우선시되었다고 발끈하리라. 사대주의라고 비판하리라. 과거 명나라, 일본, 미국으로 옮겨 가며 외세를 숭배하던 태도가 시대를 달리하며 또다시 반복되었다고 말하리라.
서로 복잡한 입장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서울시나 국내건축가들이나 모두 공감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혹시 이 사안의 핵심이 외국 숭배 혹은 해외 사대주의라고 정의한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한다. 문제를 정확히 인지해야 고치고, 고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한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대주의가 외국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보는 것인가? 어떤 시점까지는 전자였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이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는 후자다. 그 몇 가지 흐름의 파도는 88올림픽, 90동구권붕괴, 92여행자유화, 2002년 월드컵, 세계화, 2010년 이후 한류붐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스페인보다 약간 많으며, 실질 GDP 또한 다소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유럽과 미국 앞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것과 달리, 우리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춰 보는 경향이 있다. 튀르키예의 경우 남북한을 합친 정도의 인구를 지녔는데 경제력은 우리보다 네 단계가량 낮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을 거치며 자국만의 표준을 세웠던 제국 운영 경험에서 비롯된 문화적 자부심이 있다. 자기를 낮춰보지 않는다. 유럽과 아시아 둘 다의 교량이라고 포지셔닝한다. 한국은 한자문화권과 구미세계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힘이 있는데도 그렇게 포지셔닝하지 않는다. 포지셔닝은 누가 시켜주는게 아니라 스스로하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학부시절 교수들이 서양 백인 남성을 대할 때는 마치 왕을 모시듯 공손한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순한 어린 양 같아 보였다. 박사과정에서 자신을 길러준 스승에 대한 존중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기댄 학문의 뿌리를 인정해야 자신의 권위 또한 공고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60년대 남성 교수들만의 습관으로 여겼으나, 이후 서양 백인 여성 작가의 글을 번역하는 여성 지식인들의 태도도 유사한 것을 보고나서는 단순히 성별을 넘어서는 구조적 현상처럼 보였다.
현재 지위와 권력을 가진 윗 세대만을 탓할 수만은 없다. 당시 그들이 살아온 시절과 시대정신이 그러했다. 일본과 서구의 것이 최상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인식과 경험은 나이가 들더라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당시는 국산 제품의 품질은 미흡했고, 해외 수입품이 훨씬 퀄리티가 좋았다. 국내 대학들은 데모에 공부를 안했고, 해외 유학 가서야 공부다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며, 미국 실험실과 연구실의 수준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고, 해외 이론이 우리의 것보다 더 세련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해외를 높이 평가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국산 기술과 제품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국전쟁으로 못 사는 분단국가에서, 힙하고 잘살고 멋진 나라로 긍정적으로 변한 이후에는, 오히려 지나치게 스스로를 낮춰 보는 경향으로 전환된 듯하다.
이는 우리가 너무 빠르게 발전한 데다, 과거 세대가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는 이 이중의 난제가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사람들의 인식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건축사무소에서도 뛰어난 작품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해외의 것이 더 우수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야 하지만, 문제는 실현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건축 프로젝트는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다. 그래서 이미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해외 건축 회사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그게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무소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국내 건축계에 기회를 먼저 주자니, 국제적인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외국 건축가에게 맡기자니 국내 건축가들이 성장할 기회가 사라진다. 결국, 어디로도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이 늪 속에 점점 기회는 이미 가진 자에게 편중되고,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마태복음 효과, 즉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험의 축적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결국, 국제-국내 건축 산업 내 양극화로 이어진다.
오히려 서울시는 프리츠커상으로 인해 헤더윅 사무소에 일감이 아주 많이 몰려있는데 다른 나라를 제치고 우리가 로비해서 잘 따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억지로 역차별하는 것이다. 억지로 국내건축사에 일감을 주는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믿고 맡기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신설해서.
이 방법은 중국도 미국도 이미 해 본 일이다. 중국의 자국 기업 우선 정책(국가 자주화 전략国家自主化战略 혹으 국산화 정책国产化政策)이라든지,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이라든지.
전자는 말 그대로 이해하면되고,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미국의 의학과학에서 특히 여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과 분야에서 남성이 수리지능이 우세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것은 자연스러운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학습되었다고 비판하며, 어린 시절부터 남아에게는 장난감을, 여아에게는 인형을 쥐여 주고, 남아가 수학과학에 뛰어나면 더욱 칭찬하는 문화가 이러한 이공계 대학진학에서 성차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그러니까 기계공학과에 남성이 100명, 여성이 2명인 구조가 왜 생겼는가, 원래 남자가 수학을 잘하나 아니면 칭찬해줘서 그런가, 이런 편향적인 성비가 정상인가,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가, 에 대한 미국 교육계의 고민이었던 것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느 여성 흑인 CEO는 자신이 개발자라고 소개하면 투자자들이 모두 박차고 나갔다고 했다. 여성과 흑인이 수학과학을 못한다는 인식이 만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교육계는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자해서, 과학계 내 여성 롤모델을 양성하기 위해 일정 부분 역차별까지 감수하며 여성/유색인종 교수 채용과 여성/유색인종 과학 인재 양성에 힘썼다. 그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과학인들이 모두 온전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의 자국산업보호정책이나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억지로 다른 대상을 억눌러서 불평등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 기회균등을 위해 감수해야한다는 대승적 의지가 있었다.
이대로는 국내 건축사무소는 모두 고사한다.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건축은 어렵고, 자라온 땅에 대한 이해와 익숙함을 버리고 해외에, 베트남이나, 떠오르는 신흥시장 인도, 인구 급증하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에 설계하러 갈 수밖에 없다. 적게는 물갈이에서 크게는 시스템부재까지, 또 다른 엄청난 도전과 시련이다.
국내에서 프리츠커상이 배출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내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건축가가 수상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직 국내 건축사무소 중에서는 그러한 반열에 오를 만한 곳이 없는 듯하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과도 맞닿아 있다. 제대로 된 일감을 공급받지 못한 탓이다. 한국 건축가들에게 국제적 명성을 쌓을 만한 랜드마크 프로젝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
헤더윅은 훌륭한 건축가지만 언제쯤 우리도 그만큼 훌륭한 건축가가 나올까
----
이후 SNS에 다음과 같이 알려주신 분이 있었다. 덕분에 몰랐던 것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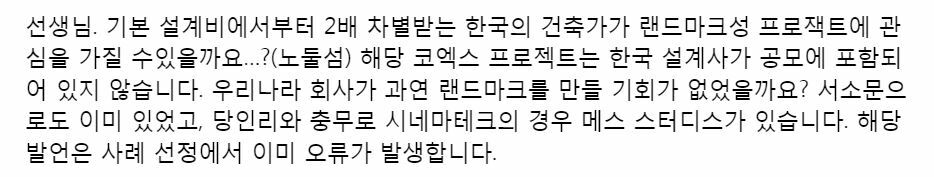
매스스터디 등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다.
https://www.c3ka.com/city-attempts-exhibition/
http://architecture-newspaper.com/v40-c07-kmj/
https://www.elle.co.kr/article/1866005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 천지고, 나의 글은 온전하지 않다. 더 많이 읽고 전문가들로부터 배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