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35세, 건강하기만 하던 명문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의사가 갑작스럽게 폐암을 진단받고, 척추까지 전이되어,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다면, 그는 나머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인가?
영화에서나 있음직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내의 이야기는, 그가 세상을 떠난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도, 뉴 잉글랜드 저널 등 의학잡지 뿐 아니라, 뉴욕 타임즈와 가디언, 뉴욕커 등에 실리고 있고, 그가 암 진단을 받은 후 쓰기 시작하여, 사망한 후에 발간된 책 (When Breath Becomes Air )은 이미 베스트 셀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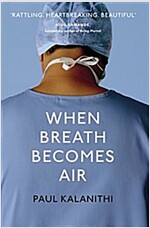
폴 칼라니티 (Paul Kalanithi)는 미국 Stanford 대학 신경외과의사로,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고, 등에 통증이 느껴져서 CT 검사를 받아보고,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은 말기 암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고, 결국 처음 암 진단을 진단 받은 후 2년 후인 2015년 3월 15일에 사망하였다.
완치가 불가능한 폐암 진단 후 2년간의 그의 삶을 크게 3 가지로 나눈다면,
1. 먼저 아내와 상의하여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인공 수정 방식을 통하여 딸을 낳았다. 그가 사망할 당시 딸은 생후 9개월 이었다.
2. 2년간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그대로 받았다. 수술/회진/진료를 수행하였고, 신경외과 수련을 마치는 날의 행적과 일정은 잡지 뉴욕커에 기고 하였다.
3. 학부 시절에 영문학을 전공한 자신의 오랜 열망이기도 했던, 책 쓰기를 시작하여, 죽기 직전에 탈고하여, 원고는 그의 사후에 부인에 의하여 출판하였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아이를 갖고자 햇을때, 아이와 이별하는 것이 너무 괴롭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Don’t you think saying goodbye to your child will make your death more painful?” asks Lucy. Kalanithi responds: “Wouldn’t it be great if it did?”)
흔히 죽음을 준비한다고, 웰다잉이다, 유서 쓰기 등을 생각하는데, 이런것은 현실적인 죽음의 준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너무 과격한 발언일까 ?
소위 말하는, 버킷 리스트나, 유서 쓰기, 혹은 사전의료 지시서, 유언 공증 등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 불평할 필요도 없고, 놀랄 일도 아니며, 사실상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면..
언제 올지도 아무도 모르니, 미리 예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조바심 낼 일도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죽음이 찾아올 것인가를 고민할 일도 아니고.. 미리 예견하고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 ?
Dr. Kalanithi 삶의 방식은 “ 얼나마 오래 사느냐 ?”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건, 오래 살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오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여 오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다.
건강을 위한 노력도 사실상은 - 무었이 건강에 좋은 것인지가 항상 바뀌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 사실상 대부분은 무의미한 일이다.
아마도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하고, 누군가가 돌봐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의미가 있는 지도 모른다.
“ 오래 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라면, 너무 과격한 의견일까?
DR. Paul Kalanithi 의 웹사이트 : http://paulkalanith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