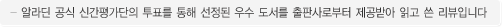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 박범신 논산일기
박범신 지음 / 은행나무 / 2012년 4월
평점 :



'웅'하고 벌이 날았다. 아니, 그런 듯 느꼈다. 아카시아 꽃잎이 오월의 파편처럼 등산로에 흩어지던 어느 날, 그 메마른 시간에 농부들은 여느 해처럼 씨를 뿌리고, 마른 하늘을 원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세월을 곰곰 되짚어가며 이쪽 논배미에 이른다. 무심한 세월이었다. 지나온 발자욱이 순간의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휑한 가슴에는 피죽바람이 분다.
아침마다 오르는 등산로 입구에는 산을 깎아 일군 비탈밭이 있다.
오늘도 습관처럼 산을 오르는데 사래 긴 밭에 가득 심어진 고구마에 일삼아 물을 주고 계신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차가 닿을 수 없으니 등산용 배낭에 물을 지고 날라다 그 넓은 밭의 농작물에 병아리 오줌만큼이라도 목을 축이게 하려면 오죽이나 힘들까마는 굽힌 허리는 펴질 줄 몰랐다. 한 시간 남짓 운동을 하고 내려올 때도 노인은 여전히 물통을 손에 쥐고 마른 땅에 물을 축이고 있었다.
내가 인사를 건네며 말을 걸자 그제서야,
"워낙 가물어야지요."하며, 일손을 놓고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다. 쩍쩍 갈라진 손바닥을 가로질러 흩어지는 푸른 담배 연기처럼 농부의 지난 세월이 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 위에 올챙이가 하얗게 배를 뒤집고 가득히 죽어 있던 풍경이 아스라히 스쳐 지나갔다. 그의 삶에도 몇번쯤 지금처럼 마른 먼지 풀풀 날렸던 시간이 있었을 게다. 속만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그런 시절이 분명 있었을게다.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사람은 누구나 애틋한 향수를 가슴에 묻고 산다.
잊고 싶을만치 어렵던 시절이 세월의 풍상에도 닳지 않는 석문(石紋)처럼 핏줄을 타고 흐르다 적당한 시간에 이르러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리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 했던가? 나는 뼈마디가 툭툭 불거진 농부의 거친 손을 보며 아날로그적 감상을 서두에 적었다.
소설가는 때로 감정적이다 못해 충동적일 때가 많다.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글로 배설하는 행위, 그것이 곧 소설이며, 시이며, 문학이다. 책에서 펼쳐지는 일상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야 독자는 크게 공감하는 법이다. 책에서는 항상 나와 크게 거리가 있는 신들의 세상을 접할 뿐이라면 어느 누가 책을 읽을 것이며,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쪼개려 들겠는가. 작가 박범신은 항상 그렇게 충동적이었고, 일반 독자와 충분히 닮아있었다.
"이제 내 문제를 알겠다. 쓸 때만 '생각'할 뿐 나의 일상은 거의 정서적 '충동'에 지배받는다. 감으로 결정하고 급한 맘으로 행동한다. 나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앞의 수를 내다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 생각하면서 쓰고, 충동적으로 일상을 운영한다. 이 나이까지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논산행을 결정한 것도 그렇다." (P.184)
작가는 그렇게 2011년 어느 가을날 논산행을 결정했고, 그렇게 그는 떠났다.
고향이라는 패찰이 붙어있을지라도 그곳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고 그는 썼다. 새로운 시간의 레일을 따라 새로운 공간에 처음 온 것이라고도 했다. 어쩌면 그는 지나온 시간보다 남겨진 시간을 추억하는지도 모른다. 새로이 겪는 순간순간의 경험을 추억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1980년대, 나는 작가 박범신이 소설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TV에 가끔 등장하는 인기없는 연예인쯤으로 생각했었다. 겉표지에 또렷한 그의 이름 석 자를 보면서도 TV 속의 그와 활자 속의 그를 짝짓지 못했었다. 내게는 그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누군가'였다. 이 책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TV에 가끔씩 얼굴을 비치던 예전의 그는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많이 의식했던 듯하다. 그러나 페이스북에 올린 두서없는 글들을 모아 엮은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코 꾸미려 하지 않는 모습, 남들과 구별짓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곳곳에 보인다. 작가가 자신의 고향 논산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머물렀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물이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나를 낮추고 지우는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가 집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나를 지워 빈집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고 나면, 비로소 어둔 밤도 어린 연인처럼 사랑스럽다. 어둠이 지금, 내가 없는 듯, 나를 자유로이 관통해 지나간다." (P.111)
"논산일기 2011 겨울"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의 페북일기는 디지털 세대에 쓴 작가의 아날로그적 감상이다. 논산집에 적응하며 홀로 겪는 일상과 작가의 고향 이야기, 논산과 서울을 오가며 만난 사람들과 세태에 대한 단상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과 어우러져 탑정호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처럼 감미롭다. 나는 작가의 노래를 그렇게 눈으로 듣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