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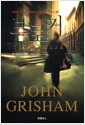
-
브로커
존 그리샴 지음, 최필원 옮김 / 북앳북스 / 2005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내 나름대로 그리샴의 소설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샴은 <펠리칸 브리프>로 우리나라에서 떴고, 난 으로 그를 처음 접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쓴 소설은 <타임 투 킬>이라는 법정 소설. 그게 참혹하게 실패하면서 그는 스릴러에 천착한다. 그래서 나온 게 위의 두 소설이다.
-하지만 소설을 잘 쓰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법, 은 별로였고, <펠리칸 브리프> 역시 <코드네임 콘돌> 같은 데서도 수없이 리바이벌 된 뻔한 스토리였다. 하지만 이 두 소설의 성공은 그로 하여금 변호사를 그만두고 소설에만 전념할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의 법정 스릴러는 갈수록 발전해 갔다. <의뢰인>만 해도 그저 그랬지만, 보험회사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레인 메이커>와 막판 반전이 돋보이는 <사라진 배심원>은 법정 스릴러 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힐 만하다.
-지역사회에서 자선활동을 하기로 유명한 그답게, 그의 작품에는 소수자에 대한 따스한 시선이 짙게 배어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거리의 변호사>. 인질극을 경험한 후 정의의 길에 접어든 변호사가 감동을 이끌어낸다.
-법정 스릴러에 식상했을까. 아니면 소재가 없었을까. 그는 갑자기 <유언장>과 <소환장>을 통해 인간 사회의 추악한 면을 고발하기 시작한다. 법정스릴러를 기대한 그리샴 팬들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특히나 <소환장>은 돈을 차에 싣고 왔다갔다 하는 내용이 거의 절반이다. 난 이쯤에서 ‘돌아와요, 그리샴!’을 외쳐야 했다.
-돌아오기는커녕 그리샴은 계속 외도를 했다. <하얀집>은 변호사가 아예 나오지 않는 소설이고, <크리스마스 건너뛰기> 역시 그리샴의 따스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에게 걸었던 기대를 충족시켜주진 못한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러는 걸까.
-그는 결국 법정스릴러로 돌아오지 않았다. <톱니바퀴>에서는 천재적인 사기와 그를 둘러싼 음모를 다루고, <불법의 제왕>은 변호사가 거대한 사기꾼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소설이다. <최후의 배심원>은, 내 생각에는, 언론이 최후의 배심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우리 언론을 생각하며 한숨짓게 했던 책이었다.
-이번에 읽은 <브로커> 역시 법정 스릴러는 아니다.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채 수감되었던 브로커 하나가 사면이 되는 걸 시작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재미는 있다.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말 역시 그러하지만, 그의 초기작 에 비하면 소설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샴은 스릴러에서 출발, 법정 스릴러를 거쳐 다시금 스릴러로 돌아왔다. 그가 가장 쓰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게 아니었을까.
그리샴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난 처음에 말도 안되는 추리소설을 써서 독자들에게 죄를 지었다. <타임 투 킬>보다는 많이 팔렸다. 그 이후 그리샴이 법정 스릴러를 쓴 것처럼 나도 내 전공을 살려 기생충 추리소설을 썼다. 그리샴과 달리 책의 대부분을 내가 샀다. 그리샴이 스릴러로 돌아간 지금,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기생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우려먹었는데. 정통 추리소설에 도전을 해봐?(이건 물론 농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