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억의 온도가 전하는 삶의 철학
김미영 지음 / 프로방스 / 2023년 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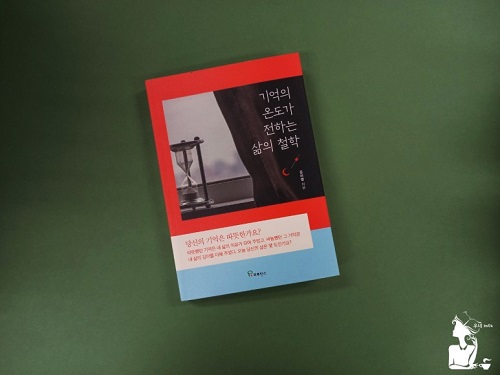
나이를 먹다 보니, 어떤 상황이나 물건을 접했을 때 불현듯 예전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다. 기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피식 웃음이 나는 기억이 있는 반면, 한없이 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다행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기억이 조금씩 바래진다는 것이다. 가을이 되어 아이들의 이불을 바꿔주다가 마주한 엄마의 기억. 저자는 그 기억이 참 따뜻하고 좋았다고 한다. 잔잔한 에세이 속의 저자의 기억의 온도가 글을 통해 풀어진다. 어렸을 때는 받은 기억을 토대로 기억의 온도가 떠오를 테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누군가에게 준 기억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아직은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해졌다. 어제도 그 전날도, 회사를 마치고 종종걸음으로 아이 둘을 하원 시켜 집으로 돌아와서 쉴 틈 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상 앞에 앉았다. 나름 열심히 차린 밥상 앞에서 주는 대로 잘 먹는 작은 아이와 달리, 끼적대는 큰 아이를 보며 또 두서없이 화가 쏟아졌다. 급기야 식판을 치워버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큰 아이의 눈 가득 담긴 눈물. 순간 미안함에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 노력에 대해, 내 시간에 대해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쓴소리를 내뱉고, 감정적 폭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훗날 그날 먹은 반찬이나 식판 등을 떠올렸을 때 아이의 기억의 온도가 몸서리칠 정도로 서늘해질 수 있겠다 싶었다. 다행히 바로 풀어내긴 했지만 말이다.
하루 종일 가족들을 챙기는 엄마. 그러면서 틈틈이 글을 쓰는 작가 엄마. 유별나게 힘든 사춘기를 겪어낸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 죽어도 병원에 가기 싫다고 악을 쓰는 친정엄마 앞에서 속이 무너져 내린 딸 엄마. 아픈 엄마 곁에 있고 싶지만, 돌봐야 할 아이들 때문에 발을 옮기는 엄마. 큰 수술 후 떨어진 체력 앞에 눈물 흘리는 엄마. 사실 책 속에 이야기의 시작이 엄마여서 그런지, 유난히 내 눈에는 유독 여러 엄마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엄마가 되어서일까? 비로소 보이는 엄마의 삶과 그 희생을 통해 살고 있는 내 모습이 겹쳐졌다. 다행이라면 내 기억 속 엄마는 차가운 기억보다 따뜻한 기억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책 속에는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고마운 남편에 대한 감정도 담겨있었다. 유난히 힘들게 사춘기를 겪어 낸 딸 앞에서 잔뜩 움츠린 저자에게 남편은 "고기 먹으러 가자."라는 말로 저자를 많이 다독여줬다고 한다.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의 온도가 떠올랐다는 그녀의 고백이 참 예뻤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자면 남편과의 기억이 따뜻했던 것은 당시 유난히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삶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뒤섞인 것이라고 한다. 좋고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움츠려들고 아픈 기억도 참 많다. 온도는 상대적이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겪었기에 다가온 봄이 더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픈 기억을 마냥 피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훗날 내 기억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길,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좀 더 따뜻한 감정이 떠올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