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하철 헌화가 - 번역가 이종인의 책과 인생에 대한 따뜻한 기록
이종인 지음 / 즐거운상상 / 2008년 1월
평점 :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욕심이 조금씩 작아지고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싶어 씁쓸하다.
이건 다시 말하면, 마음을 몸이 못 따라준다는 얘기지만,
언행이 불일치하는것보다는 욕심을 줄이는게 나으니까,
쿨하게 인정하고 수긍하는 수밖에 없다.
한때, 활자화된것이라면 '모조리 읽어주겠어'라고 의욕을 부리며 달려들던 내가,
나오는 책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자 장르소설을 골라 읽던 때도 있었는데,
이젠 책을 보는 시선이 변해서인지,
내가 좋아하던 장르소설 번역가가 더 이상 새로운 번역물을 내놓지 않으셔서 인지,
난 다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읽게 되리라 기대했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난 더 편협하고 협소해졌다.
요즘 읽는 책들은 동서양의 고전이나 문ㆍ사ㆍ철로 얘기되는 인문, 또는 전공 관련 서적들인데,
종류가 폭넓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속도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더뎌졌고,
책을 한권 잡으면 더 꼼꼼히 끼고 앉았는다.
그러면서도 책을 들이는 습관은 여전해서,
읽지는 않고 책들로 탑을 쌓아올리면서,
테트리스를 해서 색깔이 맞춰지면 한줄씩 없어지는 그런 환상을 꿈꿀 정도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져만 간다, ㅋ~.
그런데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읽지도 않은 책을 쌓아두고서도, 또 책을 들이는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나 보다.

책 속에서 '적독'이란 단어를 발견하고 위안을 느끼는 것까지 나와 똑같다, ㅋ~.
사설이 길었다.
내가 이 책 '지하철 헌화가'를 읽게 된 것은,
바로 전에 읽었던 '노먼 매클린'의 '흐르는 강물처럼'의 번역이 너무 좋아서였다.
난 책을 읽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 필이 꽂히면, 그 사람의 전작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은 전에 '번역은 내운명'을 읽은 다음 장만해 두고는 잊고 있었다.
솔직히 이 정도의 필력을 자랑하는 번역가라면 내가 진작 알아보고,
열을 올리고 설레발을 쳤어야 하는데,
이상하다 싶어 되짚어 보니까,
언젠가 여러명이 같이 번역했었던 '뷰티풀 마인드'라는 책이 좀 아니어서,
그렇게 잊혀져 버린 것이었다.
솔직히 산문집 한권을 가지고, 리뷰를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가볍게 코멘트를 하거나,
여러권을 함께 굴비 듯는 엮어 페이퍼로 쓸 수도 있었지만,
꼭 리뷰로 쓰고 싶었던 이유는,
번역과 일상을 대하는 그의 시선이 따뜻하고, 써내려가는 어조가 정겨워서 이다.
그동안 출판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번역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알라딘서재, 이 동네에도 책을 좋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들 하지만,
이종인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본인은 그저 묵묵히 할일을 할 뿐이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어서, 즐기며 일을 하는 사람은 달라보일 수밖에 없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파장이 다른 걸 어쩌겠나?
이것은 단지 책을 읽거나 보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책에서 읽거나 본 것을 내것으로 만들려는 사람,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다른 점이다.
사람들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습관을 기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책 속에 무슨 길이 있나?
책은 우리를 그저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뿐이다.
어느 책을 읽을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책을 읽으면서어떤 관점을 취사 선택할지, 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그냥 선택을 하고 말 것인지,
실생활에 적용시킬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예를 들자면,
'그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했다면,
그를 아름다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했겠지만,
책과 글이 곧 삶이어서, 흥에 겨워 기꺼이 번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진 못했을 것 같다.
근데, 그는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가 더 흔하더라, 라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함으로써,
책과 글을 삶 속으로 파고들게 한다, ㅋ~.
이집트의 고대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최고의 여신 이시스가 자연을 만들고 이어 최초의 남자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자연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자 여신은 최초의 여자를 탄생시켰다. 여자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남자는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을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ㆍㆍㆍㆍㆍㆍ나는 그런 아름다움과 생의 의욕을 번역에서 느낀다. 활발하게 걸어가는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에로스의 감정이 내 생활 속에서 펑펑 솟구친다. 이렇게 재미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너무 늦게 시작한 게 후회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진정한 직업이라는 확신이 생겼으니, 기왕 늦게 시작한거 더 오래 더 많이 번역하자는 각오를 다진다.(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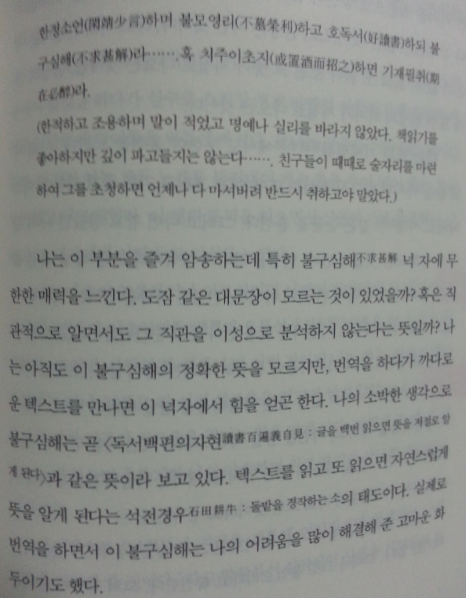
또 한가지, 무조건 많이 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간의 나를 돌아보게 한다.
이 분은 번역가니까 제대로 된 번역이랑 관련하여 많이 고민을 하셨을테고,
그리하여 책을 묵혀뒀다가 또 읽고 또 읽고 했다는 얘기가 이 책의 여러 곳에 등장한다.
그동안의 난 책을 많이 들이는 '적독'과 싫증을 잘 내는 습관 때문에,
아무리 좋고 재미난 책이어도 두번 다시 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같은 책을 백번 읽지 않고 백권의 다른 책을 읽더라도,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뜻을 저절로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분 같은 훌륭한 번역가도,
도잠같은 대문장가의 '불구심해'(깊이 파고 들지는 않았다)를 讀書百遍義自見의 연장선 상으로 보고 항상 화두로 삼았다고 하니,
읽는데 방점을 두지 말고,
읽고 깨달아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하여 실천하는 것까지로 시야를 넓혀야 겠다.
또 한가지,
책을 읽으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겠다.
그는 이걸
'사실 나도 술을 마시면 반드시 취할려고 애쓴다. 그리고 기분 좋게 취한 날에는 때때로 사정 같은 눈물을 흘린다.(156쪽)' 라고 얘기한다.
그는 이걸 몰입, 정화 같은 단어로 설명한다.
난 그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살면서 눈물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사정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는 모르겠다.
하지만, 몰입하였다가 흘리는 눈물 또는 사정을 통하여 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그런 후의 나는 이미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일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그도 악몽에 시달린다.
그는 프로이트 이론을 들먹이며, 자체 치유에 성공한 경험을 얘기한다.
지극히 무미건조하게 얘기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이론을 들먹이고,
'~하더라'하는 '낯설게하기'라는 기법을 써서 그렇지,
그가 악몽으로 얼마나 고민했을지는 악몽으로 고민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다.
지금 악몽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프로이트의 이론 따위는 알지 못하는 고로, 들먹일 수 없고,
다시 그 악몽 속으로 들어가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귀뜸을 나도 해주고 싶다.
혼자 들어가기 무섭다면, 나를 끌고 들어가면 된다.
그 악몽 속으로 들어가 해결을 보면 되는 거다, ㅋ~.
암튼, 이 책을 읽고 느낀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는 것이다.
좁게는 책에 관해서고,
넓게는 삶이나 인생 전반에 관해서,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이고,
또 다시 얘기하자면, 기재필취期在必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