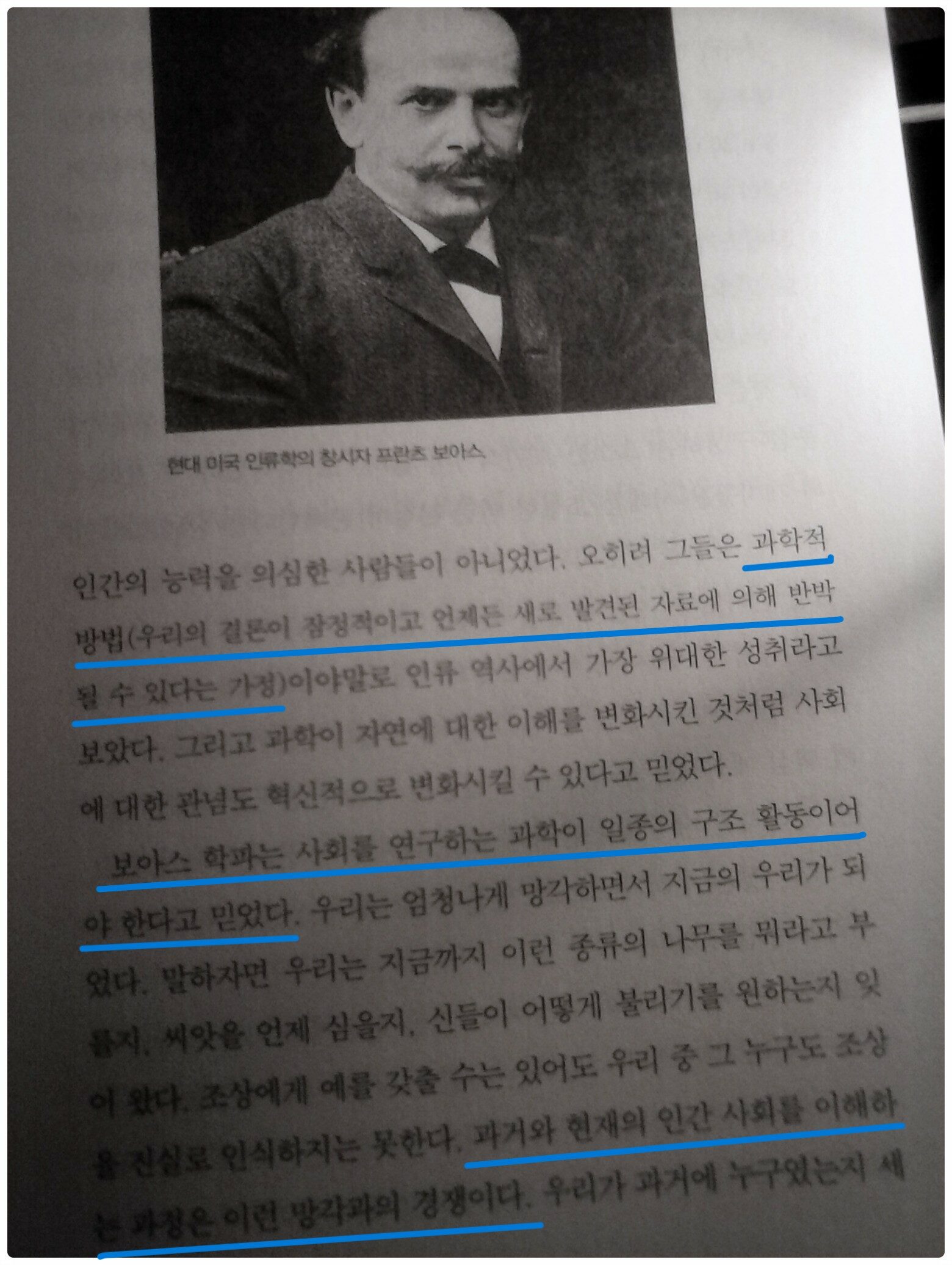-

-
문화의 수수께끼를 풀다 - 문화 상대주의로 세상을 바꾼 인류학의 모험가들
찰스 킹 지음, 문희경 옮김 / 교양인 / 2024년 12월
평점 :



해체하고 새로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상들의 힘, 심장이 빠르게 뛴다. 두근거린다. 도덕적 책무와 정치적 신념의 격돌 대신, 사법논쟁들로 삶이 다 쪼그라든 것인가 싶은 내란 한국 사회의 현실이 긴박한 중에도 쓸쓸하다.
“그 혁명은 철학과 종교, 인문과학의 중심에 있는 골치 아픈 질문들에서 시작됐다.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구분은 무엇인가? 도덕은 보편적인가? 우리와 다른 신념, 다른 관습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상시 모욕감과 버려진 존엄성과 수치심을 모르는 무지성주의의 현실에 병들어가는 시간이다. 안전한 도피처로 펼친 책의 사상가들은 폐만이 아니라 구겨진 뇌에도 호흡을 불어넣어준다. 읽기가 심호흡하는 치유과정 같았다.
“이 책은 우리 시대 가장 큰 도덕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 그렇다고 정치나 윤리, 신학에 관한 책은 아니다. (...) 그보다는 과학과 과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수입학문이 대부분인 한국의 제도적 교육 내용들은 여러 이유와 한계로 오독과 오해로 남기도 한다. 인간 사회에서 인류 구성원으로 살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인 과학, 문화인류학을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다.
“문화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궁극적 원천이다. (...) 다만 사회 세계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든 현실만큼 근본적인 현실은 없다.”
속보와 단신과 잡담과 욕설과 뉴스와 진지한 헛소리들에 사로잡혀 사는 연말연시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데, 해독제와 같은 책을 만나, 인간이 가진 능력과 존엄성과 변화를 위한 지적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살 것 같았다.
“보아스는 자신의 지적 작업을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어떤 정신의 상태로, 나아가 바람직한 삶을 위한 처방전으로 보게 됐다.”
전율이 느껴질 만큼 흥미로운 주제들을 유려한 문체로 전해주니 즐겁게 술술 읽을 수 있다. 일 년쯤 다른 생각, 다른 일은 작파하고 고요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어서, 못하는 현실이 아쉽고 서글프기도 하다.
“보아스 학파의 핵심 개념은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타인의 삶을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그랬는데 나는 몰랐던 것인지, 점점 더 인류의 지성이 집약된 좋은 책들이 많아지는 것인지, 전공 서적들 못지않은 짜임새와 전달력으로 만날 수 있는 책들이 참 많다. 다 읽고 즐길 수 없는 짧은 수명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른 인간을 이해하는 과제를 사랑한 과학자이자 사상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