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점거당한 집 - 제4회 박지리문학상 수상작
최수진 지음 / 사계절 / 2024년 8월
평점 :



박지리문학상 수상작이다. 상 이름만으로 작품에 설렌다. 완전히 길을 잃어도 좋다고 하니... 좋다. 어디서라도 잠시 나를, 혹은 무언가를 잃고 싶은 시간이다. 길을 잃어도 한 장씩 넘겨 읽다보면 안전하게 현실로 데려다줄 것이다. 그러니... 참 좋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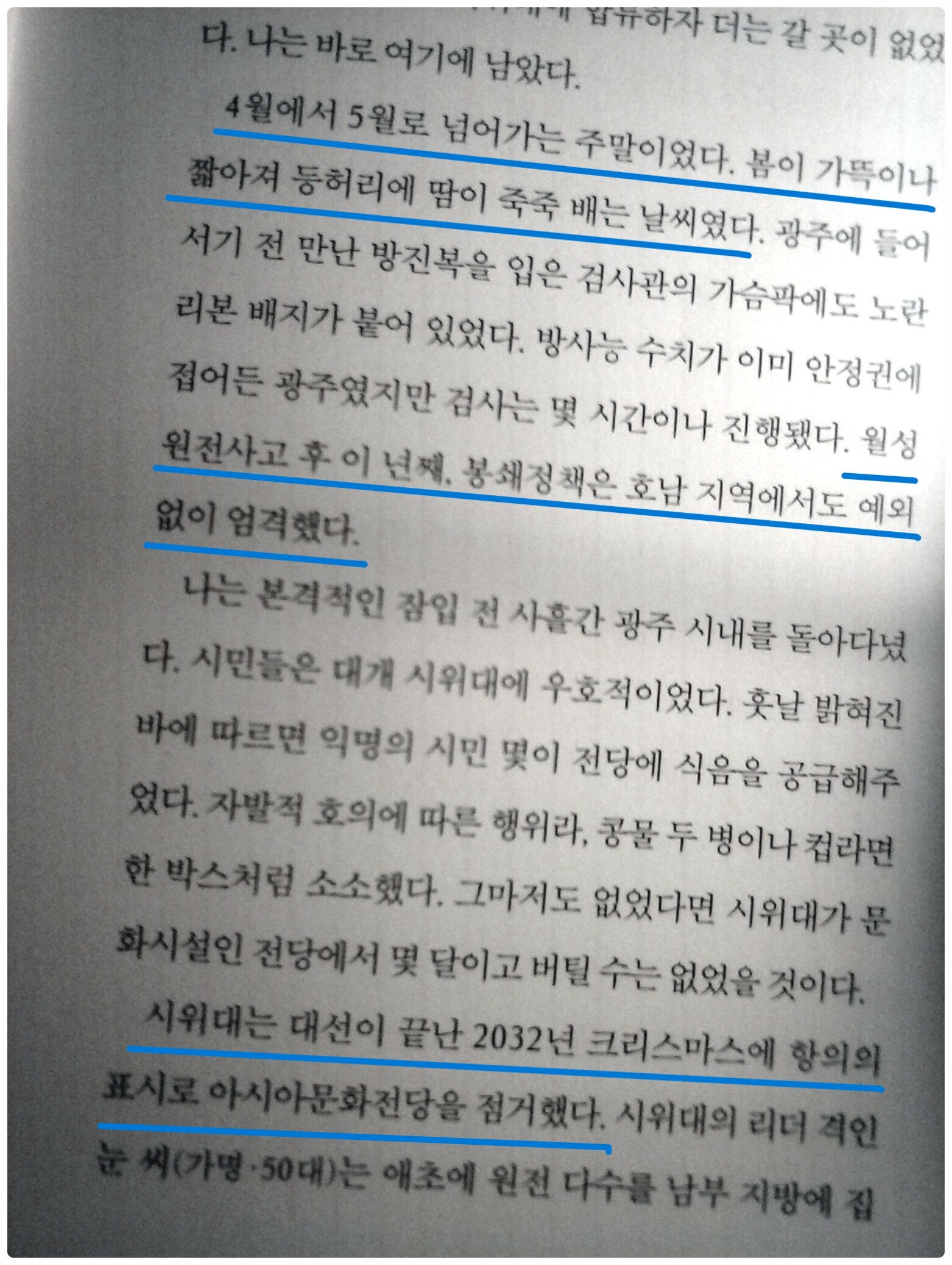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공간을 훔칠 방법은 없을까.”
문자들 속에서 길을 완전히 잃었다. 난독증을 두려워하며 두 번 읽는 도중에 기분이 좀 편해졌다. 어디에서 언제 내가 장소성을 잃었는지, 혹은 문학이 아닌 현실의 장소성이 흐려진 건지 생각하며, 작품 속 시공간을 짚어가며 문장 속을 걸어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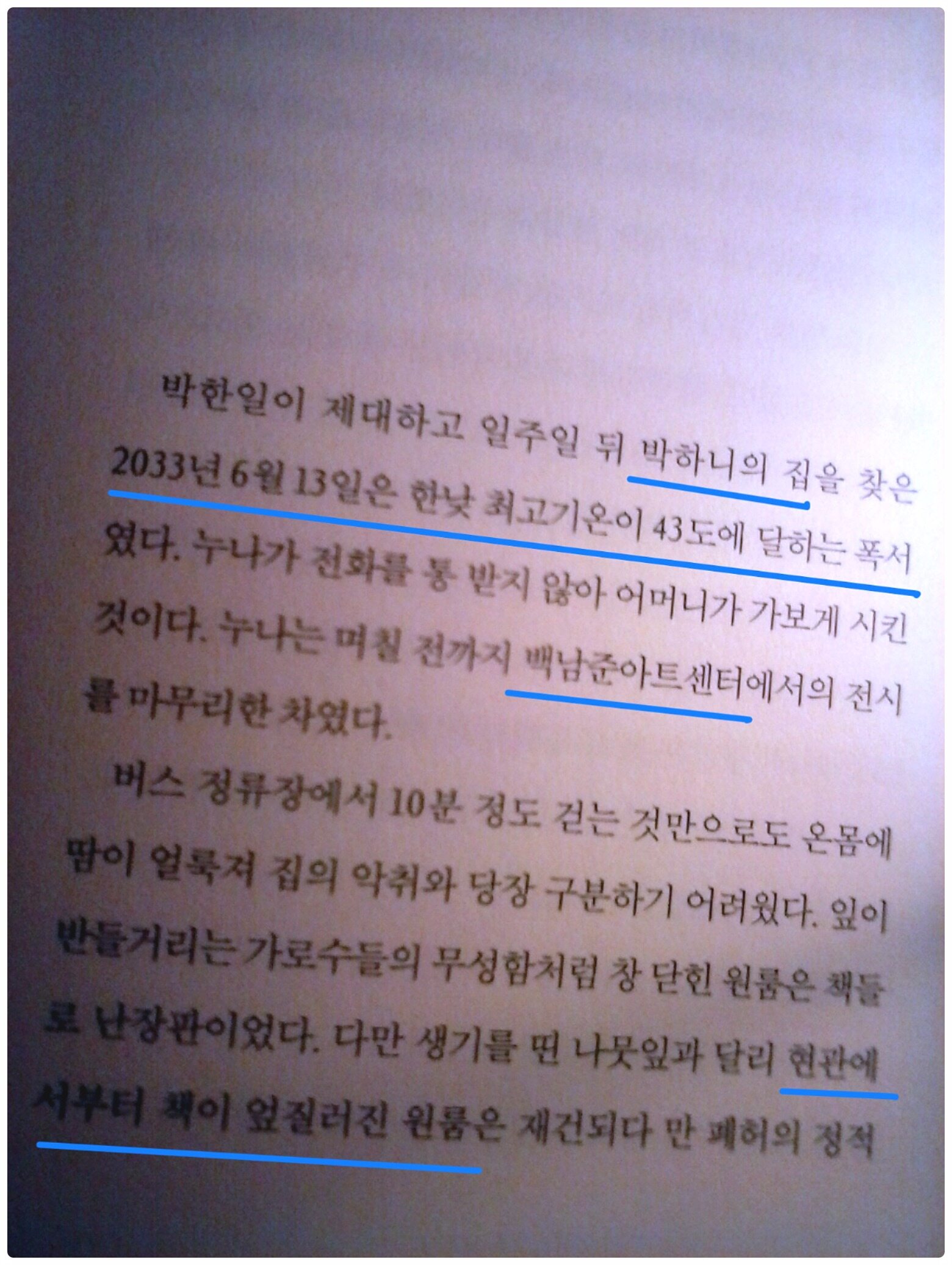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미래(다른 장소의 이미 현재)가 있고 - 원전사고와 기후재난, 그 시공간은 과거의 폭력들과 이어져있다. 등허리가 서늘하다 뜨겁다하며 작품 속 기후와 변하지 않은 인류의 생활방식에 반응했다. 되풀이되는 폭력이 소설 속에서도 지긋지긋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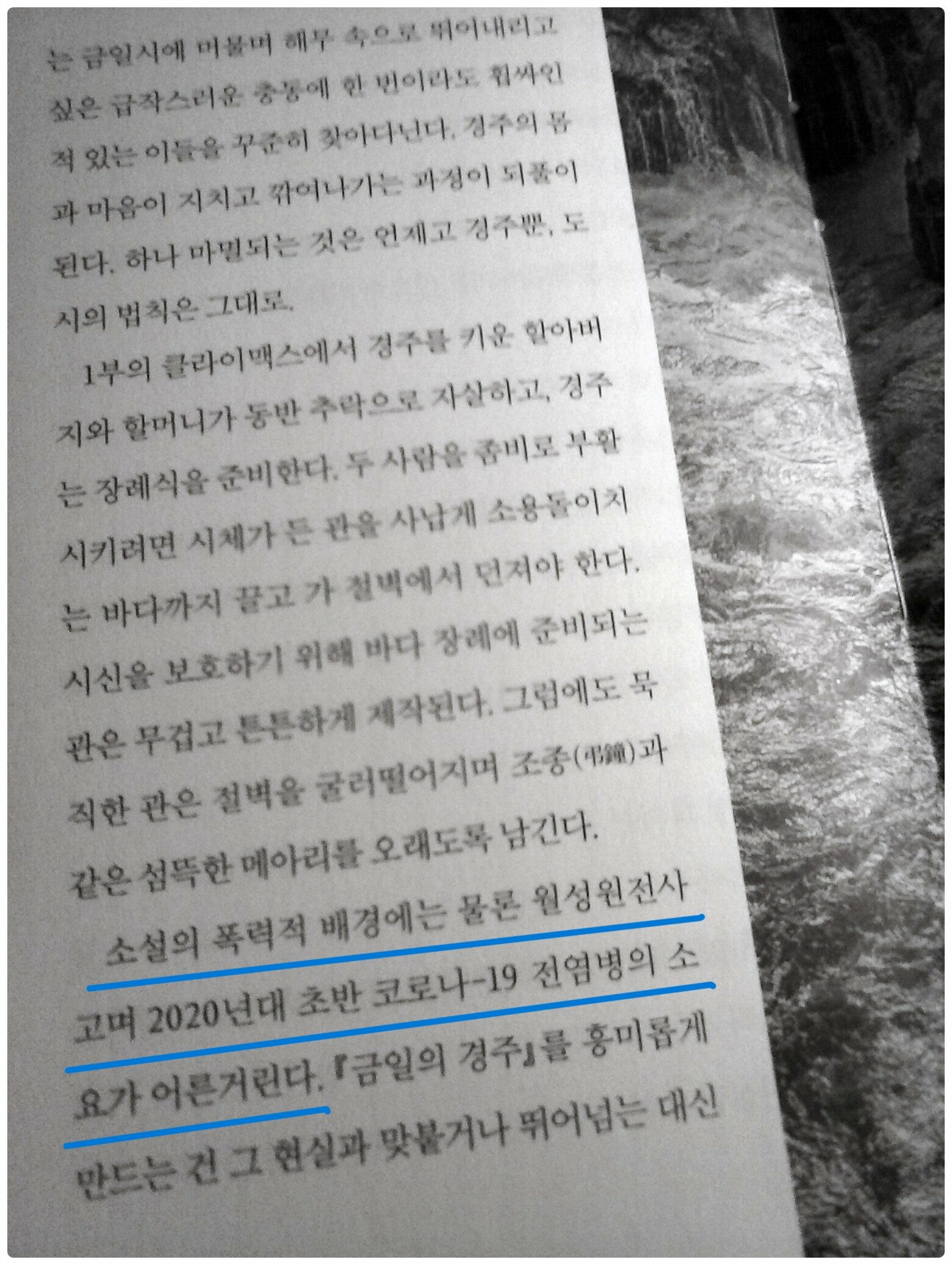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감정적 반응은 내 시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탓인지도 모른다. 이제 확신도 희망도 기대도 없는, 실은 오래 전에 포기하고 실망한 것들, 은밀하게 좌절하고 무심해진 것들이 내 속에서 부대끼고 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이 작가의 글은 현대설치미술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낯선 체험을 하게 한다.
“자기의 감각에 따라 전시된 예술과 현실을 만나게 할 어떤 접점을.”
작은 공간들이, ‘공공성’을 간신히 소유한 곳들이 인류의 ‘방주’, 아니 누군가의 방주가 될 수 있을까. 생존을 위해 인간은 어딘가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지만, 구명을 위해 자신을 가둔 물질적/비물질적 공간을 나와야할 때도 있다. 아는 과거가 아닌 모르는 미래를 보는 방법을 배워야할 때도 있다.
“선물을 내던진 그 한순간의 몸짓에서 한일이 작품 안에 머물고, 스스로를 연출하다, 바깥으로 나가는 법을 익힌 인간임을 목격했다고, 나는 쓴다.”
어릴 적 나는 건축공간이라 거의 영속하는 존재라고 느끼고 믿었다. 어설픈 어른이 된 나는(그저 나이 먹은 나는) 문득 내가 사는 공간이 내 집인지 의심을 품는다. 여전히 유령처럼 오랜 질문들과 허공을 떠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할까……. 도착과 뿌리내리기에 실패할 것만 같은 현생을 느낀다.
실은 시공간에 대한 고민은 허망하기도 하다. 할 수 있는 게 뭐란 말인가. 현재라고 불리는 순간을 살아갈 뿐, 살아남을 뿐. 점점 더 낡아가는 물질적 공간에서 점점 더 좁아지는 정신적 공간을 애써 지키며 살아갈 뿐. 지금, 여기, 우리. 오늘을 살라는 뜻…….
이 책을 만나기 전에도 나는 책을 공간으로 삼아 의지하고 살았다. 대피소이자 피난처로 책보다 안전한 공간은 없었다. 펼치기만 하면 이동할 수 있는 기적같은 예술, 물성을 가진 종이책.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세계에서, 나는 그 실체를 꽉 잡고 잠시 위안을 얻는다.
소설은 장소다.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른 기능을 하는. 천변만화하는 고유한 장소이다. 그러니 나의 모든 오독에도 너그러울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