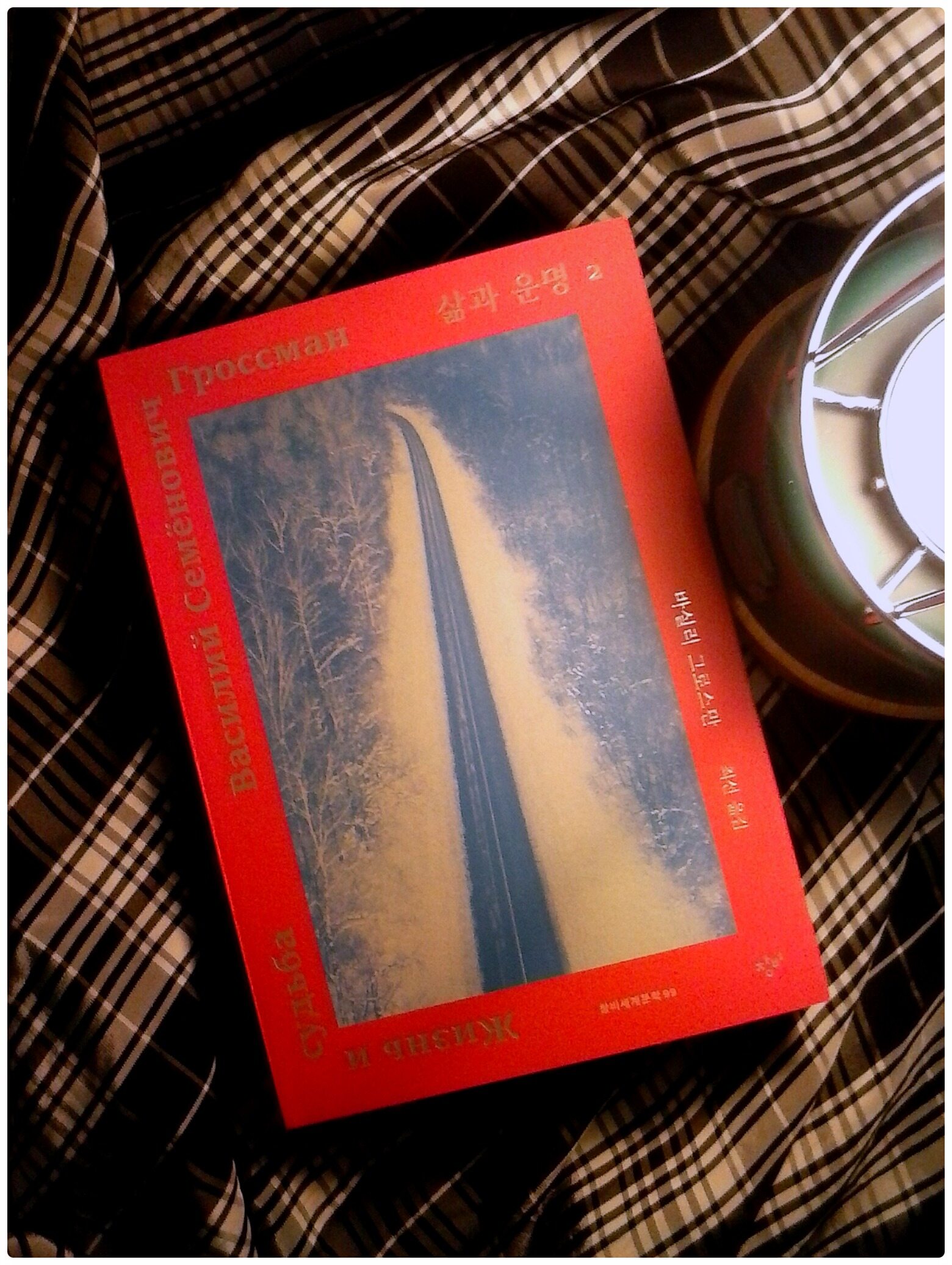-

-
삶과 운명 2 ㅣ 창비세계문학 99
바실리 그로스만 지음, 최선 옮김 / 창비 / 2024년 6월
평점 :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경악하고 당신네들을 보면서는 사랑과 희망을 품는 것 같겠지. 하지만 내 말 믿는 게 좋을 거요. 우리의 모습에 경악하는 이들은 당신네들의 모습에도 경악하기 마련이오.”
인간의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선택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따랐다고 해도 일조한 죄악은 면제받지 못한다. 물론 열정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대개 당시의 선택이 ‘선’이라고 믿는다. 굳게 믿을수록 결과적 재난은 크다. 그 ‘선’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전쟁을 택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렇다.
“사람들은 이 작은 선, 선하지 않은 선 때문에, 이 작은 선이 이 작은 선을 악이라 여기는 모든 것과 벌이는 전쟁의 이름으로 많은 피가 흐르는 광경을 목격했다.”
인간의 뇌가 보이는 확증편향과 자기정당화는 현대사회의 보편상식이 되어가는 듯하지만, 안다고 예방과 경계가 늘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후에 인정하는 것에도 저항감을 보인다. 그러니 비슷한 역사적 과오가 반복된다.
“자신의 선을 위해 싸우는 이들은 이 선에 보편의 외관을 부여하려 애쓴다. (...) 보편성을 잃은 선, 분파와 계급과 민족과 국가의 선은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것과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보편성을 부여하려 애쓰게 된다.”
그러나 인류는 어떻게든, 아무리 소수든 이에 맞서 싸워왔다. 지는 싸움인줄 알면서도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았고 많다. 대개 존엄과 자유의 가치에 동의하지만, 자신을 대리한 결정과 통제를 해줄 타인을 바란다는 점이 모순적이다. 그런 면에서 열광과 믿음과 기대는 너무 뜨겁고 너무 비이성적이다.
“자신이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 자신은 여전히 괴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점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다. 이제 그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파시즘의 시대에 인간으로 남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목숨을 부지하는 삶보다 더 쉬운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끔 인간의 역사란 건 큰 파도에 쓸려가는 해조류처럼 무력하게도 느껴진다. 생각대로 뜻대로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개는 의지보다 운명이 더 힘이 센 것 같아서. 그런 덩어리진 움직임은 전체주의의 양분이 된다. 인간에겐 그래도 ‘원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여기 소각장의 불빛 속에서, 수용소 광장에서 사람들은 삶이란 행복 이상의 것임을, 삶은 그야말로 고통임을 느꼈다. 자유란 행복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자유는 지난하며, 가끔은 고통스럽다. 자유는 삶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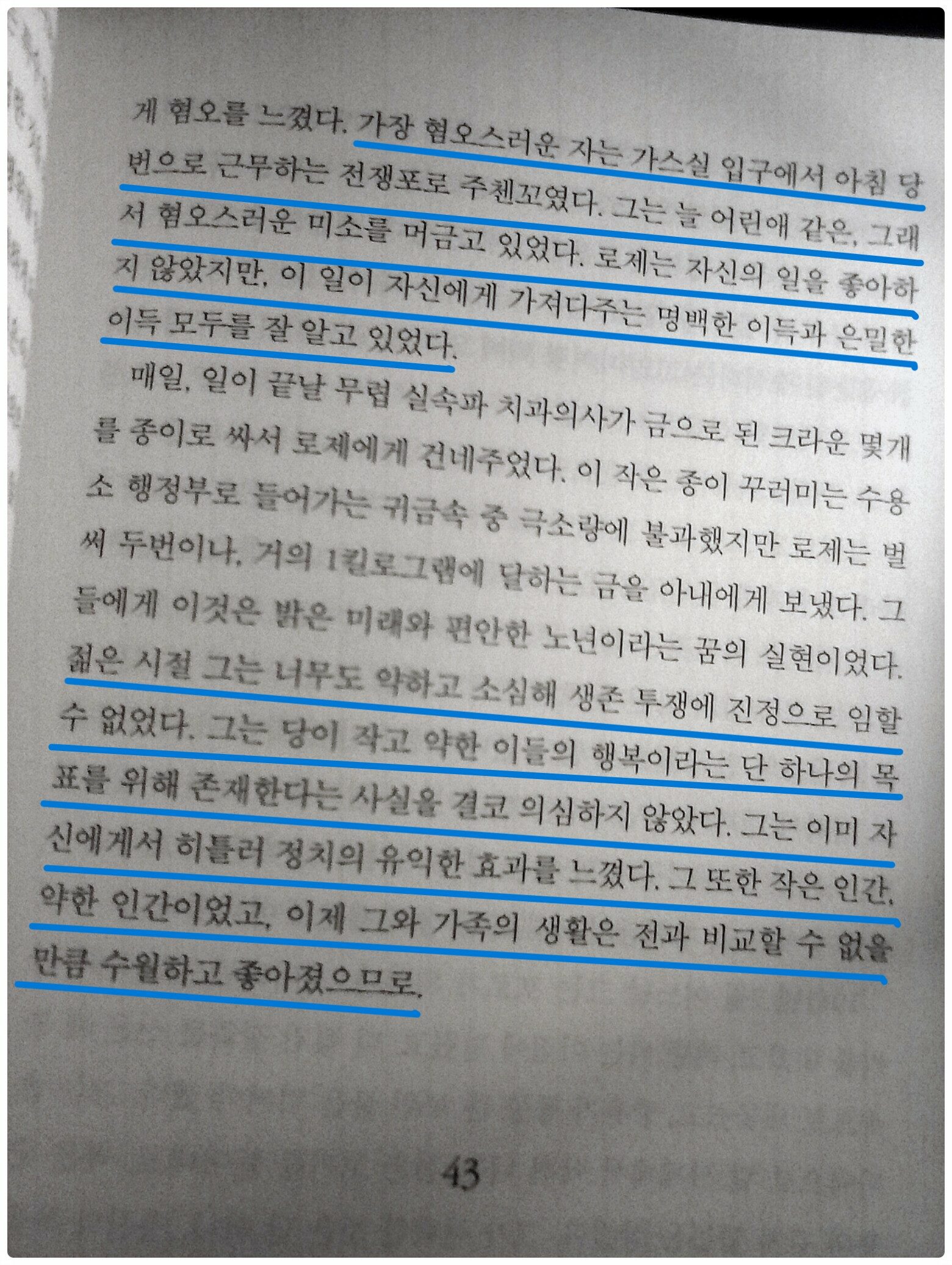
점점 더 가스실에 가까워지는, 배반과 버림받음과 이별과 죽음에 가까워지는 아슬아슬한 시절을 읽는 일은 처연한 슬픔을 마주하는 것처럼 축축했다. 이렇게 많은 죽음이 그토록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선동적 무지함에 촉발되었다는 점이 모욕적이다. 그로부터 무엇을 배운 2024년 현실인지를 생각해보니 더욱 모욕적이다. 마지막 3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