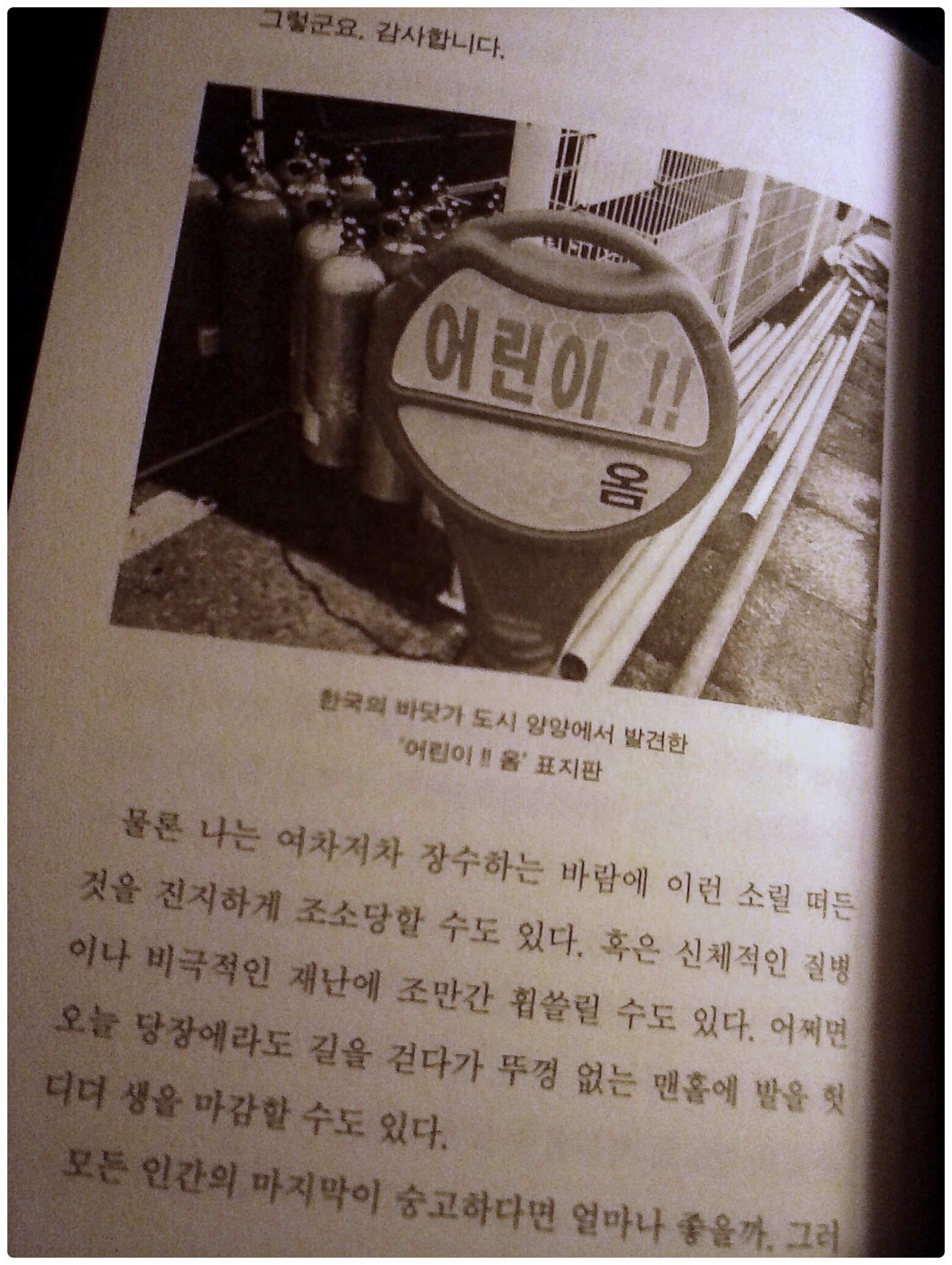-

-
어린 심장 훈련
이서아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24년 5월
평점 :



포장도 위무도 없이 지구는 늘 지옥이었다, 라고 시작하는 무시무시하고 놀랍고 용감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여자아이들의 고군분투기, 라고 한다. 나도 눈물 글썽이지 말고 씩씩하게 신나게 읽어야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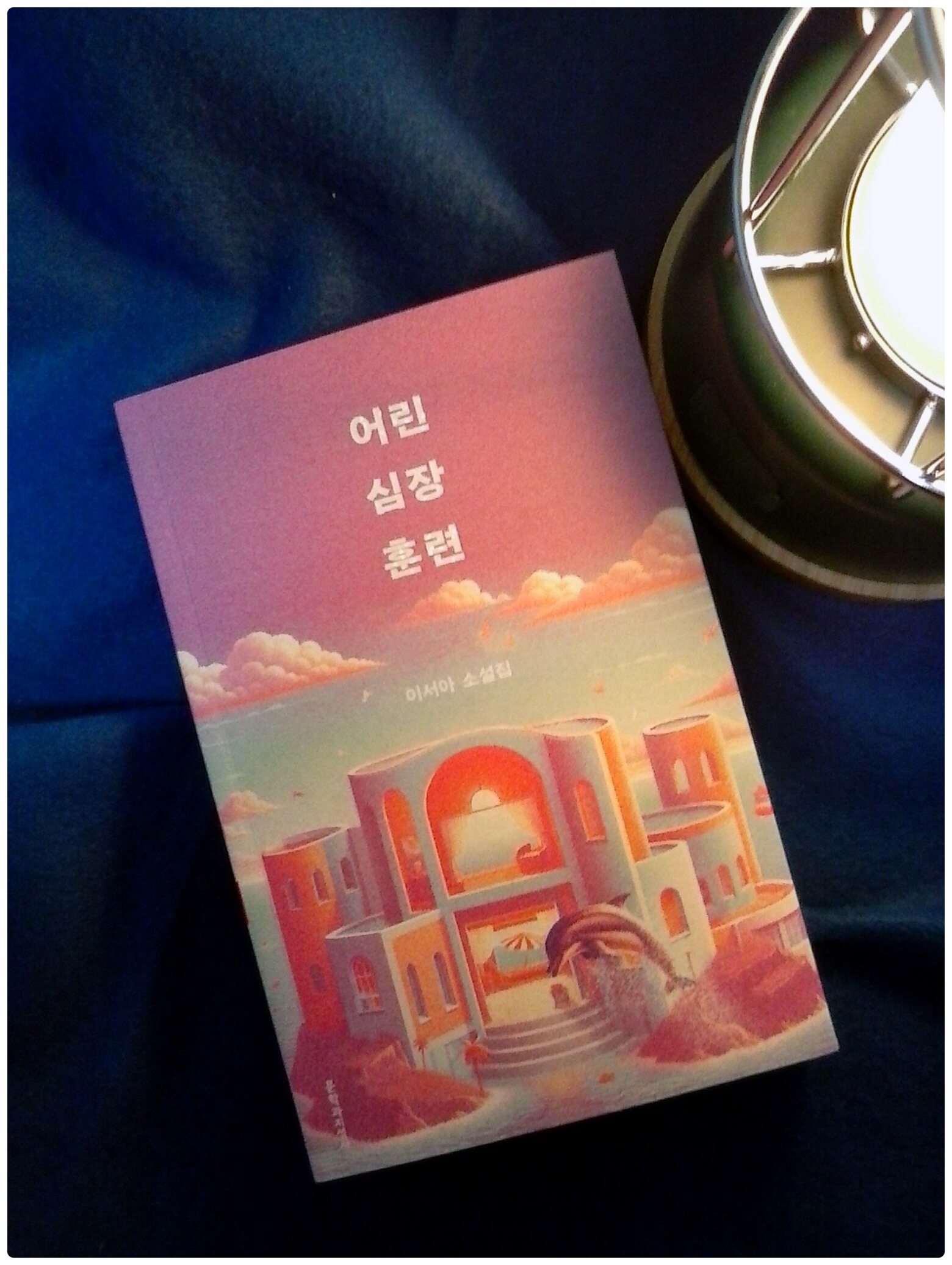
1904년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는 친구에게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독자 각자가 깨고 싶은 ‘꽁꽁 얼어붙은 바다’가 특정 대상이 아니라면, 나는 도끼를 자주 만난다.
내게 가장 굳건한 것이 ‘편견’인가 싶게, 편견을 깨는 작품을 가장 자주 만난다. 말랑한 작품들이 아니라는 소개는 들었지만, 여자아이들의 고군분투 성장기란 이러저러하겠거니 하는 짐작이 있었다. 첫 작품의 첫 장부터 기이한 어긋남이 느껴지고 읽을수록 괴리가 커지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 집 십대들에서 보는 이미지도, 환경도, 스토리도 아니다. 현실은 물론 문학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분위기와 전개는 드물다. 풍자가 깃든 부조리함 정도는 걷어차는, 어른들과 사회가 정한 끔찍한 삶의 조건에서 울며, 때리며, 탈출하며, 불을 지르며, 죽이며, 상상하는 탈주다.
잊히거나 미화된 내 기억에서는 아마 불러낼 수 없는, 어두운 성장의 한 시기, 나도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상상 속에서 누군가들을 욕하고 때리고 죽이며 탈주를 꿈 꿨을지 모를 일이다.
악몽과 가위눌림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 무더운 여름밤이었을 수도, 북풍한설의 매서운 소리를 들으며 허락되지 않은 자유와 삶을 애통해하는 겨울밤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불편해하는 원숭이와 새, 세상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을 총기, 무감한 양육자나 보호자들, 기억이 없는 시간부터 여기저기 상처 입은 아이들, 다친 채로 아픔을 불길한 불길처럼 뿜어내는 살아 있는 아이들이 단편들에서 반복될 때마다 내 심장은 움찔 놀라다 제 속도를 찾아갔다.
“네가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하면, 저 불쌍한 새들이 총에 맞아 죽을 거야! 새들의 심장이 총알에 맞아 터질 거야! 어린 새가 비참하게 죽을 거야!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 불쌍한 것!”
단편 하나가 별개라기보다는, 작품 자체가 다음 이야기로 성장하는 생물체 같다는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불온한 불확실함과 예견 같은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의 성장을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가 된 무력한 기분으로 계속 읽었다.
낯설고 강렬한 것들이 적대적인 공격처럼 느껴지는 이야기 속에도, 믿을 구석이 없는 인간 어른대신 아이들이 탈주할 방향이자, 구원을 바라는 대상으로 인간 이외의 존재와 문명 이외의 장소(야생)가 등장한다. 의심하지 않는 순전한 애정도 불쑥 등장한다. 아이도 자연도 주류와 정상과 인간이 가해하는 존재들이라서 혈관이 찔린 듯 슬픈 통증이 느껴졌다.
“산은 기침처럼 나를 토해내며 이렇게 말한다. 내 죽음에 슬퍼하고, 내 죽음을 기록하며, 내 죽음에 분노하라.”
아이들은 어른이 만들고 망친 세상에 불려나왔다. 던져지기도 했다. 방치되기도 했고, 그보다 더 나쁘게는 곧 죽임 당하기도 했다. 다치고 망가진 채로 몸이 성장하기도 하고, 낫지 않는 상처로 성체가 되지 못한 채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로 살아있기도 하다.
“높이 올랐다가 둥글게 내려오는 그네에서 떨어지는 일, 그건 가슴이 아찔할 만큼 무서운 사고였고, 기이한 희열을 심장에 남기는 금기의 놀이였다.”
한국 사회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새로운 생명을 지키겠단 맹세와 함께 새롭게 불러내지도 못하는 불임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기적이고 불성실하고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어른들이 만든 계획들로, “숨결조차 조작된” 이곳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은 텅 비어” 가는 걸까.
어린 심장들만 그럴까. 커진 심장, 늘어진, 심장, 늙은 심장, 얇아진 심장, 너덜거리는 심장 모두 그런 걸까.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내 심장은 때론 울고 싶어질 정도로 놀라고 슬퍼서 뛰었다. 공존을 위한 문학적 훈련이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