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페인티드 드럼
루이스 어드리크 지음, 정연희 옮김 / 문학동네 / 2019년 3월
평점 :



밤잠을 편히 못자서 기절할 것 같은 날들(기절도 안 함)에, 루이스 어드리크 세계로 달아날 책들이 있어 다행이다. 네 번째 작품을 읽으니 이제야 제대로 도착한 느낌이다. 도착지가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문제지만.
두렵고 걱정스러운 현실이야기처럼도, 모르는 신화 속 이야기처럼도 읽힌다. 여름이라서, 밤이라서, 아름다운 문장들이라서, 온통 상실과 그리움이 가득이라서. 현실은 누추하고 문학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반짝인다.
‘북drum'이다. 북소리가 심장을 둥둥 울려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다. 죽은 이의 집에서 발견된, 스스로 울리는, 삼나무와 무스 가죽의, 상징이 가득 그려진, 채색된, 전통에 의하면 매매될 수 없는, 전수할 인간을 선택하는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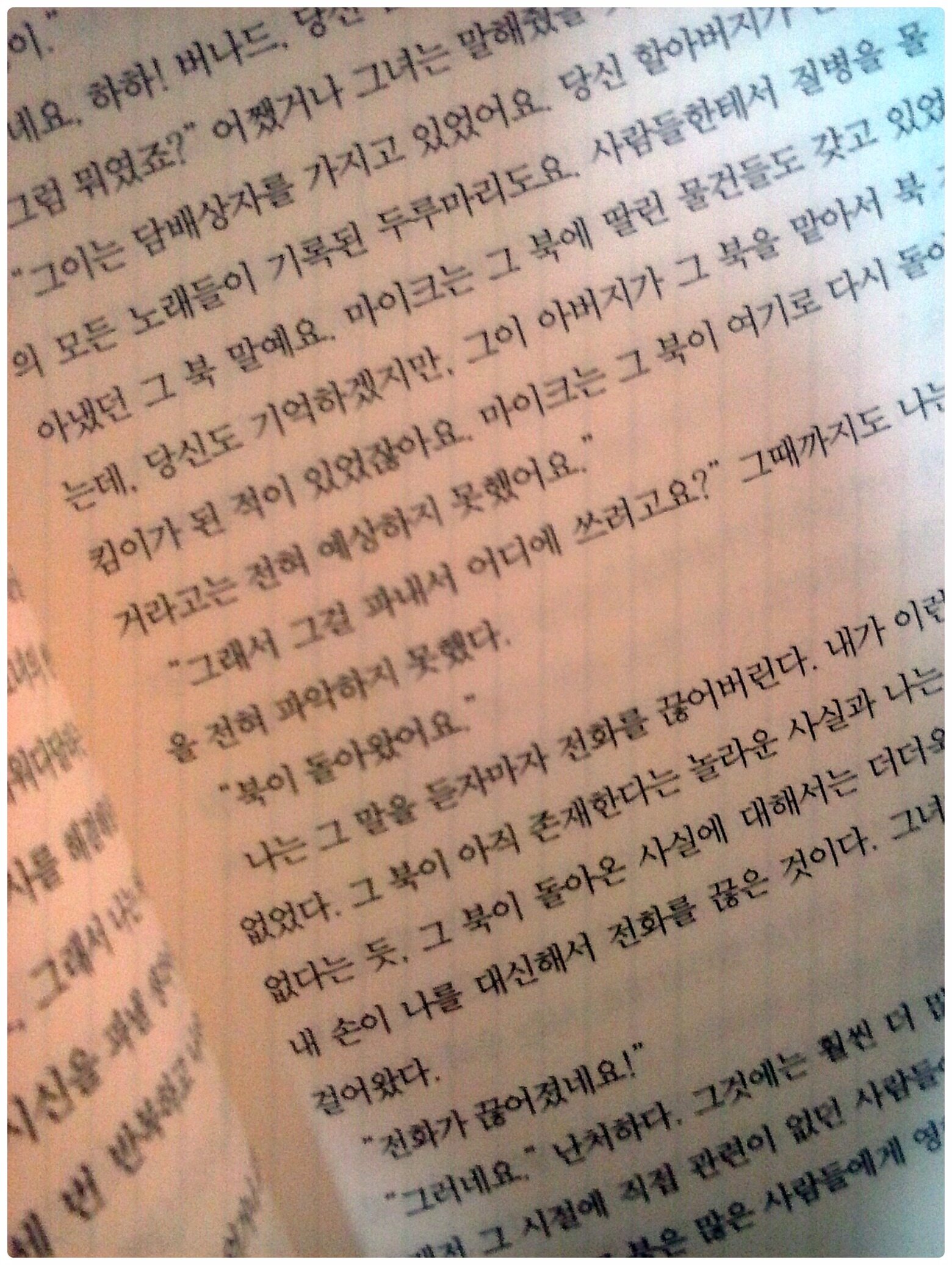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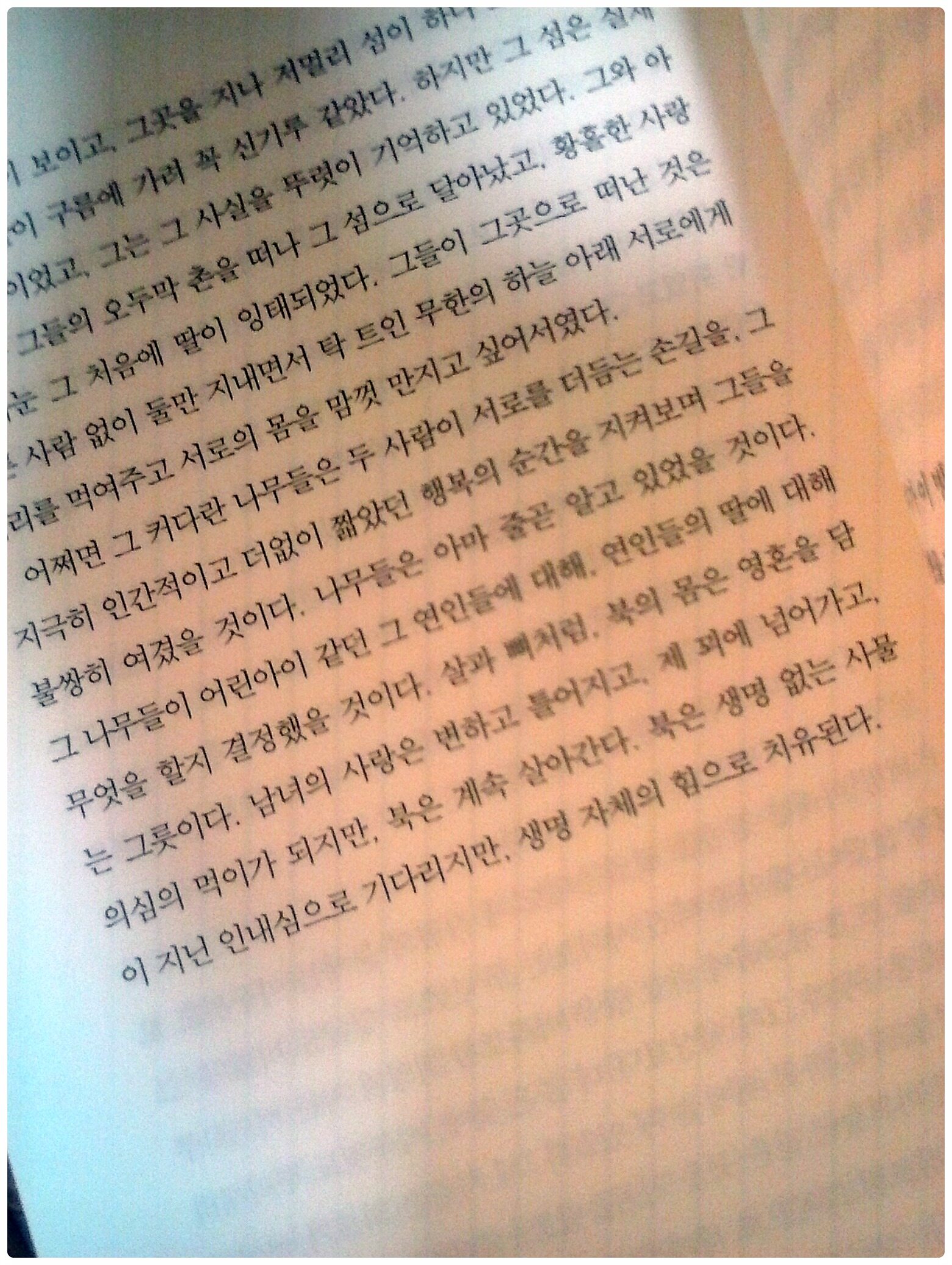
“살과 뼈처럼, 북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 북은 계속 살아간다. 북은 생명 없는 사물이 지닌 인내심으로 기다리지만, 생명 자체의 힘으로 치유된다.”
‘제 자리’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 살고 싶다’란 기분이 드는 곳일까, 그저 ‘살 수는 있겠다’란 조건일까. 못 파는 것이 없는 자본주의 문명과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문명은 어떻게 세세하게 달랐을까.
인간은 북을 왜 만들었을까. 북을 울려 인간에게 닿는 소리는 어떤 힘을 가질까. 인간이 만든 북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차분하게 읽으며 그림을 맞춰가는 경험이 처음이라 벅차고 신비로웠다. 인간의 북의 화자가 되어 결국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인간/비인간의 무례한 구조가 없어서 그리운 세계다.
북을 ‘울리는’ 것은 무엇인지, 북에 힘과 능력을 부여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가보니 슬픈 풍경들이 가득했다. 층층이 다채롭게 슬펐다.
“슬픔은 혼란이다. 죽음과 질병은 세상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북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다. 그 질서 속에서 살아나가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은 절박하게 희망을 갈구하는 몸짓이다.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슬픔을 걷어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찬미하게 하소서.”
작가와 작품이 전하는 바는 모녀 관계와 상호 구원의 내용이 있는 것도 같은데, ‘구원’ 자체가 어려운 만큼 내게는 그 가능성이 옅어서 읽어도 읽히지 않았다. 너무 낯선 판타지, 어쩌면 나는 이 책을 읽지 못했을 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망각하려는 욕구가 있다. 나는 우리의 열병 같은 망각이 그쳤는지 아직 모르겠다. 우리는 늘 망각의 언저리를 걷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