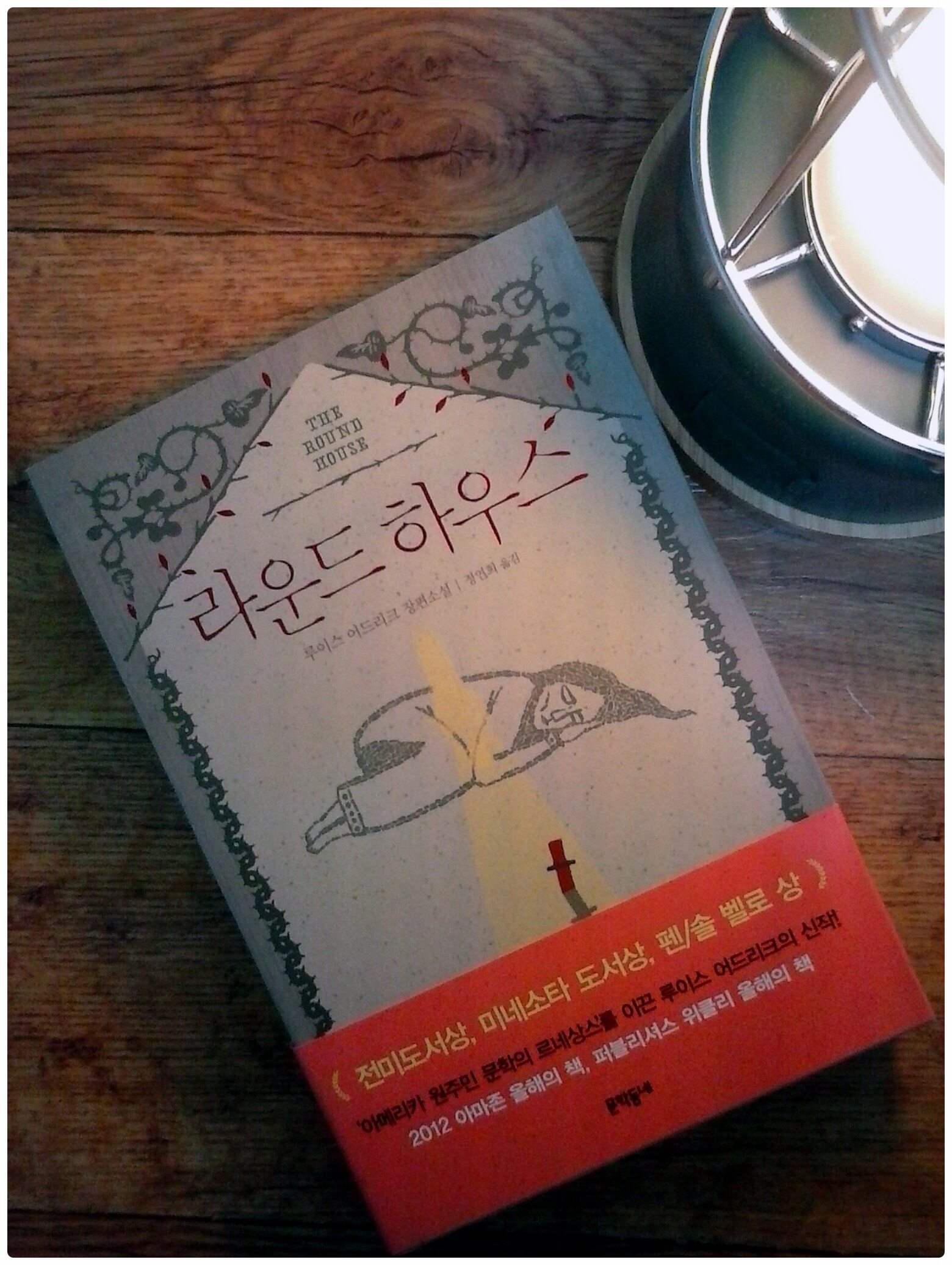-

-
라운드 하우스
루이스 어드리크 지음, 정연희 옮김 / 문학동네 / 2015년 1월
평점 :

품절

손 가는 대로 펼쳐 읽는데, 작품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우연이 신기하고 기쁘다. 상당히 묵직한 분위기의 전작, <비둘기 재앙>의 복잡한 구도를 경험하고 나니, 이 책은 스핀오프처럼 단출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사건의 심각성이나 상처의 깊이가 얕지는 않다. 선주민으로 태어나 이주민들과 어울려 사는 일이 이렇게나 참혹하고 억울하고 힘든 역사여야 했을까. 인간이란 종과 문명이란 허상에 대한 환상을 와장창 깨고 싶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라운드 하우스다. 선주민에게 신성한 장소라는 점에서 이주민들의 가학과 폭력은 일말의 수치도 주저도 없는 구역질나는 짓이라는 것이 더욱 선명해진다. 인간혐오에 빠질 듯해 잠시 숨을 고른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여러 입증 절차와 빠른 해결이 어려운 여러 부차적 조건들에 한숨이 난다. 이따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 따위가 한 인간에게 가해진 저열한 범죄를 밝히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폭로 대신 침묵을 택했다. 보호구역 내에서 저지른 범죄일 경우 원주민이 아니라면 처벌할 형사 관할권이 없다.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하면, 연방법, 주법, 부족법 중 적용한 법조차 알 수 없다.
간판은 법치국가인데 그런 메뉴가 없는 지경, 정의를 바라는 이는 이제 인간사회를 포기하고 하늘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 피해자는 어머니고 아들인 조는 이제 열 세 살이다. 판사인 남편과 아버지도 무력하다. 요즘 유행하는 사적복수가 답일까.
“정의는 있을 거야. 정의가 도와줄 거야. 지금 당신은 정의는 아무 도움 안 된다고,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 방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사랑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의가 도와줄 거야.”
장애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표현인지도 모른 채, 무엇을 살까 하는 고민에 결정 장애니 선택 장애니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없으면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모를, 정의와 자유에 대한 고민을 더 깊고 넓게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던 사회지만 어느 사회나 닮아 있는 약자들이 당하는 이야기에 화가 너무 많이 난다. 손가락이 아니라 부글거리는 뇌가 타이핑을 하는 기분이다. 이런 꼴 안 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되돌릴 수도 없다. 아무리 간절하다해도. 그래서 죄를 물어 처벌을 하고,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고, 상처를 계속 치료해야 한다. 그렇게 앞으로 걸어 나가는 방법이 유일하다.
책을 덮으며 할 수 있는 건, 1988년과 지금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고작이다.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는 한, 모멸감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누군가의 차분한 의견처럼, 동물원이 있어 당장은 보호받는 동물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게 최선이라고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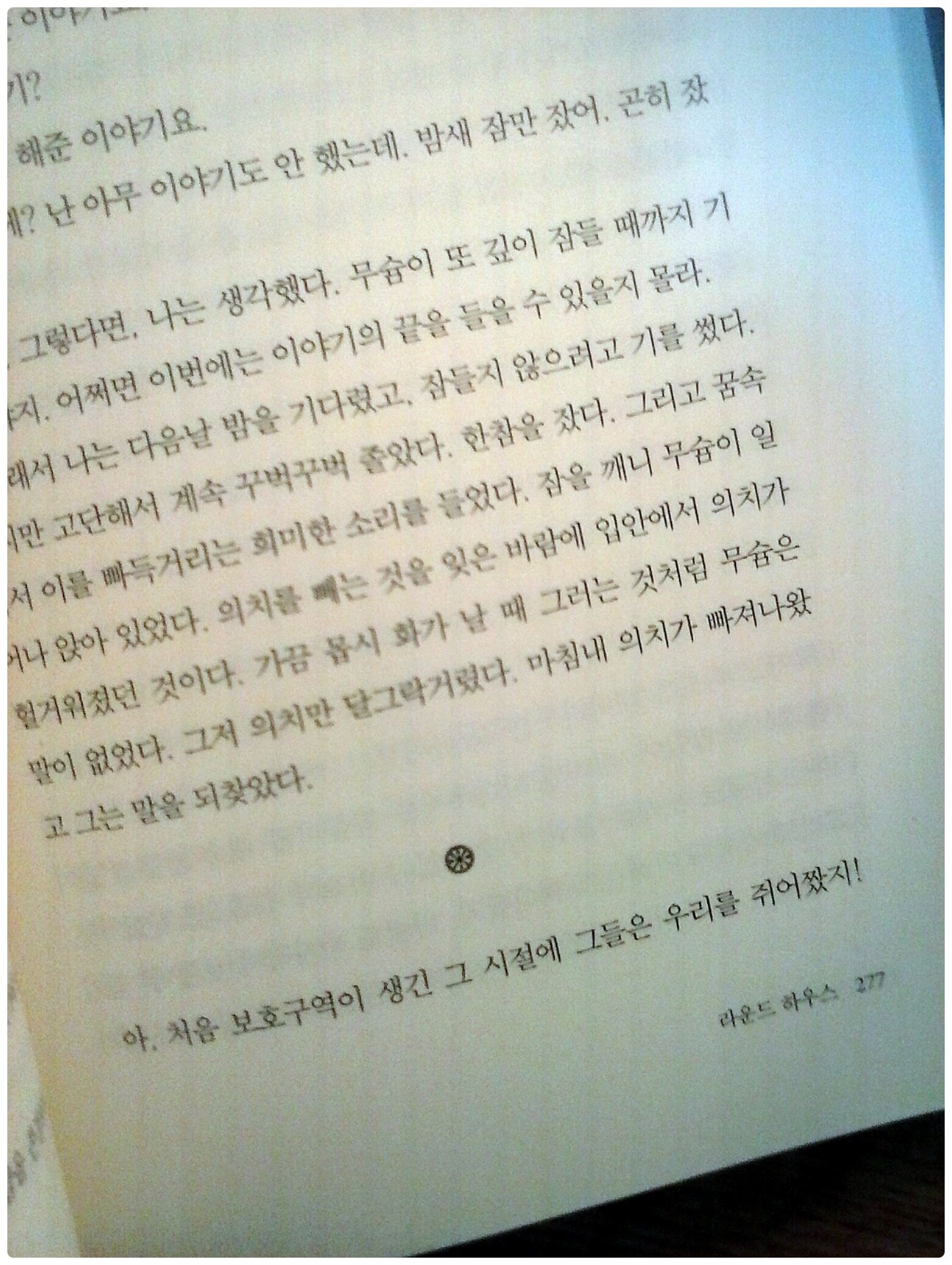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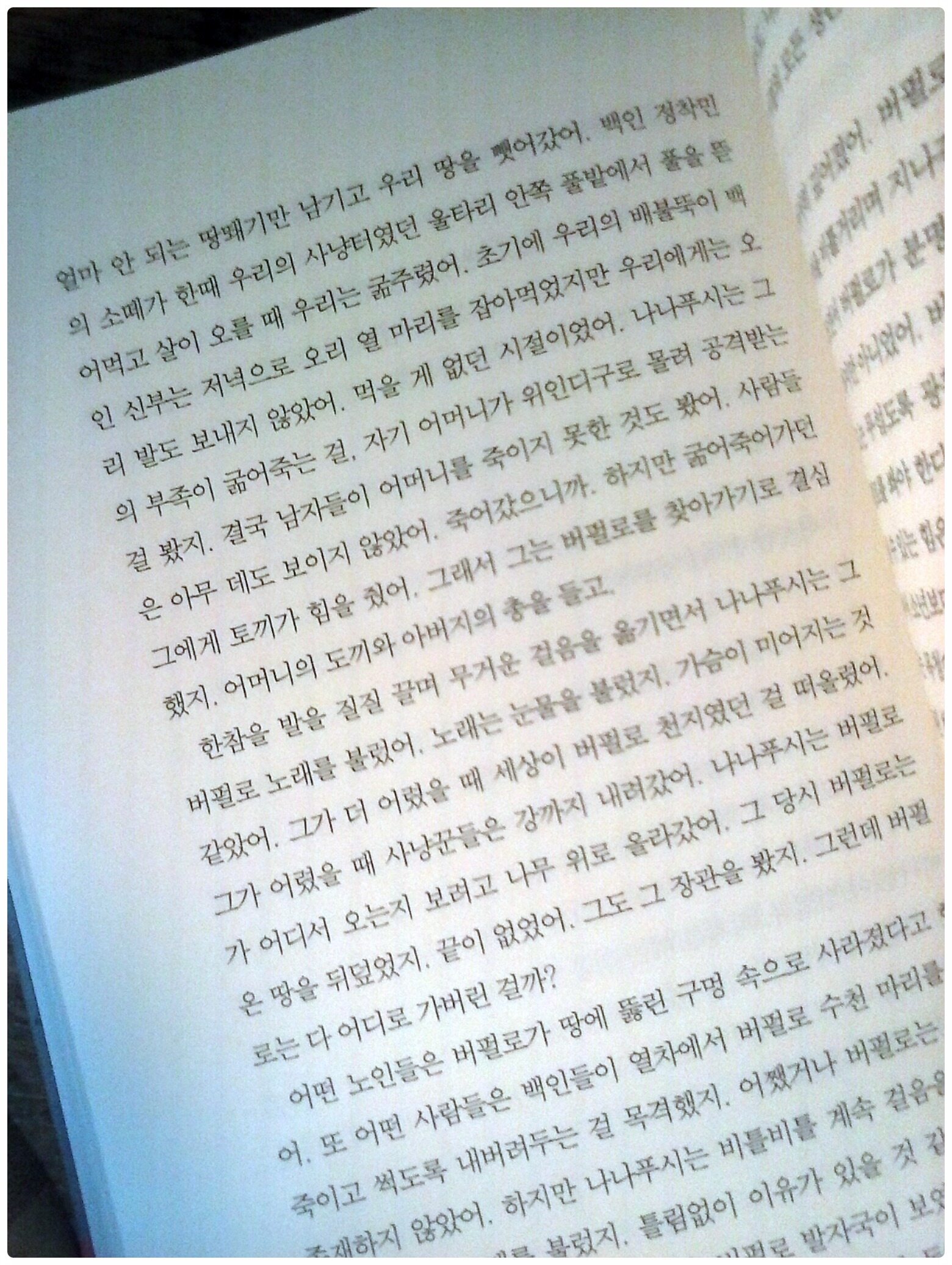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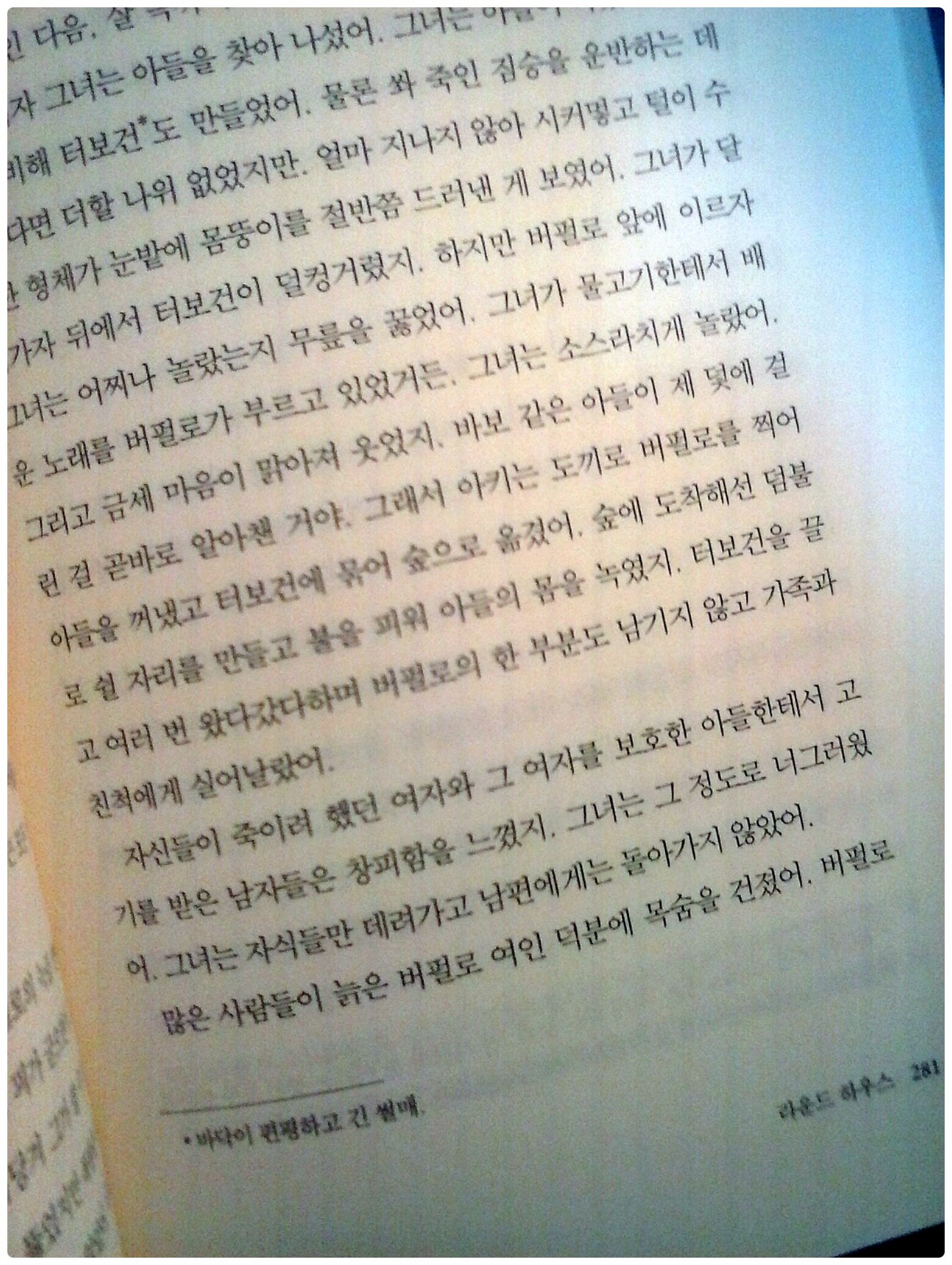
읽고 나서 다시 본 표지 일러스트에 울음이 터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