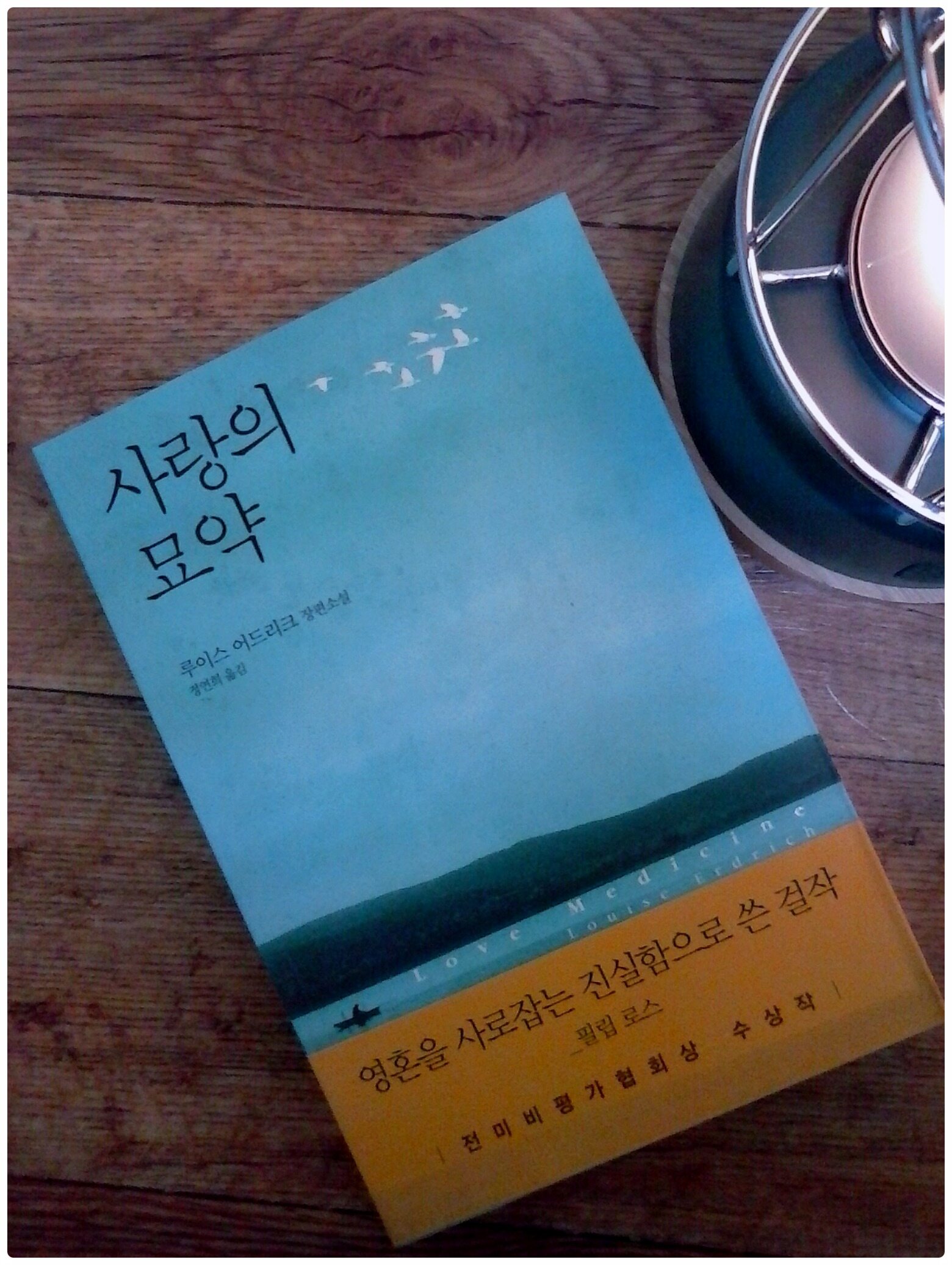-

-
사랑의 묘약
루이스 어드리크 지음, 정연희 옮김 / 문학동네 / 2013년 8월
평점 :



그나마 악의가 덜한 시선으로 인디언(미대륙 선주민)을 만난 때가 <늑대와 춤을> 영화를 본 고등학생 시절이었다. 엔딩이 너무 슬프고 처연했다. 낯설지 않은 얼굴과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인디언식 이름 짓기가 유행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한층 더 복잡하게 얽힌 그들의 가족사를 만났다. 왠지 반가웠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풍경일수록 그들의 고단한 현실이 잊혀졌다. 가능한 선입견, 편견, 판단을 유보해보려 하지만 혼자 읽을 때조차 쉽지가 않다.
부족한 지식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인디언 보호구역과 부족(수우족)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 객관이나 보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사고하는 나에 대해 잊지 말고, 윤리나 도덕을 앞서지 않도록 차분하게.
“옳고 그름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의미의 명암이었다.”
기억해야 사건이 되고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잊고 만 부분, 누군가는 잊을 수 없는 부분들이 단일 사건에 대한 양면적 진실이다. 안타깝지만 다른 설명은 거짓이 되고 만다.
“어쩌면 기억상실은 그에게 과거로부터의 보호이자 과거의 일로부터 그를 용서하는 것이었다. (...) 그의 증손자 킹 주니어는 아직 기억이란 것이 생기지 않아 행복했지만, 할아버지는 기억을 잃어서 행복했다.”
문장이 아름답고 번역도 아름답다. 덕분에 등장인물들에 다소 깊이 감정적 개입을 하기도 하고, 이젠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기분이 시큰거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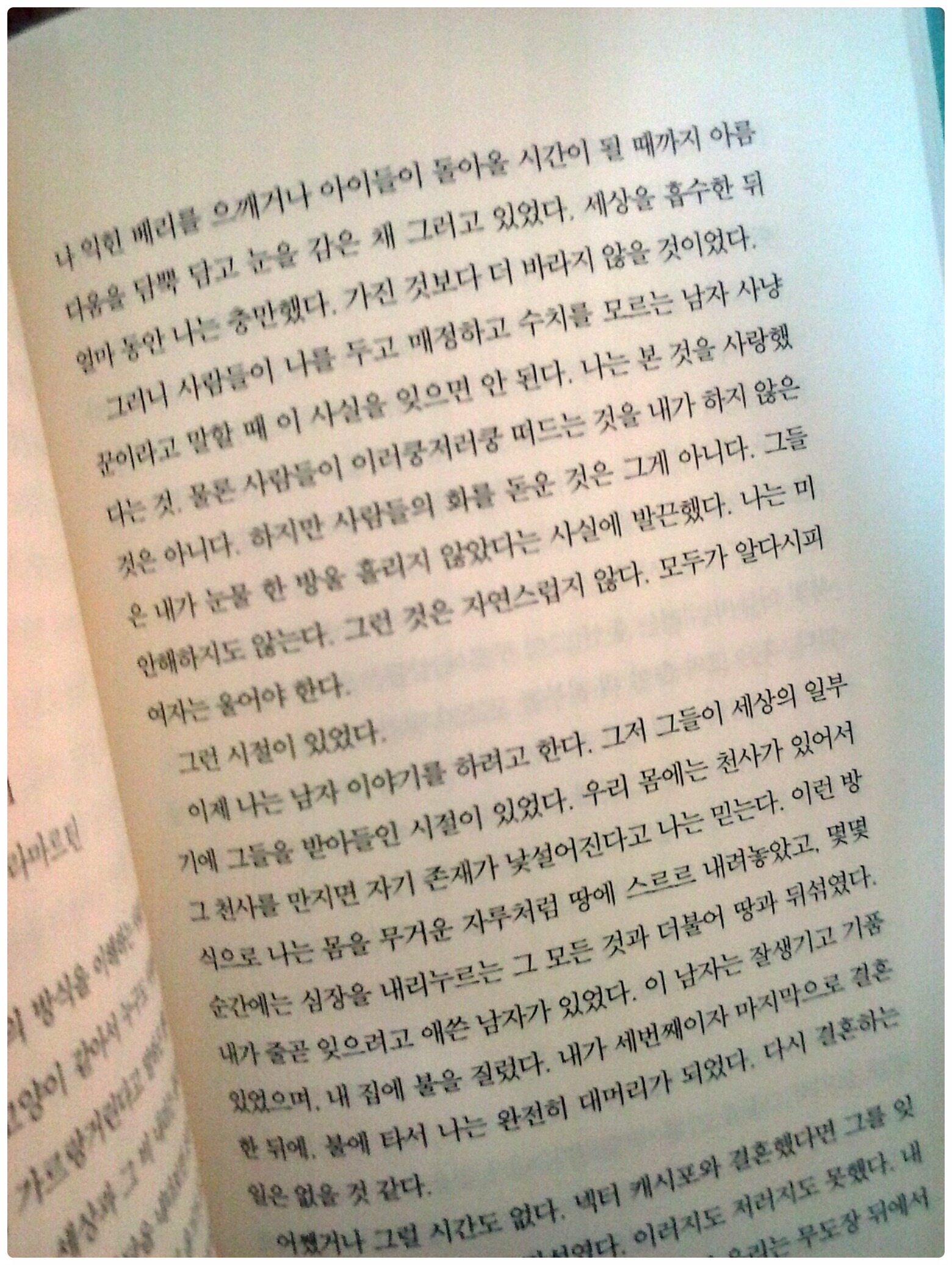
나는 정말 사랑 때문에 아팠던가. 기도로 사랑이 돌아오기도 했던가. 몸은 닳아가고, 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어지럽고 멀미가 난다. 내 시간은 뒷모습도 보이지 않도록 달아나는데, 변해야 할 것들은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다.
“나는 약해졌다. 내 생각들은 가엾게도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고통은 나를 강하게 했지만, 그것이 나를 떠나자 나는 곧 잊기 시작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 내 마음이 경첩에서 떨어져 바람에 흩날리며 나 지신의 고통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낯설지만 부러운 열렬한 감정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사랑이란 시간이 지나면 더 편안해져서, 아파도 많이 아프지 않고 좋아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반들반들 닳아 늙으면 잘 알아채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나는 사랑이 쪼그라들다 죽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제 나는 채찍처럼 분연히 일어서는 사랑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