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냉전의 벽 - 평화로운 일상을 가로막는 냉전의 유산
김려실 외 지음 / 호밀밭 / 2023년 6월
평점 :



필진의 연령폭이 한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 의미있고, 전공을 하거나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표면과 현상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는 내용이 반갑고 귀하다. 작은 책이 거대한 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겼다.
‘일상’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냉전’의 산물이라는 것은 개안 같은 가르침이자, 서글픈 깨달음이다. 모르고 행하는 말과 행동에 세계사가 묻어 있다. 누구도 개별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한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간, 공동체와 공동체, 그리고 문화와 문화의 마주침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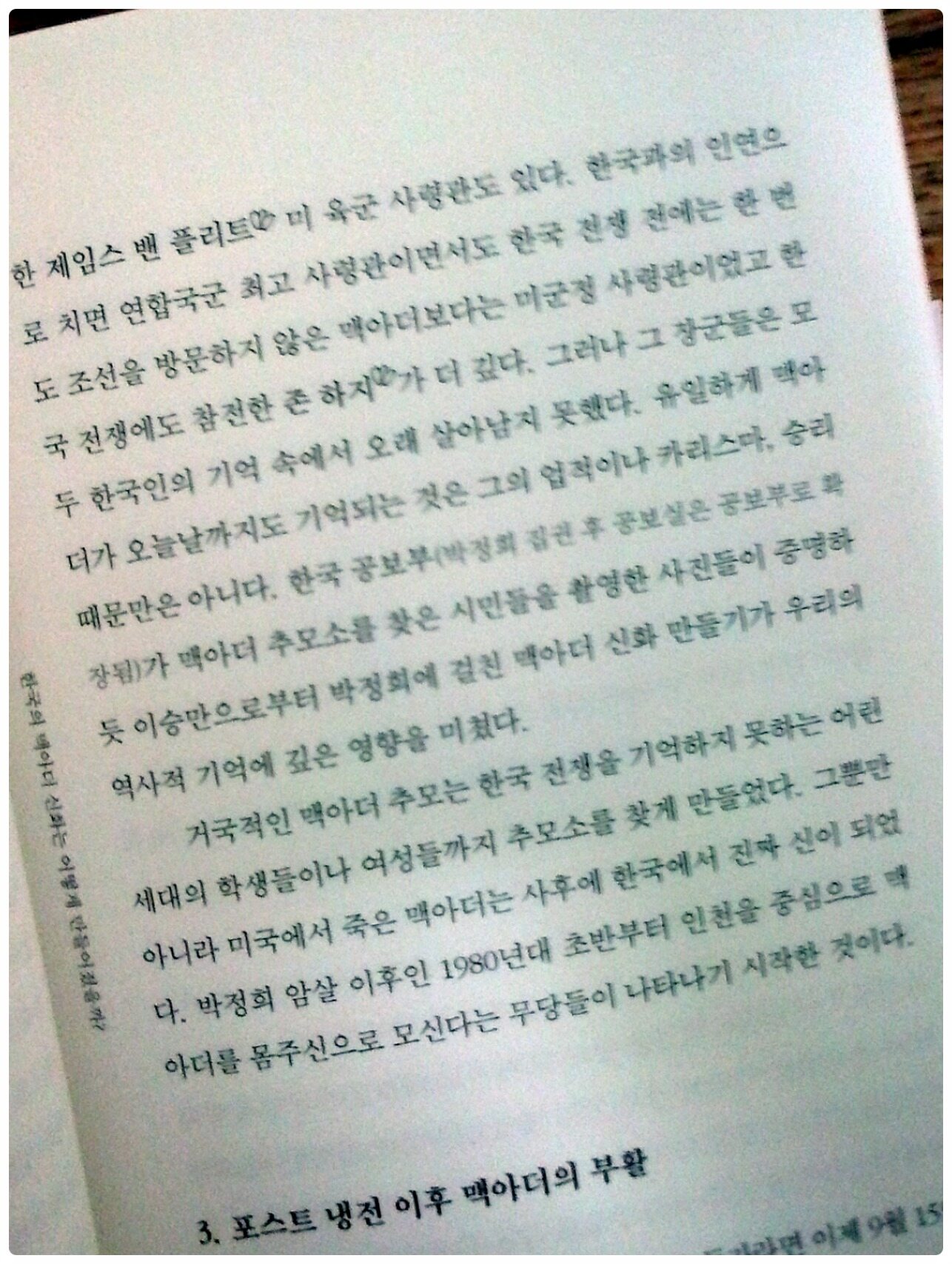
명칭은 익숙하지만,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전쟁의 풍경들이 많다. 한국현대사에 무지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참 부족한 상태로 살았나보다. 그러는 사이, 온갖 냉전의 산물들이 전쟁의 부작용이 모습을 감추고 우리 일상에 숨어들었다.
“6.25 전사자는 찾는데, 살아 있는 전쟁고아는 왜 안 찾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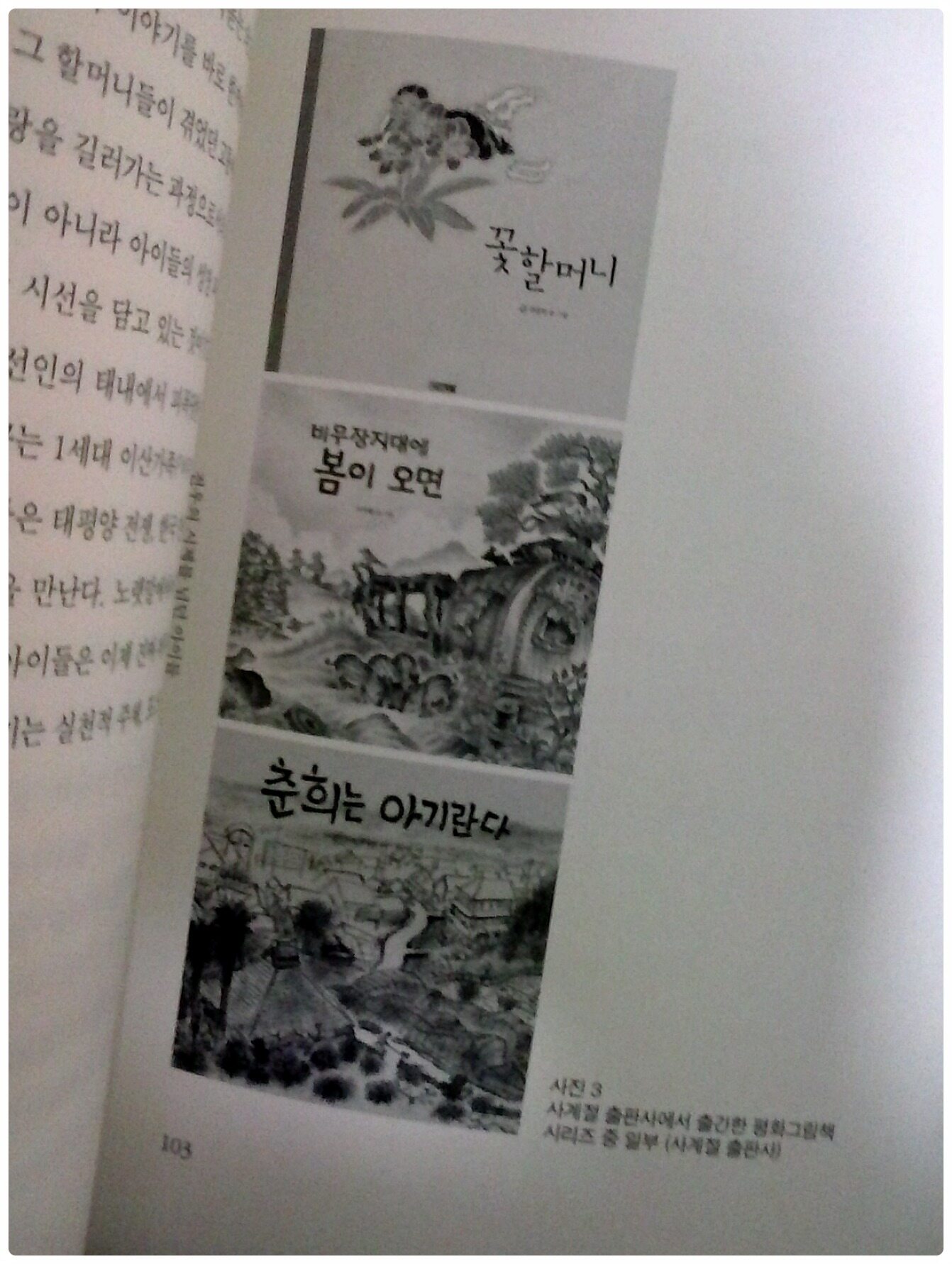
문제는, 숨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습관, 사고, 개인의 일상, 사회의 분위기, 정치수단으로 오용되고 국가 이데올로기와 집단 사고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일까. 부작용과 해악이 너무나 크다. 한번 고착된 후 사라질 줄 모르고 끈질기게 소환되고 거듭 악용된다.
한반도는 대치 상황이지만, 정전 70주년이라는 건, 지금 생존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1년 냉전 구도가 해체되면서, 전 세계도 정전 혹은 종전으로 향한다고도 믿었다.
그러나 남아도는 무기와 냉전 사고에 익숙한 이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는 동안, 크고 작은 침략과 전쟁은 이어져왔다.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면 내전의 형태로. 한국도 마찬가지다.
외세의 침략이 아닌, 갈라진 민족이 싸우고, 남한 내부에서의 권력 지형에 따른 학살이 이어졌다. 갈등과 폭력의 해악은 동일하다. 이모든 공동체적 경험이 개개인을 형성한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연스러워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전쟁이 단일 요소로 모두의 삶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모든 개인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 문제’로 분류되고 통계 조사되는 문제의 큰 틀이 냉전 구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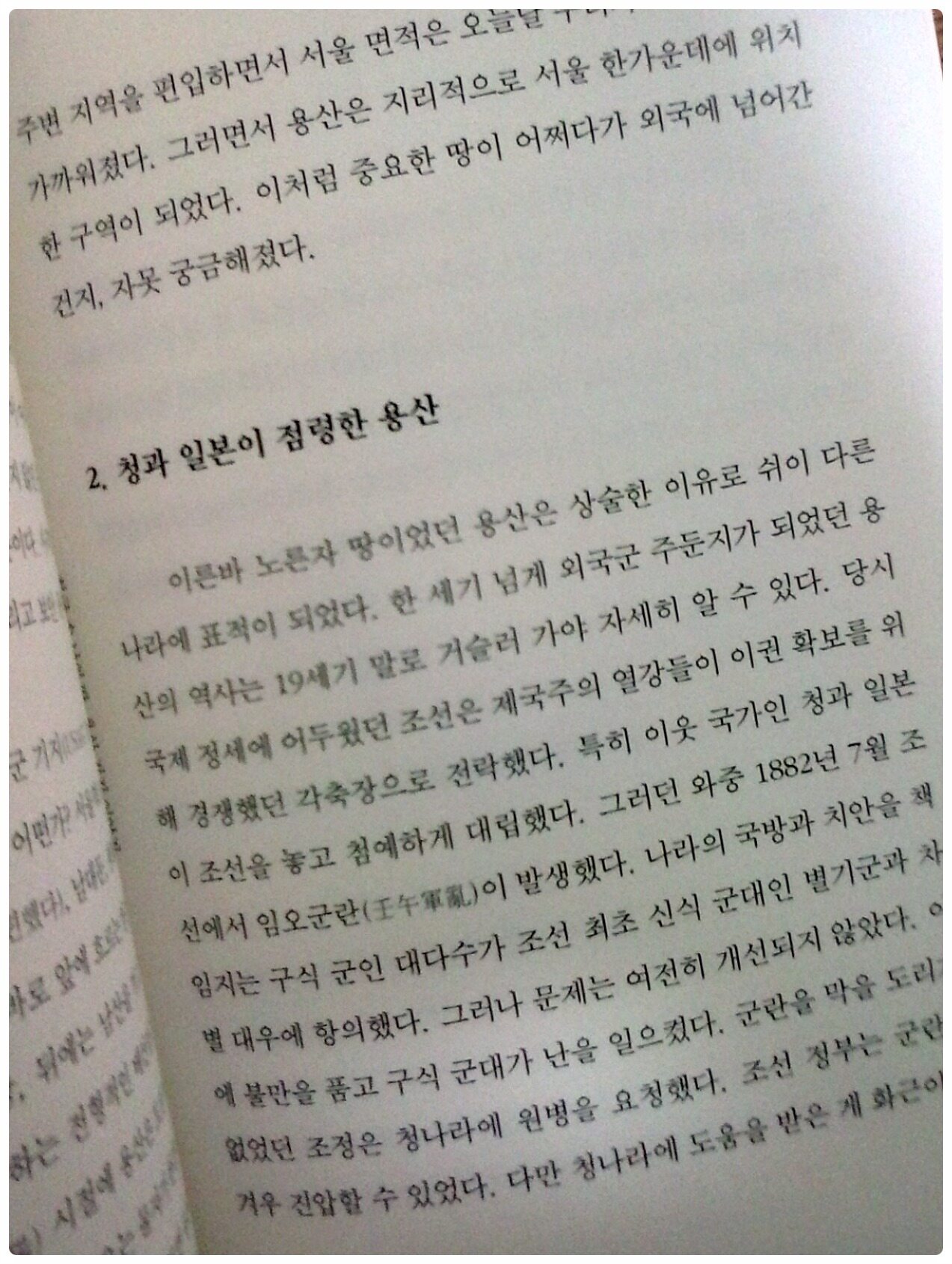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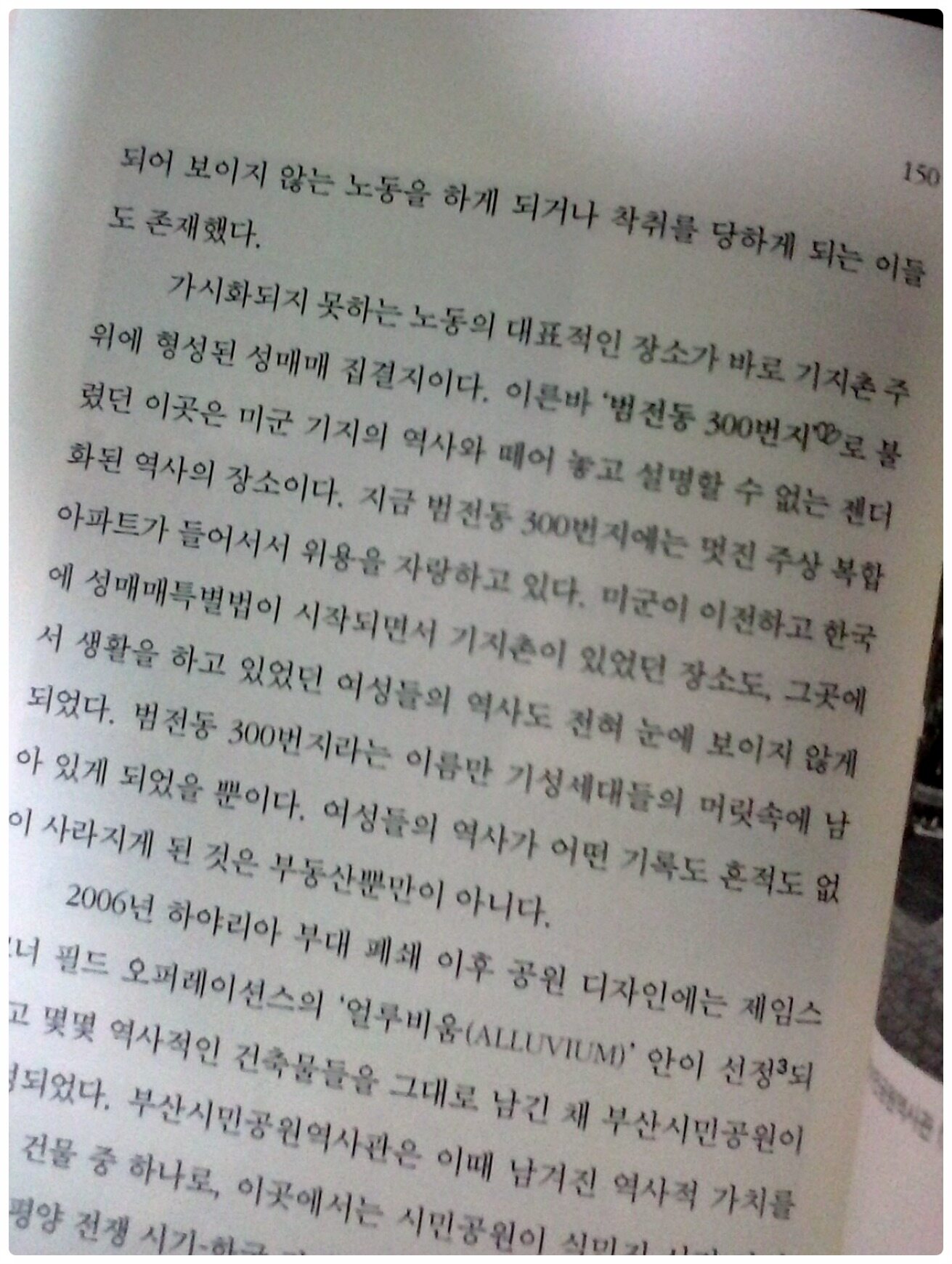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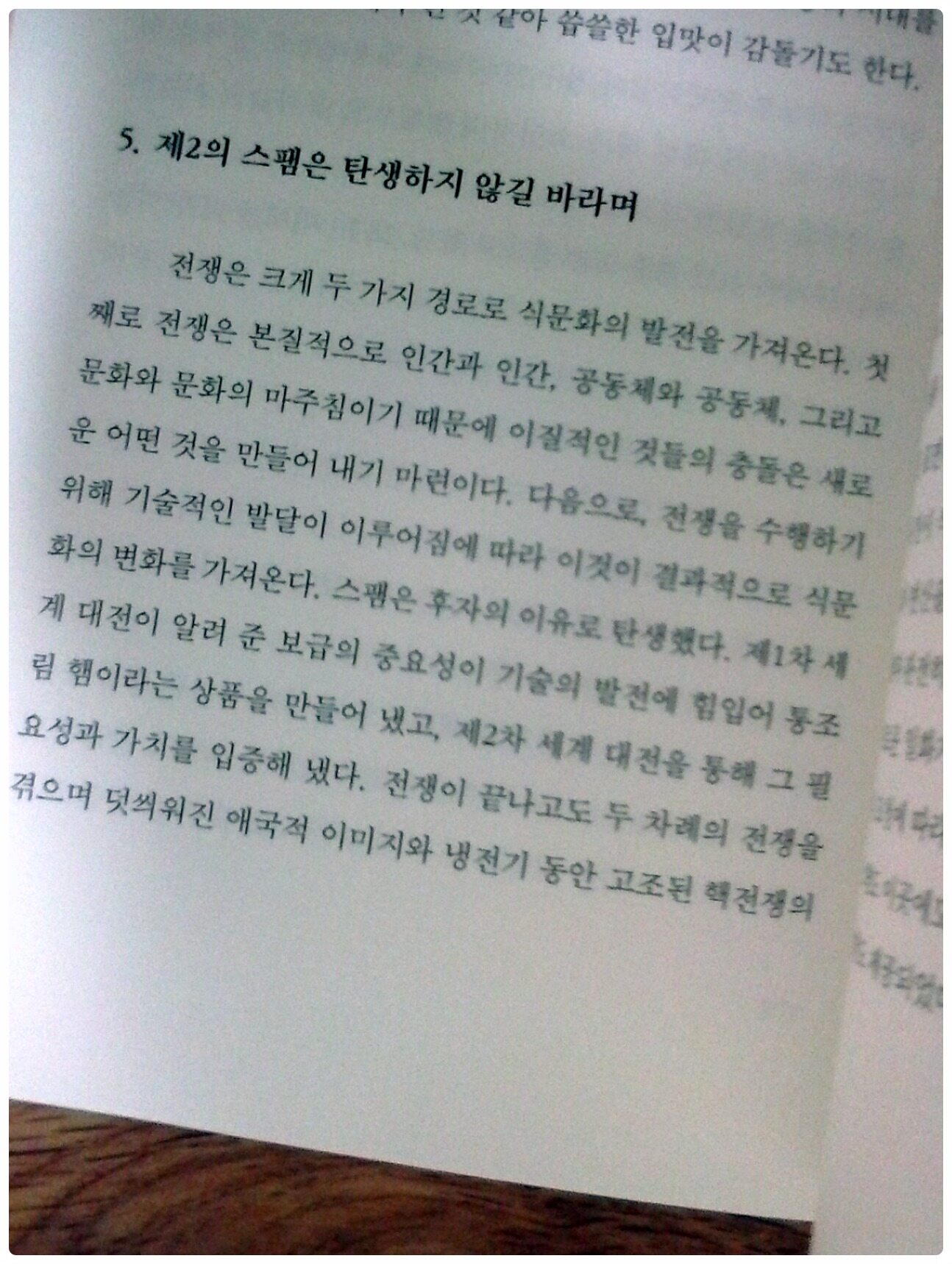
분단선이 갑갑하고 3.8선 남쪽에서만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것도 숨이 막힌다. 다 같이 어딘가 갇혀서 아등바등 왁자지껄 너무 뜨겁고 소란하다. 그 스트레스를 완화할 인프라와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좀 낫겠지만,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방식의 각자도생하라는 메시지만 요란하다.
모두 불행하고 불만이고 불안한. 이기고 죽이는 방법만 배우다 황폐해지는. 결국 나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하는 비극으로 치닫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기에 한반도는 평화를 모른다. 평화롭게 살아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70년 동안 냉전을 차곡차곡 일상화시켰다.
“‘신냉점’이라는 이름 속에서 어떤 여성들이 사라지고 폭력 속에 있는지를 감각할 수 있는 것은 ‘냉전’의 젠더화된 역사를 폭로하여 다시 기록하고 기억하는 속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무지하고 몰상식하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한 모든 언행들과 정치전술들이 실은 예외가 아닌 일상이었다는 생각을 덕분에 해본다. 왜 저럴까, 했던 질문은 인식하지 못한 기저에 원인이 있었다.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불안은 더 일상화되고,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과 혐오와 폭력은 더 빠르고 강하게 재생산을 거듭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