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해 여름 필립 로커웨이에게 일어난 소설 같은 일
박대겸 지음 / 호밀밭 / 2023년 6월
평점 :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설. 가볍고 판형이 예쁘고 활자도 편안해서 잘 안하는 카페 독서를 했다. 주말인데 카페가 텅 비어서, 잠시 꿈을 꾸는지 현실인지 의심했다. 온통 여름인 풍경을 보며, 뉴욕의 여름으로 들어가 본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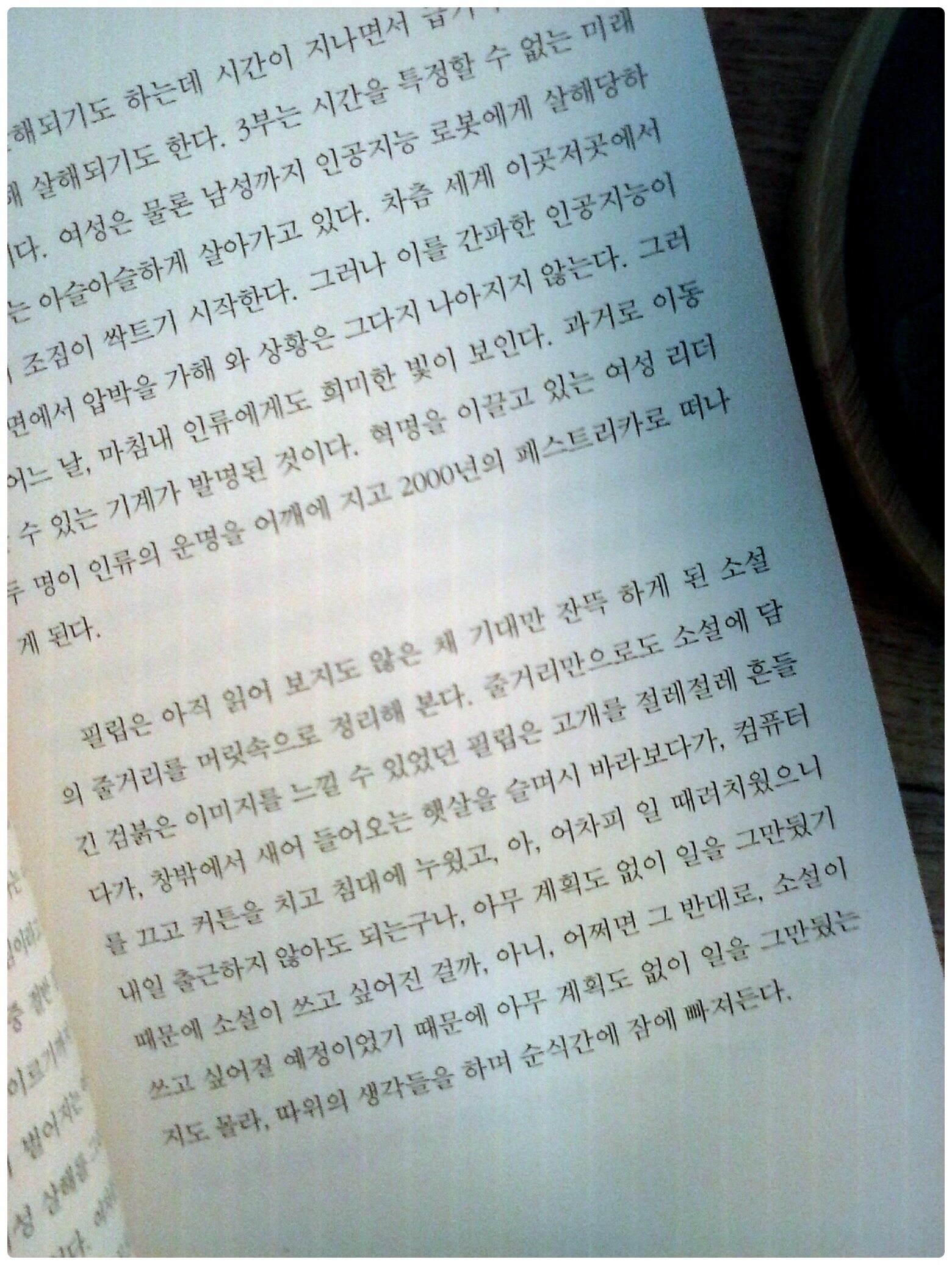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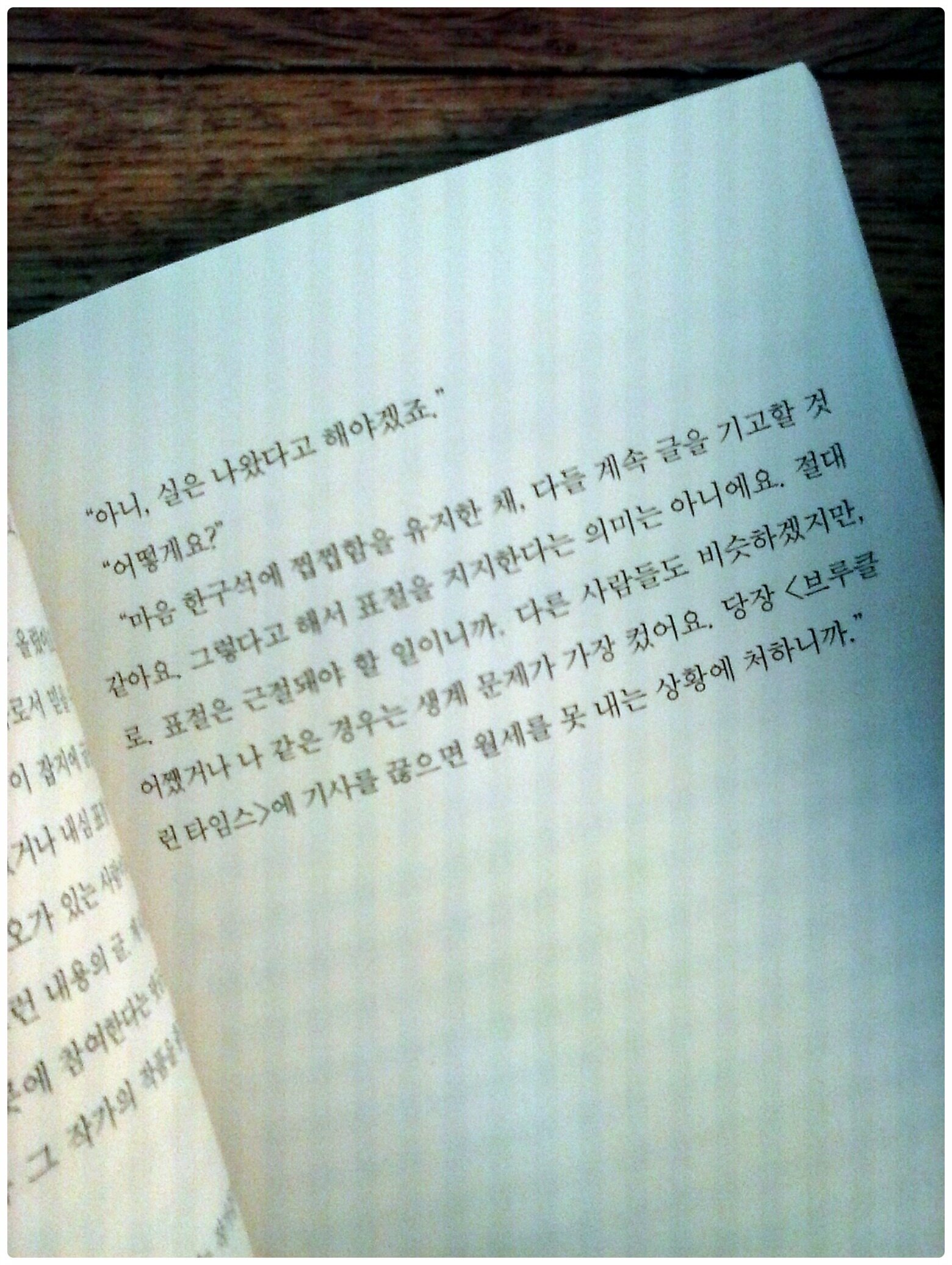
소설 쓰기란 건축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충동에 의해 시작된다는 설정 자체도 첫 문장이 이렇다는 것도 재밌고 특이한 작품이다. 와중에 <666, 페스트리카>라는 소설이 있는지 찾아본 나도 웃긴다.
주인공 필립은 소설쓰기가 아닌 소설 찾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책을 찾아다닌다. 그렇게 1부가 끝난다. 다큐멘터리 같기도 한 여정을 따라다니며, 이야기는 내 짐작과 달리 낯선 전개일거란 기대와 설렘이 더 생겨난다.
전혀 모르는 세계의 전혀 모르는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만 같다. 글에서 언급되는 작가와 작품들도 대체로 낯설다. 나야말로 작가와 작품을 조사하고 찾아보려 떠나야할 듯한 기분이다.
일상의 풍경 속을 걷기를 좋아하는 나는, 필립이 안다고 생각한 풍경과 대상들을 낯설 게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의 것들이라 믿었던 것들을 의심하는 일렁임이 좋았다. 그래서 궁금하다. 왜 자기고백인 에세이가 아닌 소설이었을까.
문득 필립의 삶에서 덮이고 묻힌 중대한 비밀이 있는지 추리 스릴러적 상상을 했지만, 드러나는 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더 거대한 것이었다. ‘필립’이 자신이라고 믿은 존재 자체의 재구성, 관계와 주변 환경의 재편성에 준하는.
그렇게 이해하니 내가 생각한 소설의 역할에 잘 맞는다. 타인의 이야기를 읽고, 그 상황에 나를 대입해보고, 엉뚱한 타인들을 이해하고, 내 삶과 내 생각에 대해 점검해보는 경험이 소설 읽기니까.
“독서라는 것은, 길을 찾는 행위라기보다는, 어쩌면 미로에 빠지는 행위에 가까울지도 모르죠,”
소설 쓰기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필립의 첫 소설은 필히 자전소설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의 작품도 얼마간은 자기 이야기이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다. 충동적인 문학 창작의 욕구가 결국 자신에게 닿는, 모범답안같은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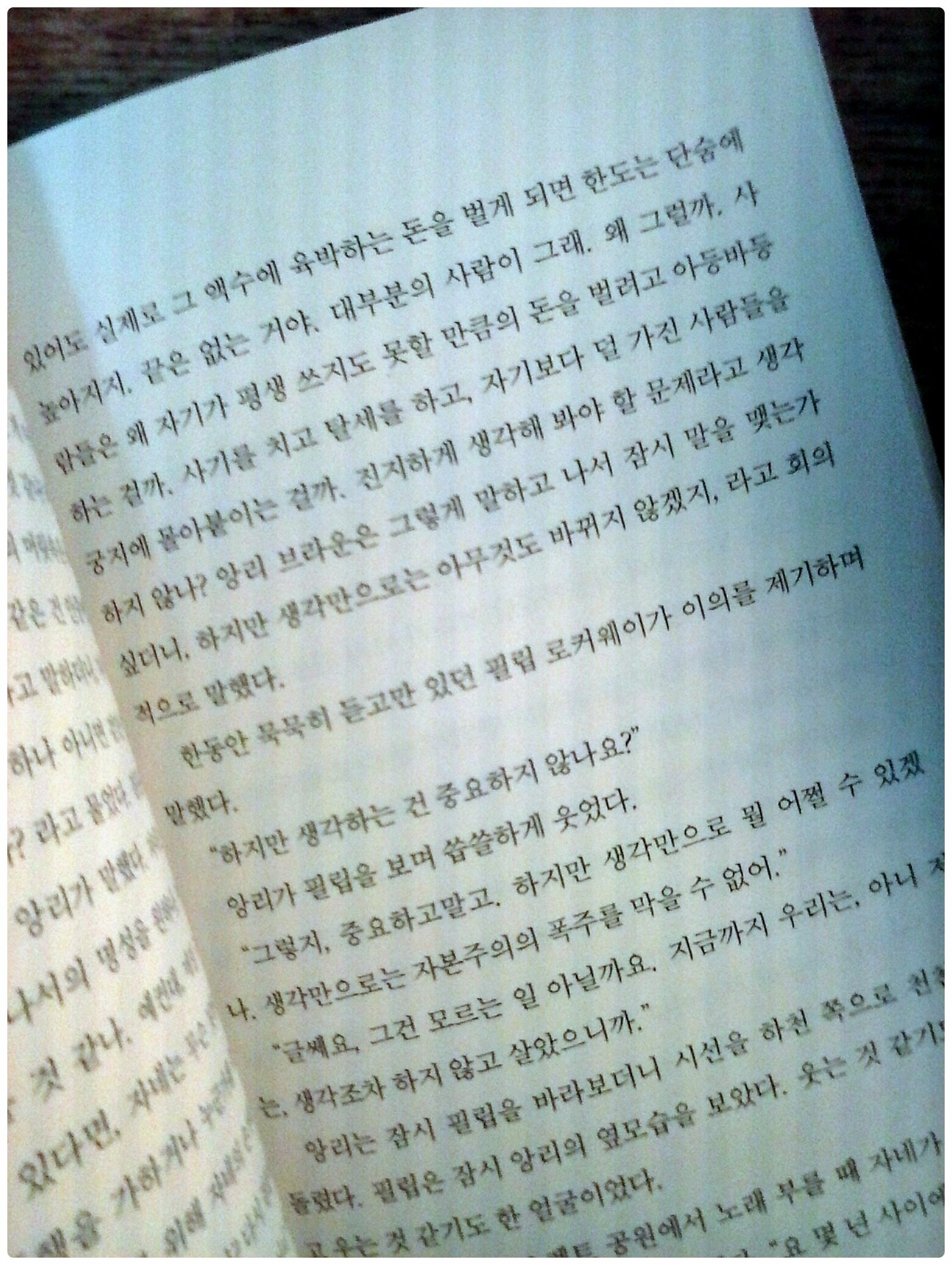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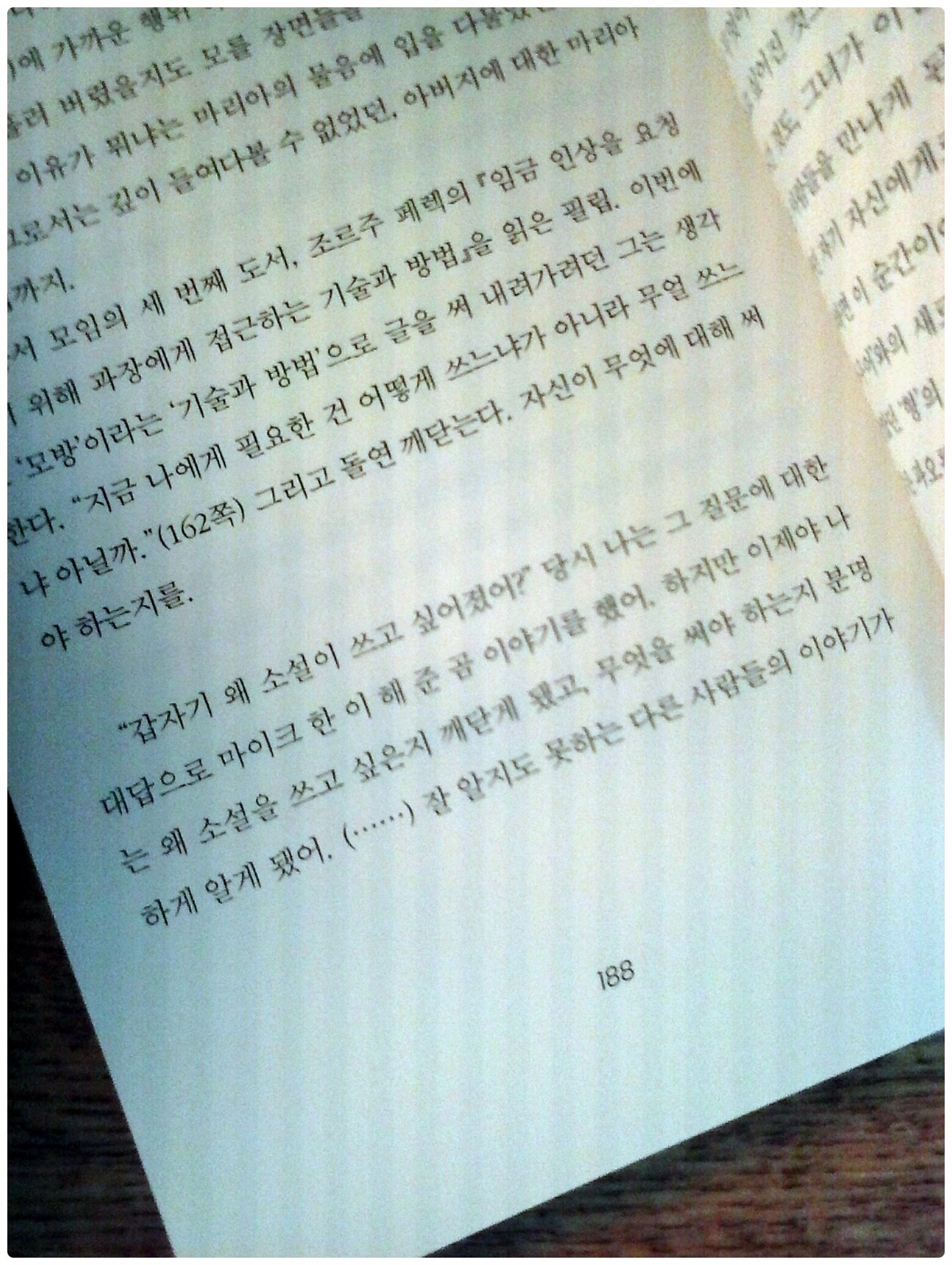
“나는 곰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야 해. 내가 공포를 느끼는 곳으로, 자꾸 덮으려 하고 모른 척하려 하고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려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해.”
6월부터 에세이가 전혀 안 읽혀서 소설을 많이 읽고 있다. 책을 펼치면 입장 가능한 낯선 세계가 좋고, 그 시간이 평화롭다. 늘 돌아와야 하는 현실이 책읽기로 달라지진 않지만, 버티고 견딜 힘이 보태진다.
창작을 하시는 분들과 읽는 독자들이, 깊어가는 여름 무탈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