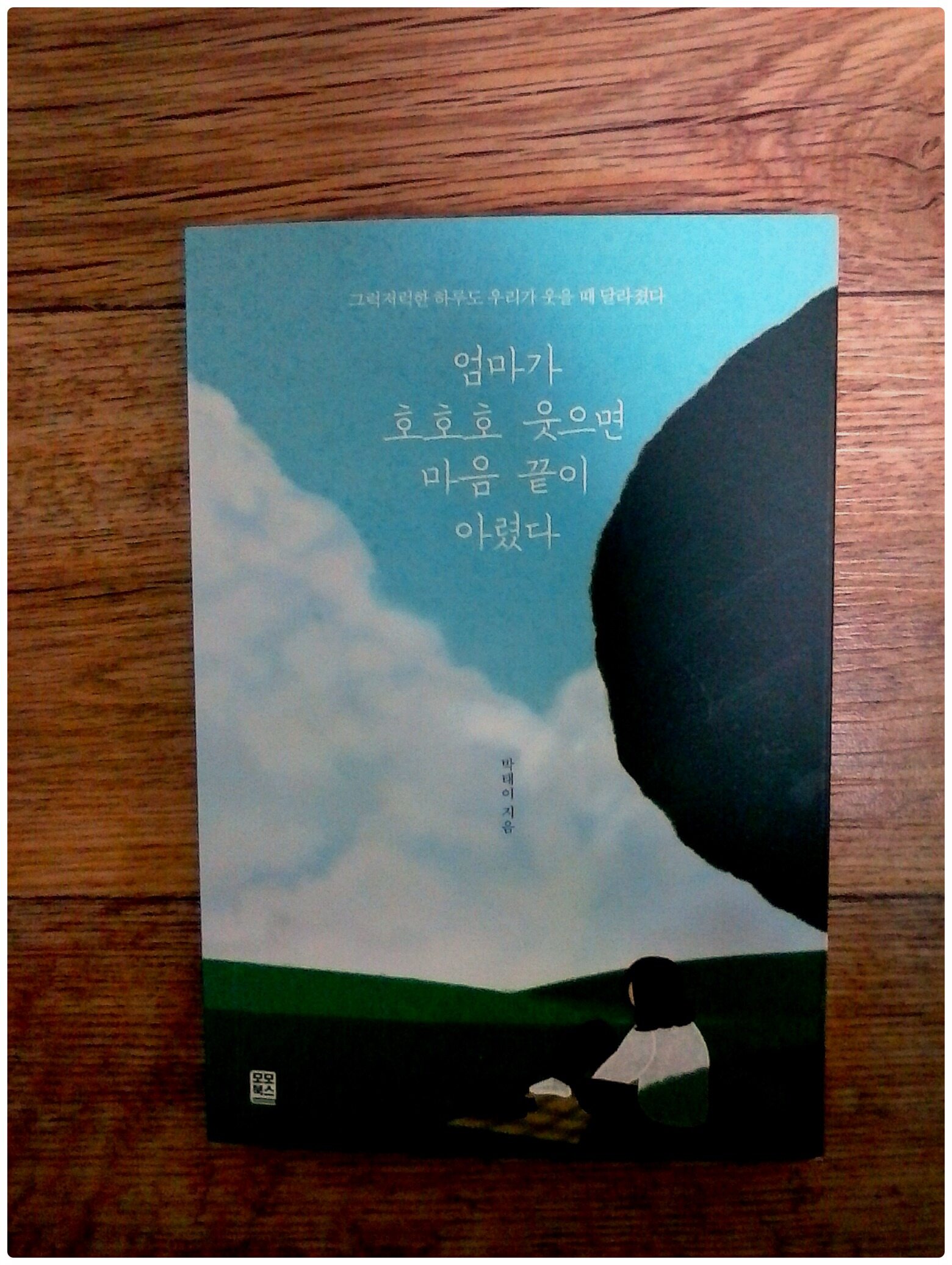-

-
엄마가 호호호 웃으면 마음 끝이 아렸다
박태이 지음 / 모모북스 / 2023년 1월
평점 :



‘엄마가 호호호 웃’는 최근 모습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크게 웃고 사시기를 바랄 뿐이다. 가족은 순식간에 끓어 넘치는 감정의 발화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나이가 들수록 더 담담해지려고만 노력 중이다. 잘 하는 일인지는 모를 일이나, 새롭게 상처를 내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
“나잇값을 하려면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만 같기도 하다. 어른이 된 후 감정을 보이는 일이 마치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다. (...) 대부분은 울지 않고 참지만 (...).”
인간의 집이 새둥지와는 다르지만, 성장하면 떠나야 다 같이 둥지 째로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비유를 하기에는 맞춤 이미지다. 물론 평생 함께 사는 2세대 이상의 가족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독립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고.
영화 제목처럼 들리는 ‘내 집은 어디인가’하는 문제는 성인이 되어 해결하기에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에 심정적으로 살고 싶은 집은 조부모님 댁이었고, 대개의 20대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빨리 독립하고 싶었다. 그리고 고령의 부모님 댁을 평생 가장 많이 자주 방문하는 요즘이다.
가족의 형태도 여럿이고, 상황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니 이 책을 통해 떠올린 내 가족 얘기만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덜 힘겹고, 더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천국에서 사는 듯한 날은 오지 않더라도, 견딜만한 지옥이 될 수는 없을까. 어불성설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아주 가까운 타인을 만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나. 나의 일상에 가족을 담을 자리는 얼마만큼 남겨두었나. 누구의 마음에나 용량의 한계는 있지 않나. 하지만 그럼에도 애를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노동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면 타인은 고사하고 나 하나 감당하고 돌보며 살기도 점점 어려워진다. 나처럼 의지가 약하고 게으른 유형은 더 힘이 든다. 혹시 부모님을 보러 가는 일을 빼먹고 싶어질까 봐, 내게 필요한 택배를 부모님 댁 주소로 보내는 꼼수도 쓴다.
“어떤 날에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떠나버린 상상을 한다. 지금은 내 곁에 있지만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어딘가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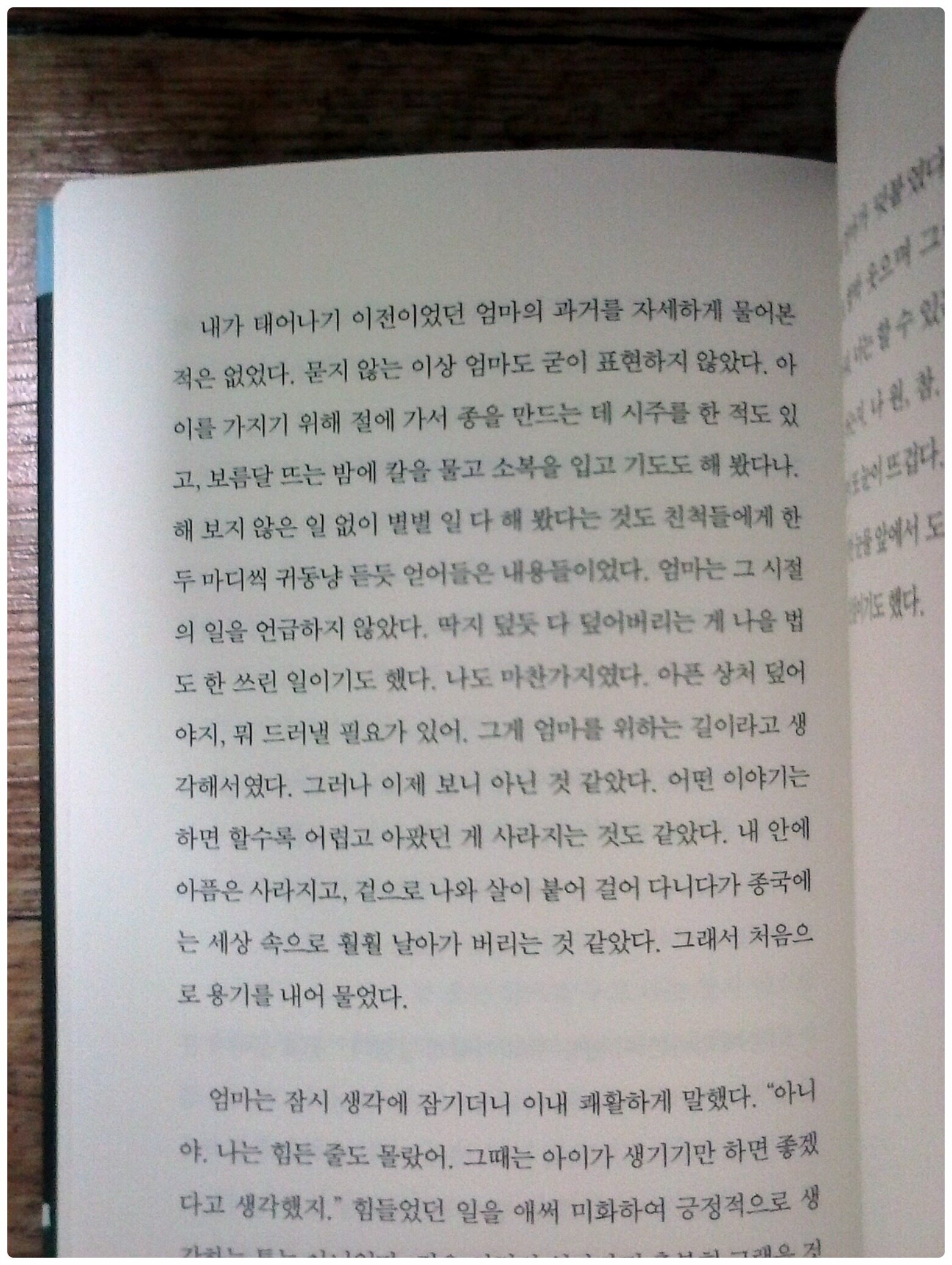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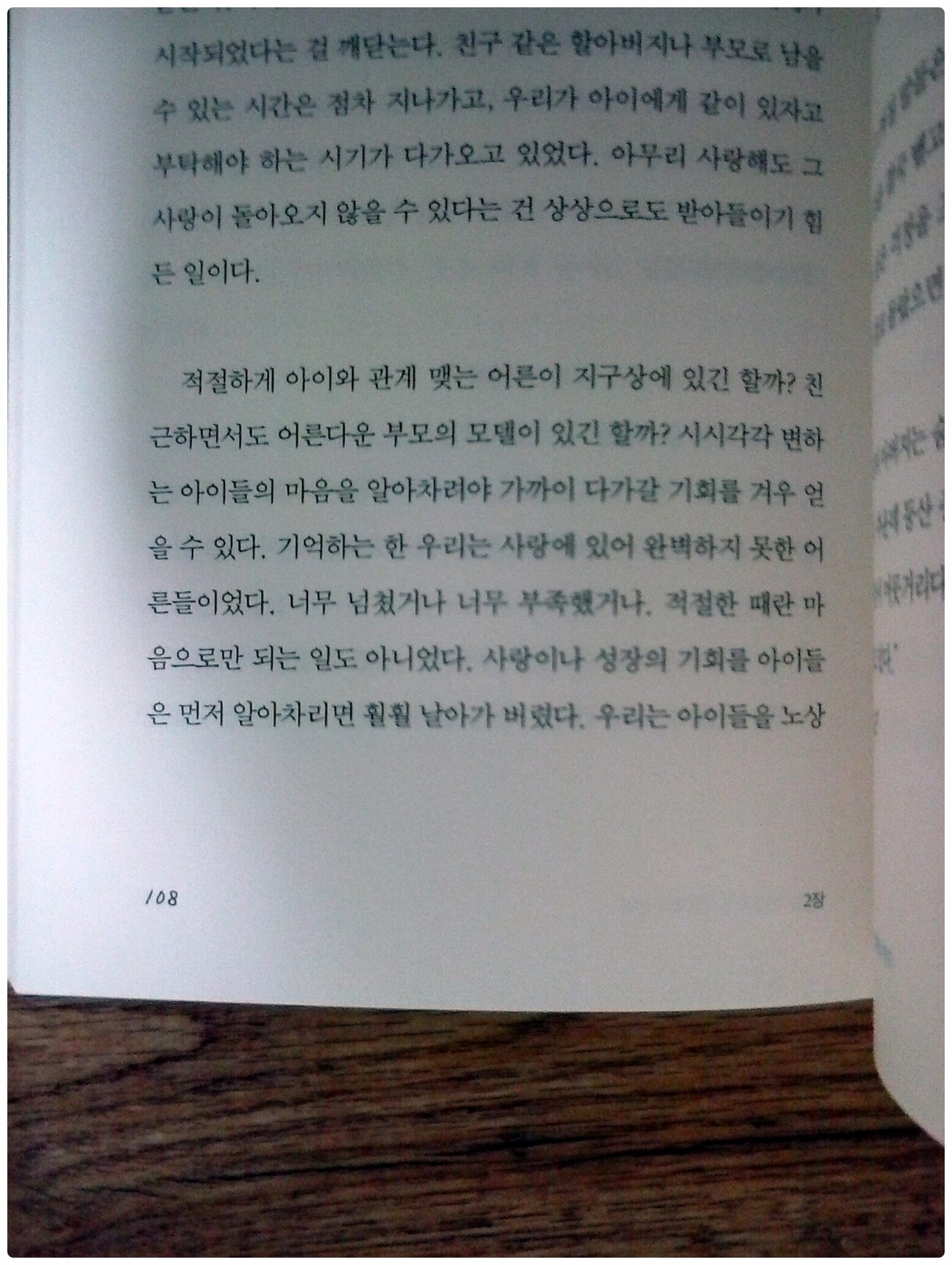
평범한 일상 이야기라 어려움 없이 읽히지만 문득 먹먹해지기도 한다. 모든 순간이 단 한번 경험하고 살아보는 삶 그 자체라는 걸 알아서도 그렇게, 모두가 모두와 이별이 확정되어 있어서도 그렇다. 다 알아도 이별에 익숙해지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수명도 짧고 대개 기대수명보다 더 빨리 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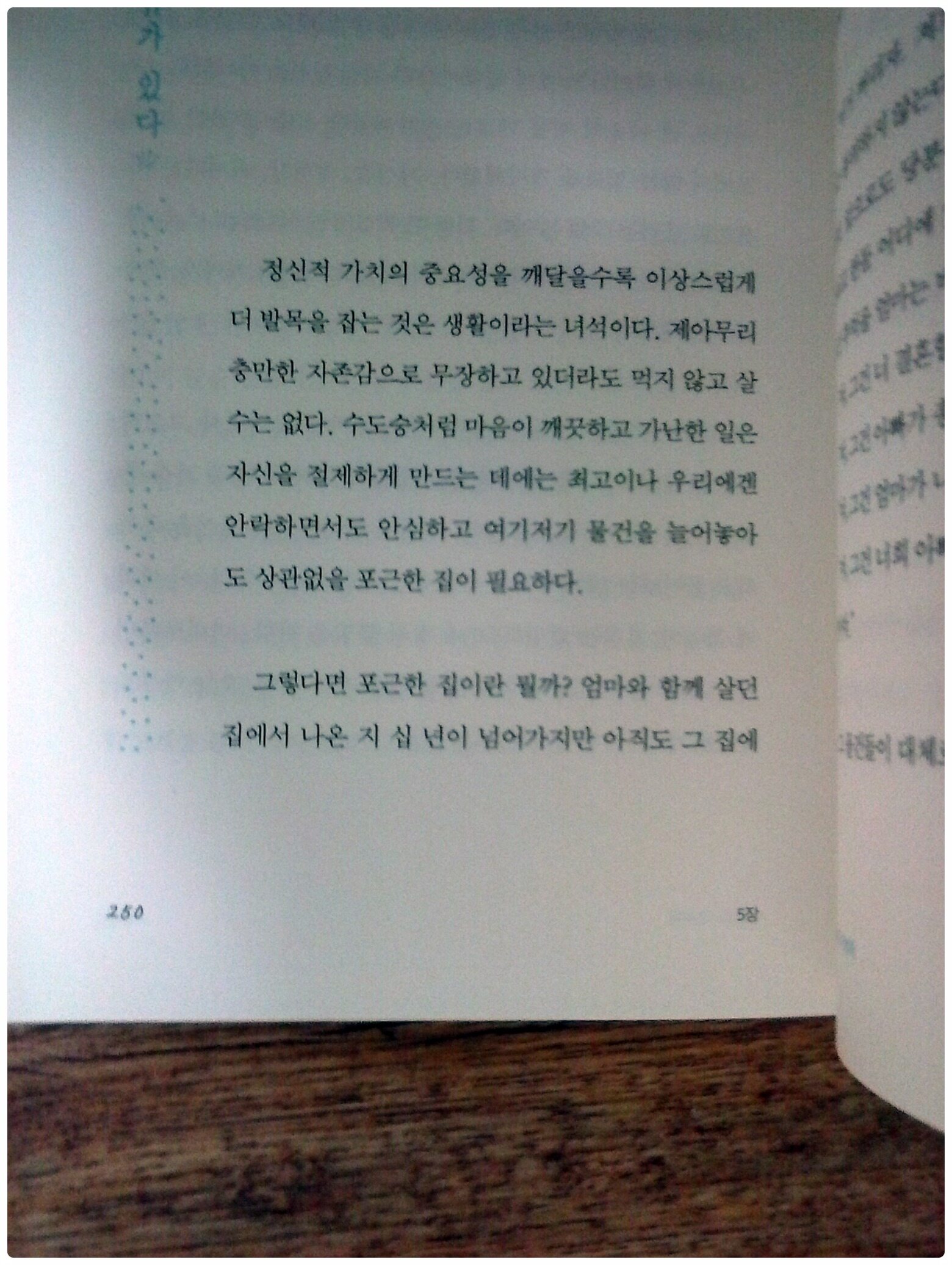

나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따듯한 분의 기록이다. 내가 하한선의 마지막에 발을 딛고 버티고 선 삶이라면, 저자는 상한선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려고 애쓰는 삶이다. 그래서 더 애틋한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 그런 일들을 잘 쓰고 싶다. 찰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순간들을 꺼내어 모아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