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별의 시간 ㅣ 암실문고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지음, 민승남 옮김 / 을유문화사 / 2023년 2월
평점 :



결심한지 얼마 되었다고 또 게으름에 변명에 걸으러 나가지 않았다. 2월 22일이고 수요일이고 특별할 것 없는 정보들을 격려 삼아 3일 만에 산책. 쌀쌀하긴 하지만 쨍함이 무뎌진 이제 곧 봄밤이다.
검은 하늘도 흐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늘보다 더 흐려진 눈을 올려 깊이 들여다봐야 했다. 별빛이 적다, 그나마 밝은 것들은 인공위성들이겠지. 언젠가 인간이 만든 모든 것도 우주의 먼지가 될 테니, 지구도 다시 우주의 일부가 될 테니, 인공이건 아니건 아쉬워하지 않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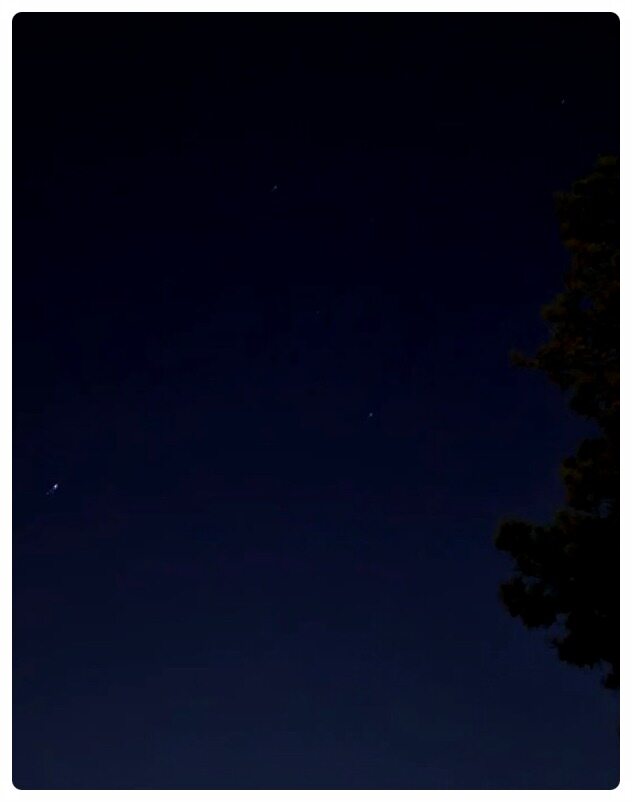
어두운 밤에 구경(?)하기에 더 맞춤한 제목은 없을 듯했다.
A hora da estrela
The hour of the star
별의 시간
저자 이름조차 별빛이다
Clarice : from Latin Clara, "bright, shining, clear"
Li-spect-or : spek- "to observe", observer
빛 관찰자
“한 분자가 다른 분자에게 ‘그래’라고 말했고 생명이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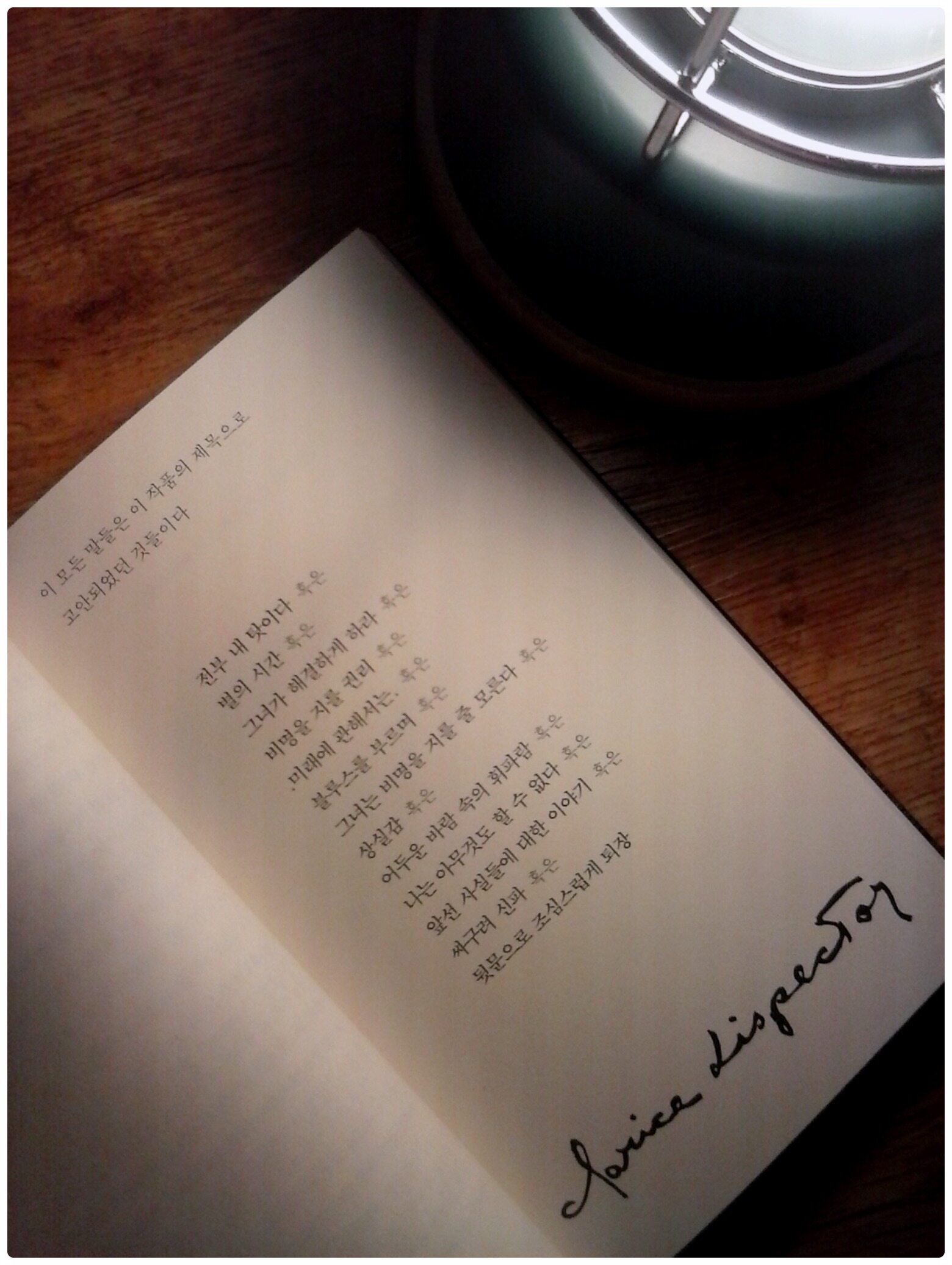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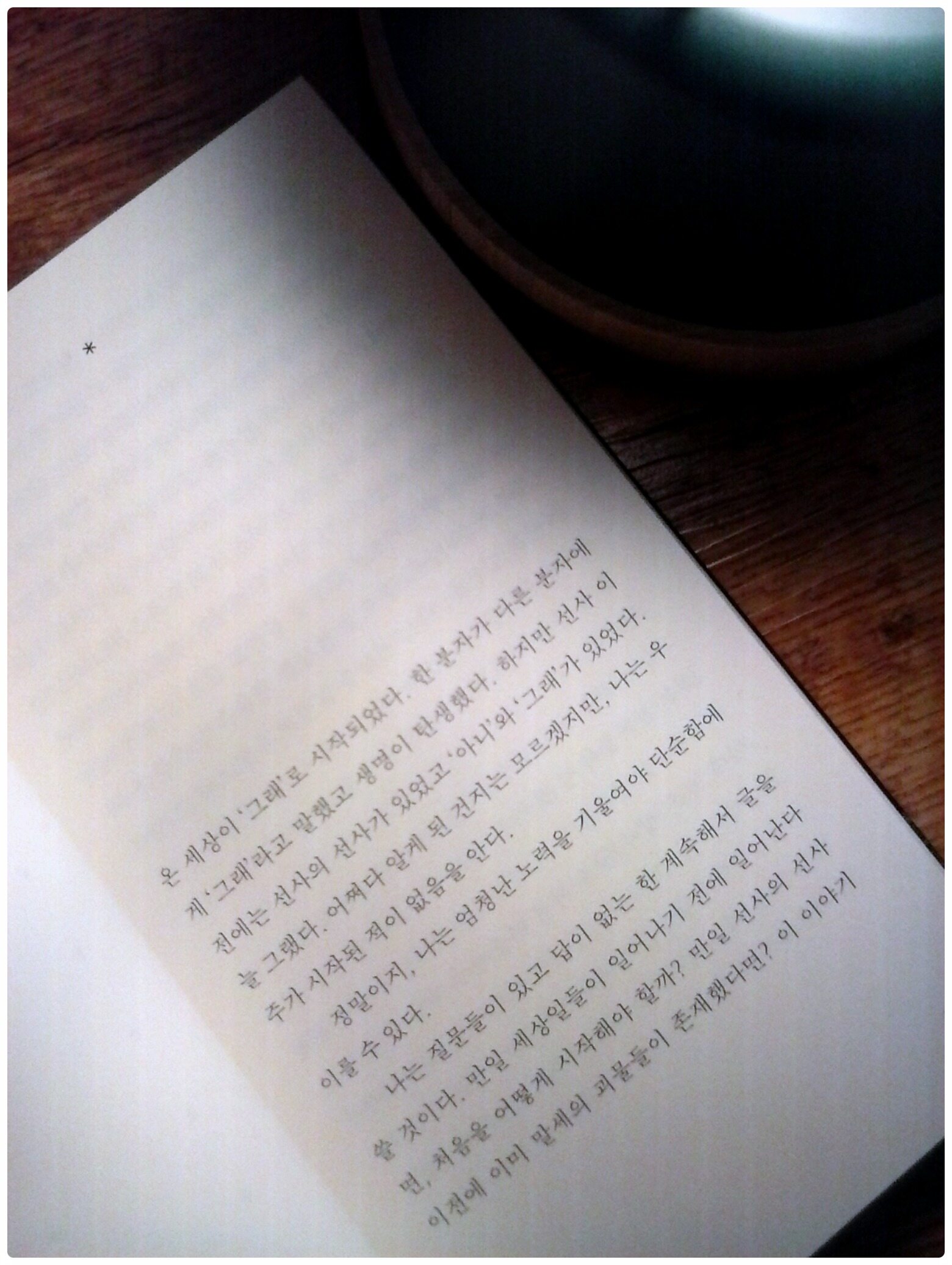
첫날은 몇 장 못 읽고 잠들었다. 주말 저녁 약속과 다른 책에 끌려 별의 시간을 덮어 두었다. 작가의 전작도 읽다 멈췄는데, 선홍빛으로 아름답던 표지가 핏빛으로 느껴지던 문장을 만난 순간이었다. <야생의 심장 가까이>로 칼날이!
아니, 그 칼날은 ‘웃고 있는 허파 속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파고 들었다(219)’고 했다. 선명한 생각을 타고. 얼음장에 닿은 듯 놀라 날이 더워지면 천천히 읽자고 도망갔다.
한 사람을 깊이 사귀기보다 유쾌하고 늘 뭔가 새로운 일회성 만남을 즐기는 사람처럼, 요즘 독서가 대체로 그렇다. 그게 편하다. 어쩔 수 없이(?) 끌려들고, 뭔가가, 때론 중요한 것들이 덕분에 변하게 되는 책들은 여전히 있지만.
작가가 어떤 사상을 심화시켜 얼마나 깊숙하게 작품에 담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간질거리는 감각만 느껴진다. 전통을 파괴하고, 파격적으로 묘사하고, 기존과 현상status quo를 거부하면서도 완전한 문학을 창작했다는 것.
“사실 나는 작가라기보다는 배우다. 구두점을 찍는 방식이 단 하나로 정해진 상태에서 어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홀려, 그들의 호흡이 내 텍스트와 함께 가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릴수록 헷갈리는 글을 읽으면서 무척 감정적이 된다. 예측도 할 수 없고, 자주 비인간적 사고로 가장 인간적이라는 스토리를 읽어야하고. 당대의 이야기인지 여전한지 모를 제한된 의식 묘사에 갑갑해지고.
헌사를 쓴 이, 작가, 작품 속 마카베아는 여러 명의 동일인이다. 여러 세계의 경계선을 넘어 다니는 읽기도 쉽지 않다. 극적으로 대비되는 캐릭터 덕분에 중심을 잡고 따라간다.
‘나’라는 것이 운이 좋으면 양면적이고 나쁘면 다면적인 ‘나’라는 존재의 파편들이 극적으로 체화되어 있다. 진실로 ‘혼자인 시간’은 언제일지. 아무도 못 믿는 내게는 진실을 전해 줄 타인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일 년이 지난 전쟁은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픈 것은 선명한 피해자들이다. 백여 년 전, 1920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러시아 내전을 피해 브라질로 간 작가.
여성으로 작가로 생존하기 참담했던 부조리한 브라질 사회, 불법이었던 이론, 불안, 불면, 수면제, 흡연, 화재, 전신 화상, 잔혹한 희망... 죽음 말고, 존재의 소멸 말고 자유로워질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빅뱅의 순간을 몰라도 우주가 계속 달라져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상 가능하다. 마지막 순간 가장 밝게 타오르는 별의 생멸의 모순처럼, 그의 문학은 파괴적이지만 신비로운 형식을 갖춘 재생하는 우주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