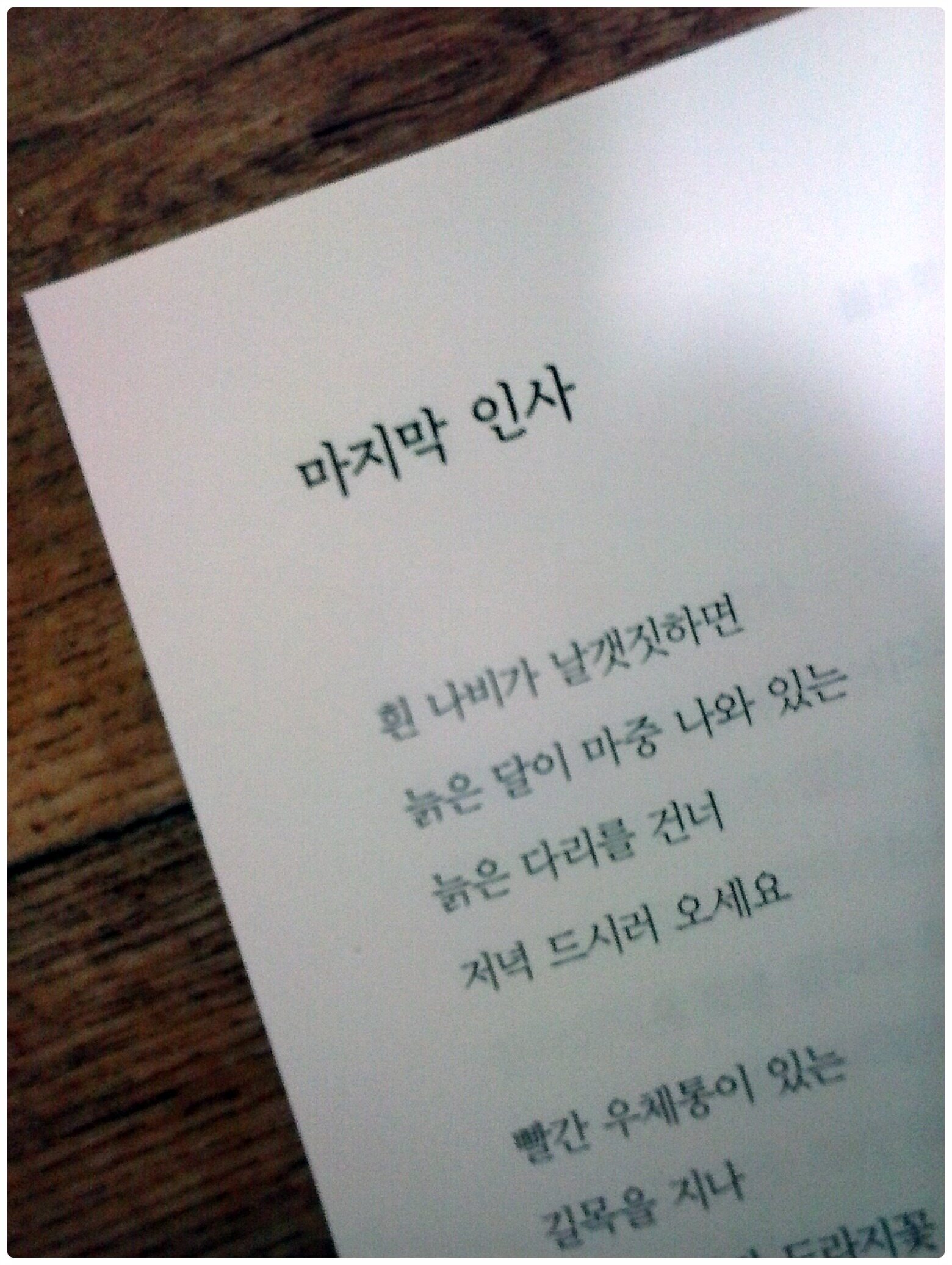-

-
적막한 저녁 ㅣ 밥북 기획시선 35
김남권 지음 / 밥북 / 2023년 1월
평점 :



소설보다 만만한(?) 시집이 좋은 휴일이다. 만만하다는 건 끊어 읽을 수 있어 부담이 없다는 것뿐이다. 집중력이 엉망이다. 그리고... 자주 그렇지만 계획과 다르게 두 시간을 꼬박 앉아 읽게 되었다.
분명 다른 일상을 사는 분인데 감정의 순간 증폭의 온도가 비슷할 것 같은 구절들에서 매번 멈추게 된다. 시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내 추억이 재빨리 그 자리들을 차지한다. 진해지면 막강해지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저릿하다.
1월에만 여러 시인의 시들을 꺼내 읽었다. 화르륵 거리는 화마를 순간 처방하기에 간결하고 날카로운 시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화가 나면 주변 사람도 잘 안보이는 나와 달리, 시인은 일상의 모든 사물에 시선을 두고 사유를 펼쳐낸다.
따라 하기 흉내를 내다보면 산책길 익숙한 풍경도 그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우주의 풍경으로 다시 보인다. 늘 그랬는데 늘 눈을 뜬 채로 못 보고 사는 나. 측정할 길은 없지만, 현실의 풍경을 본 시간보다 상상 속 풍경을 헤맨 시간이 더 많을까.
그래서 그렇게 자주 넘어져야했을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가 농담도 우스개도 아닌 순간들이 무서워진다. 과학의 툴을 사용해서 세상을 볼 때는 단단하게 느껴지던 설명들이 혼자 생각할 때면 실체와 구성과 상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만다.
실체가 없는 ‘나’라는 존재들이 모인 ‘우리’가 계속 구성해내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만이 잠시 현존하는 세계인건지, 그렇다면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나의 차이는 무엇인지, 현실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상상일 뿐인지, 그렇다면...
꿈을 꾸는 거라면 기왕이면 즐겁고 행복한 내용이면 좋다.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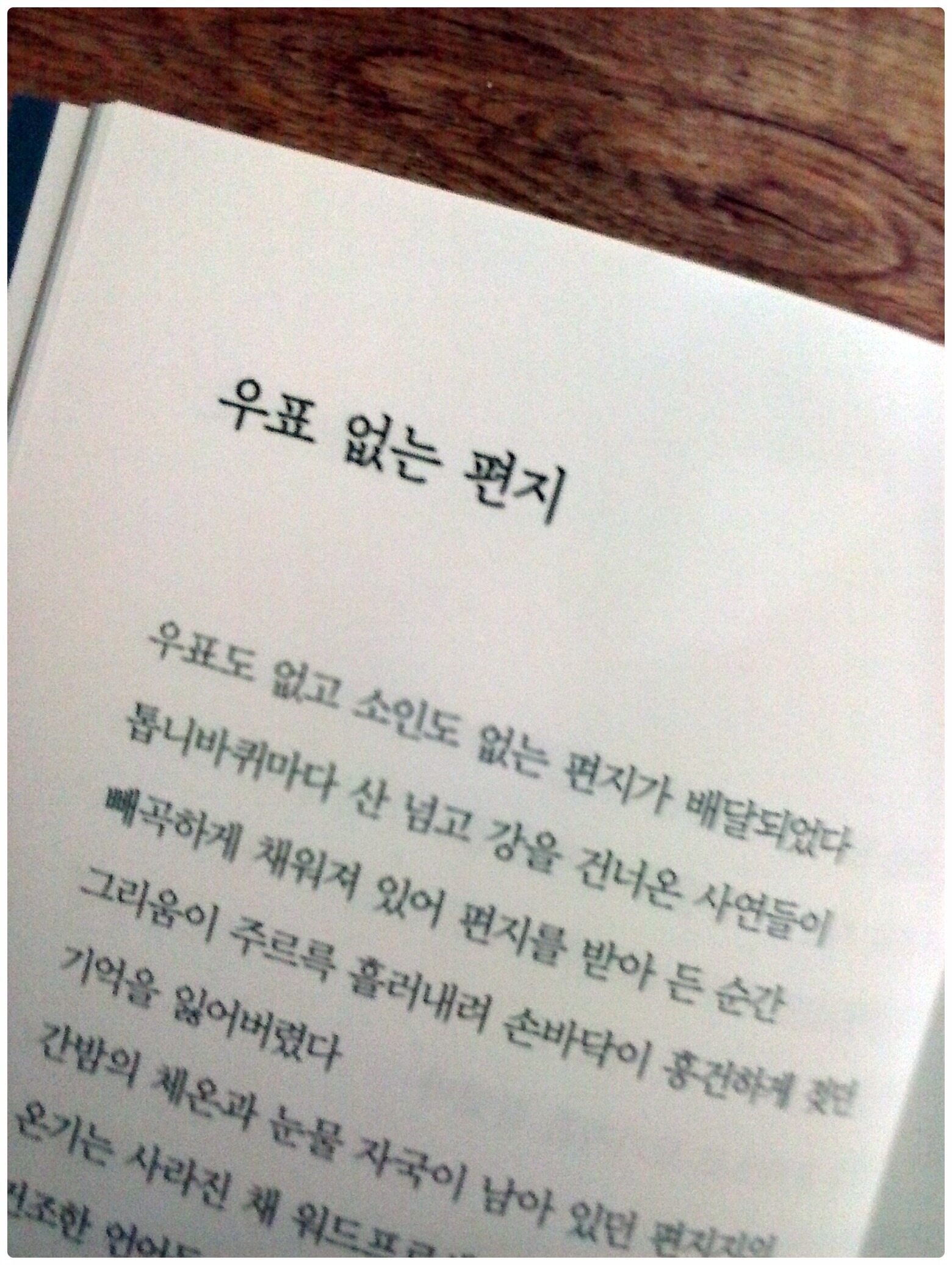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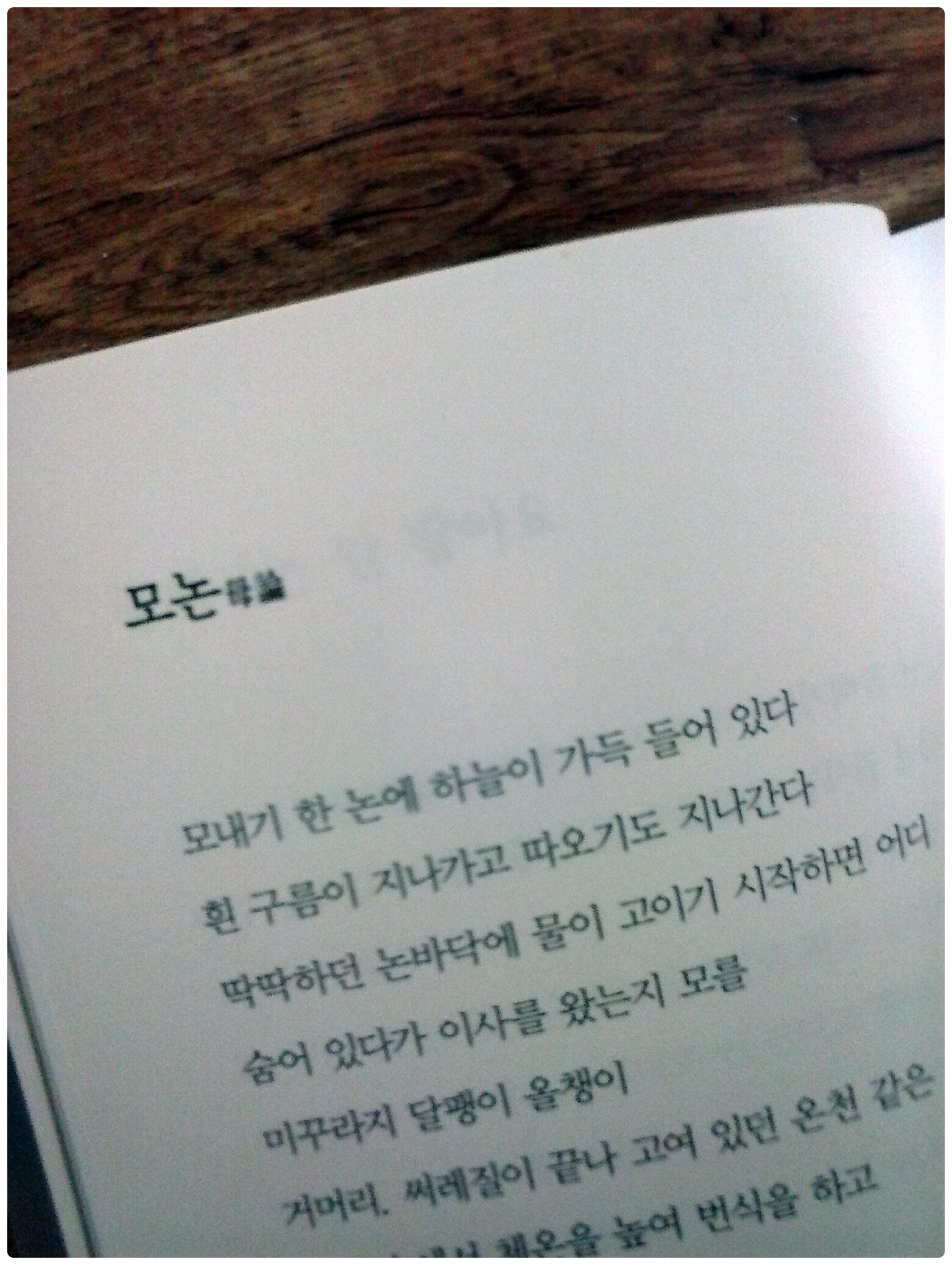
올 해는 설을 이유로 누구에게도 손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뒤늦게 생각나고, 뭘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걱정이 되지만, 일 년에 40kg의 쌀도 다 먹지 못하는 이상한 친구인 나를 친구로 둔 모논과 밭의 친구도 고요한 일요일에 사무치게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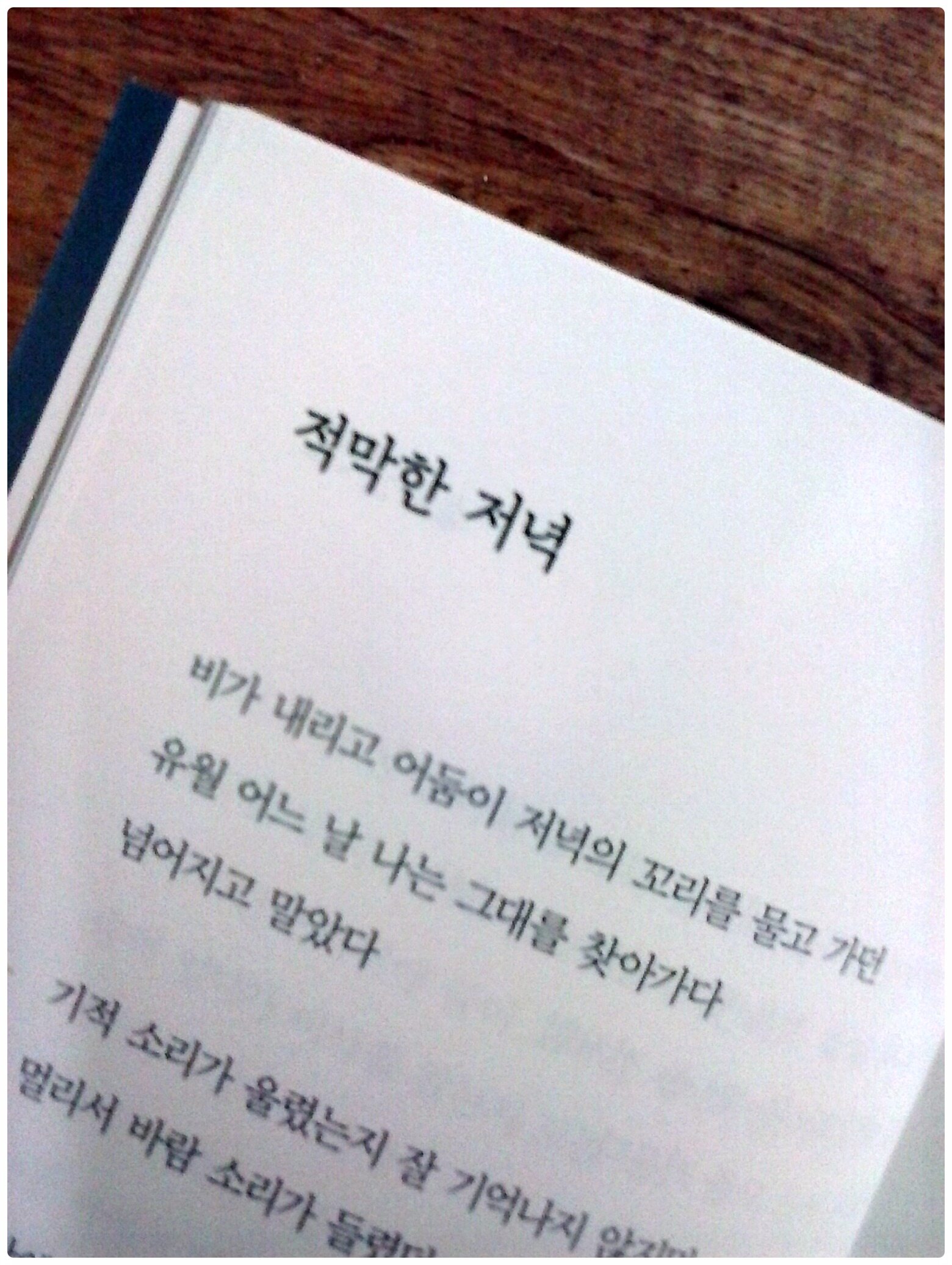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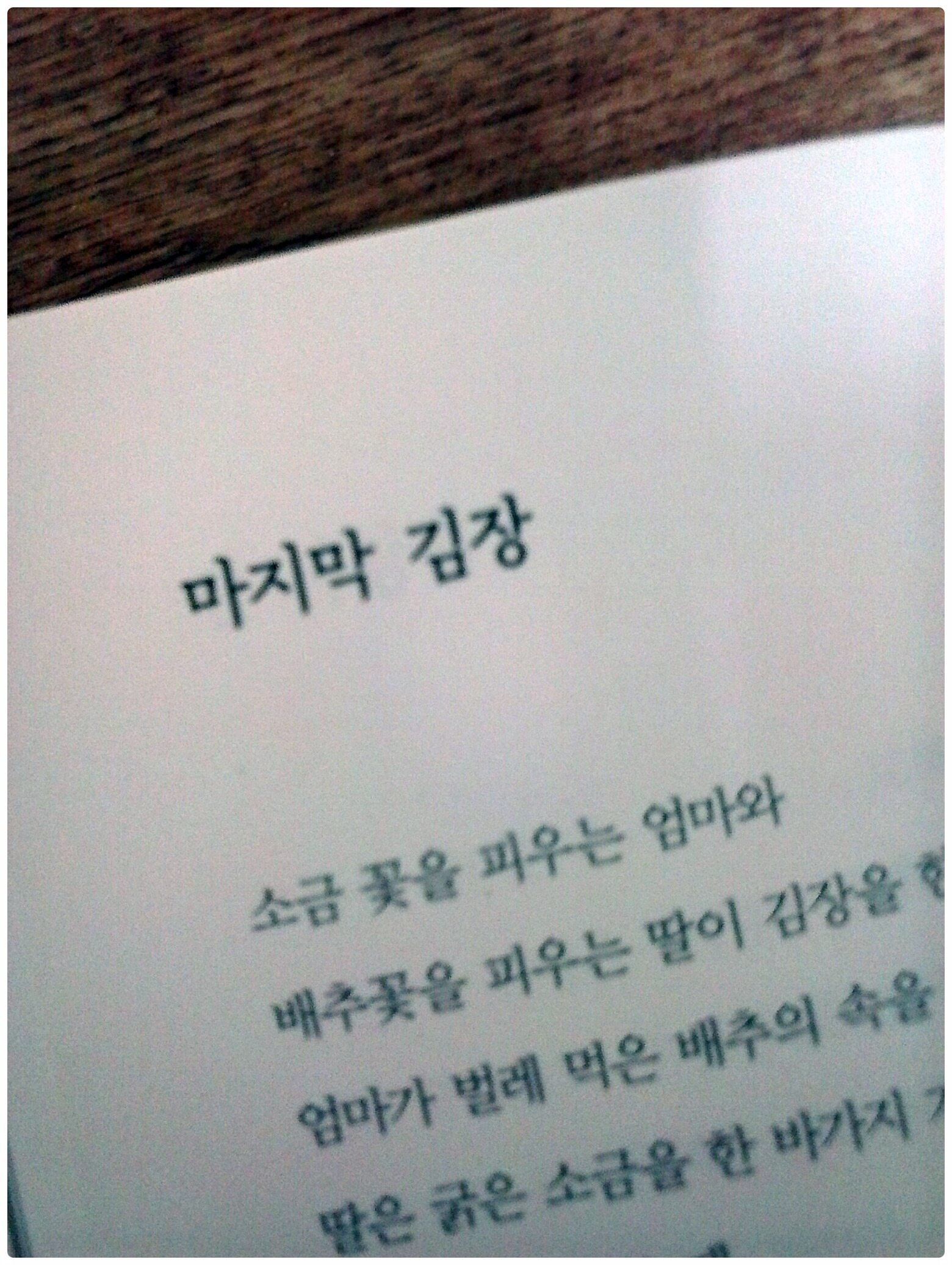
세 시까지 읽고 산책 가려했는데 어딘가에 걸려 넘어진 듯 마음이 주저앉았다. 저녁은 곧 올 것이고 대부분 그렇듯 일요일의 저녁은 초조함과 체념이 양념처럼 섞여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올 해 아버지와 된장을 담그신다고 메주를 구입하셨다는데 그건 왜 내 걱정이 되어버린걸까. 몇 살부터 인간은 마지막을 자꾸 떠올리며 살아가게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