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 번째 원고 ㅣ 두 번째 원고
함윤이 외 지음 / 사계절 / 2023년 1월
평점 :



처음 들을 때부터 제목이 무척 좋았다. 한방과 한탕주의에는 너그럽지만, ‘두 번째’나 기회나 재기나 회복에는 너그럽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단단하게 한 발 더 내 딛는 희망의 책처럼 느껴졌다.
캘린더주의, 달력에 표시된 기념일을 기념하며 사는 일이 지겨울 때도 많았는데, 올 해처럼 새해에 새해다운 기분이라곤 전무한 나와 주변 분위기라면 ‘새해’라서 다 같이 일단 으쌰으쌰 해보던 시간들이 무척 그립니다.
시간이 엉클어진 시절, 2022년 신춘문예 작가 5인을 2023년 설연휴에 읽기 시작하는 것도 묘하게 어울린다. 펀딩으로 먼저 만난 친구들의 인상적인 소개들을 기억하며, 내가 만날 이야기들이 궁금했다. ‘새봄’처럼 설레기를 바라며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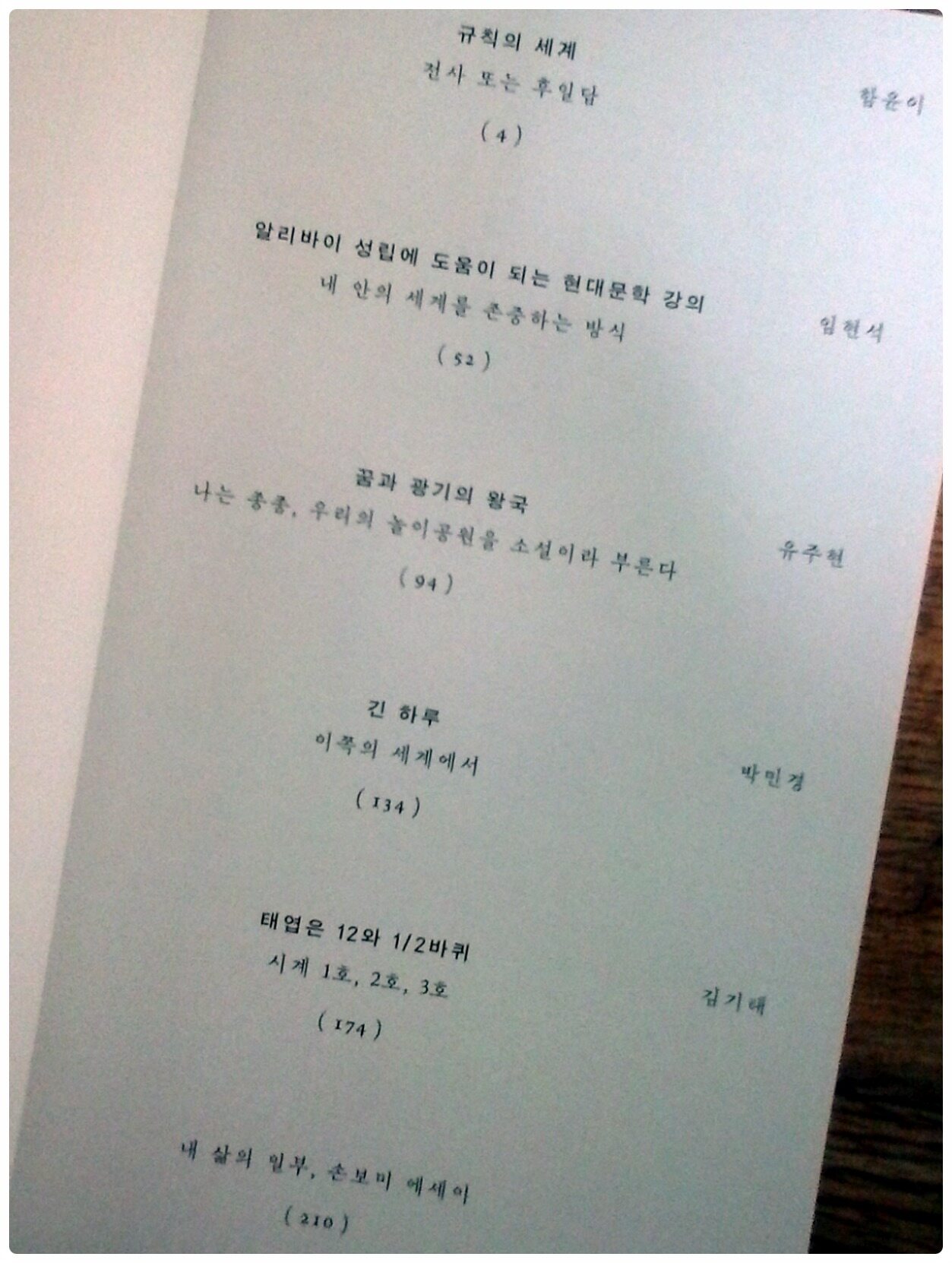
여러 번 표현했지만 (올 해는 처음) 어릴 적부터 책은 과자보다 더 좋은 포장된 종합선물상자다. 과자에 실망한 적은 많지만 책에 실망한 적은 거의 없다. 표지와 제목을 보고 짐작한 내용이 다 틀리면 더 좋다. 이 책도 그랬다.
“나는 종종, 우리의 놀이공원을 소설이라 부르곤 한다.”
단편은 지치지 않고도 음미할 수 있는 문학이라 늘 반갑고 조금은 만만(?)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자꾸 헷갈린다. 단편의 제목과 내용을 문해하려고 곱씹고 생각하는 시간이 읽는 시간보다 길어졌다. 만만해야 하는데 점점 큰 울림이 쿵쿵거렸다. 물론 그래서 즐거웠다.
기대하지 못했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 정말 아는 게 너무 없는 소재라 흥미진진하게 배우며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다. 한국 백반집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한 상을 가득 차려 주는 것처럼, 한국 작가들도 단편에 온갖 다채로움을 담아낸다는 애틋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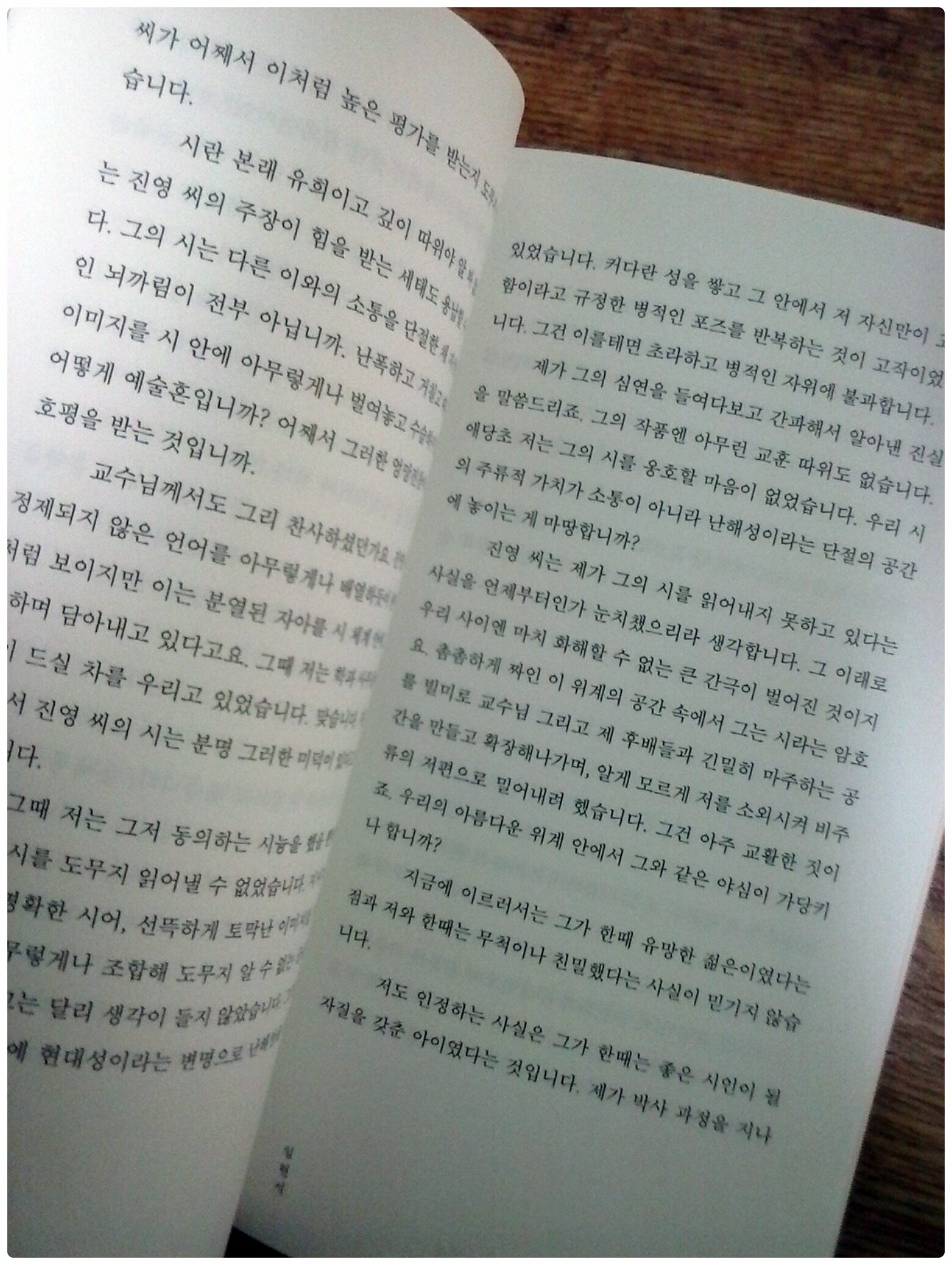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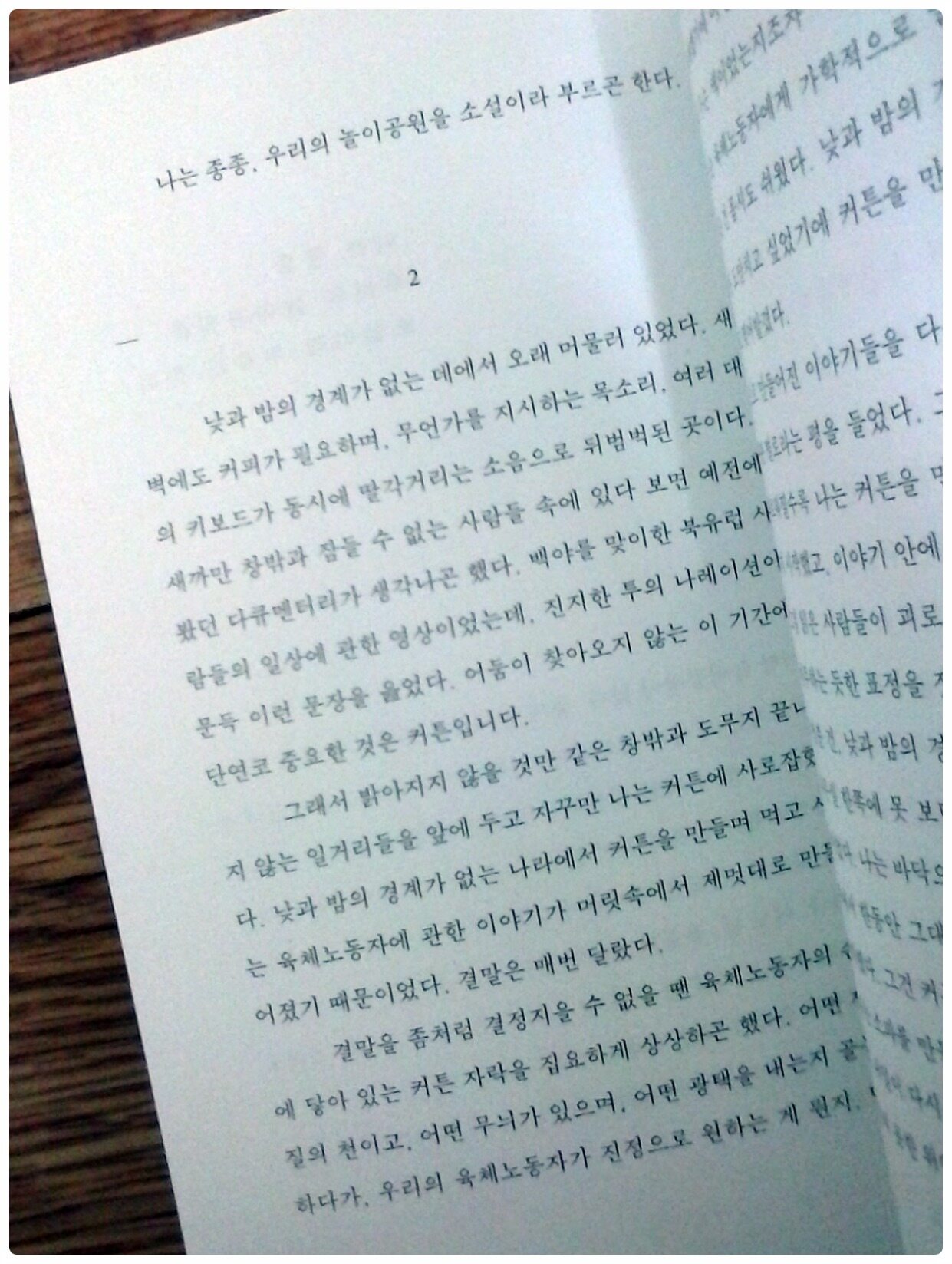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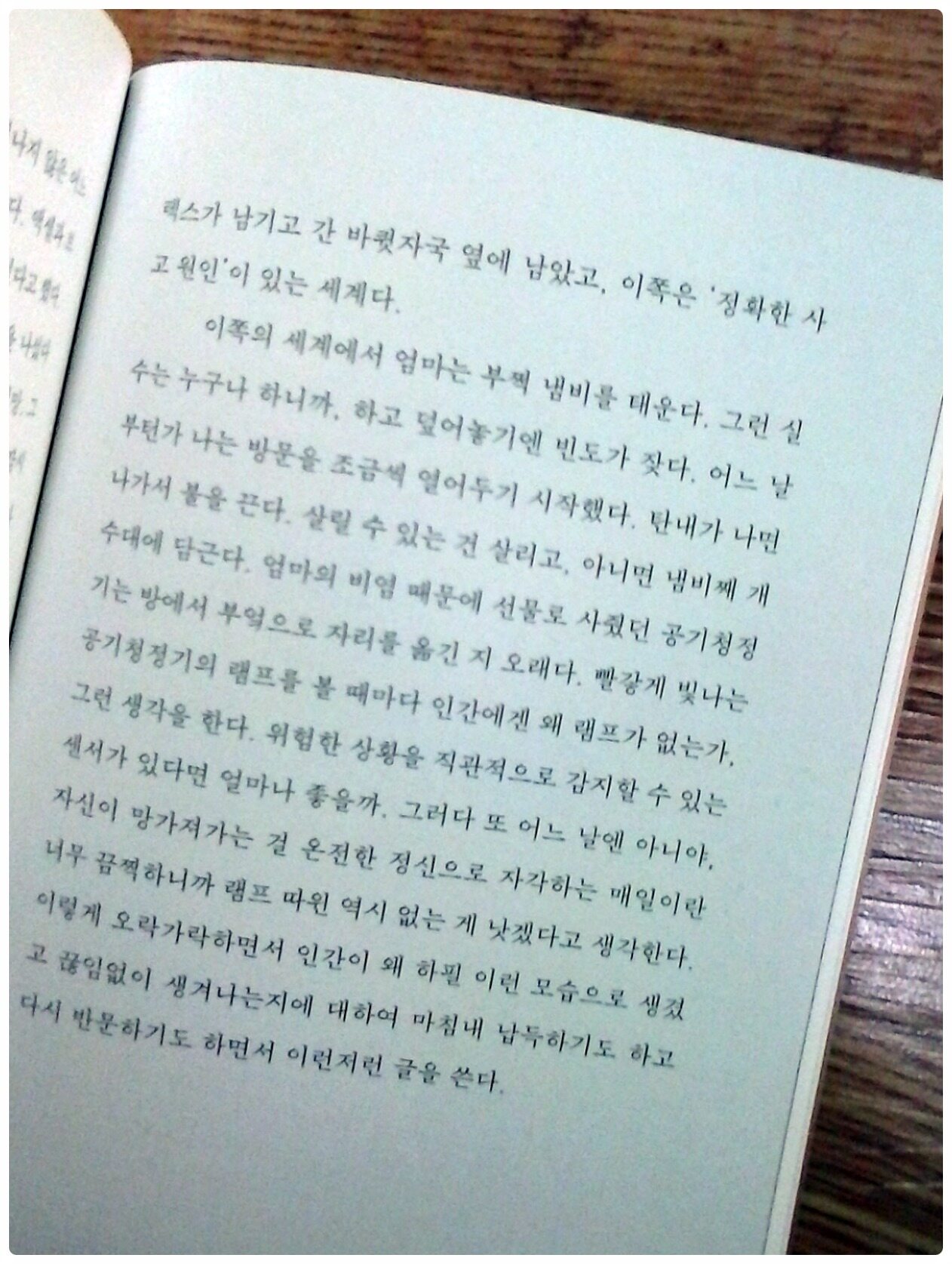
무척이나 강렬한 작품도 있었다. 내 속을 찔린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범죄 관련 없음 주의). 아무리 애써도 자기합리화란 자동기능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만다. 가끔 뇌가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데, 더 조심하며 반성능력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절박한 기분이 들었다.
너무 빨리 타인을 향해서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리하고 나의 시선과 해석 툴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일, 완벽하게 나를 구출하는 일의 무자비한 합리성은 곧 폭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제발 짜증도 좀 그만 내자. 노인이 되기 전에 꼭 어른이 되고 싶다.
‘하루’는 얼마만큼의 시간일까. 나는 긴 하루가 좋다. 너무 힘들어 숨이 턱턱 차오르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시간이 안 간다 지루하다 낮잠도 잤는데 아직 밝은 오후’, 그런 나른한 시간을 그리워한다. 매일이 너무 짧다. 숨만 쉬어도 곧 수명이 다 할 듯 시간감이 무서울 때도 있다.
[긴 하루]는 그런 심정을 몽땅 담아 보여준 작품이라 내 일기 같기도 하고, 예방주사를 맞은 얼얼한 기분이기도 했다. 계획을 짜고 여행을 떠나서 쉬는 일은 너무 많은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쉬자고 생각했는데, 떠나는 의식이 필요할 것도 같다. 장소가 바뀌면 내가 낯설어지고 그러면 나를 잘 들여다보고 느끼고 제대로 만날 수도 있을 테니까.
“내가 침대와 욕실 사이, 책상과 냉장고 사이를 오가는 동안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고 약속된 시간이 없어진다.”
여기저기 늘 마음에 쏙 들게 완벽하게 마감되지 않는, 어긋나는 삶을 추억 속의 괘종시계로 형상화한 작품도 특별했다. 괘종시계를 아는 신인 작가가 어색하지만 그것도 내 선입견이다. 단편들에서 만난 주제들이 삶을 구성하기도 망치기도 한다. 연작이 아니지만 삶 속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들이다.
“문학이란 인간됨을 가르치는 학문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