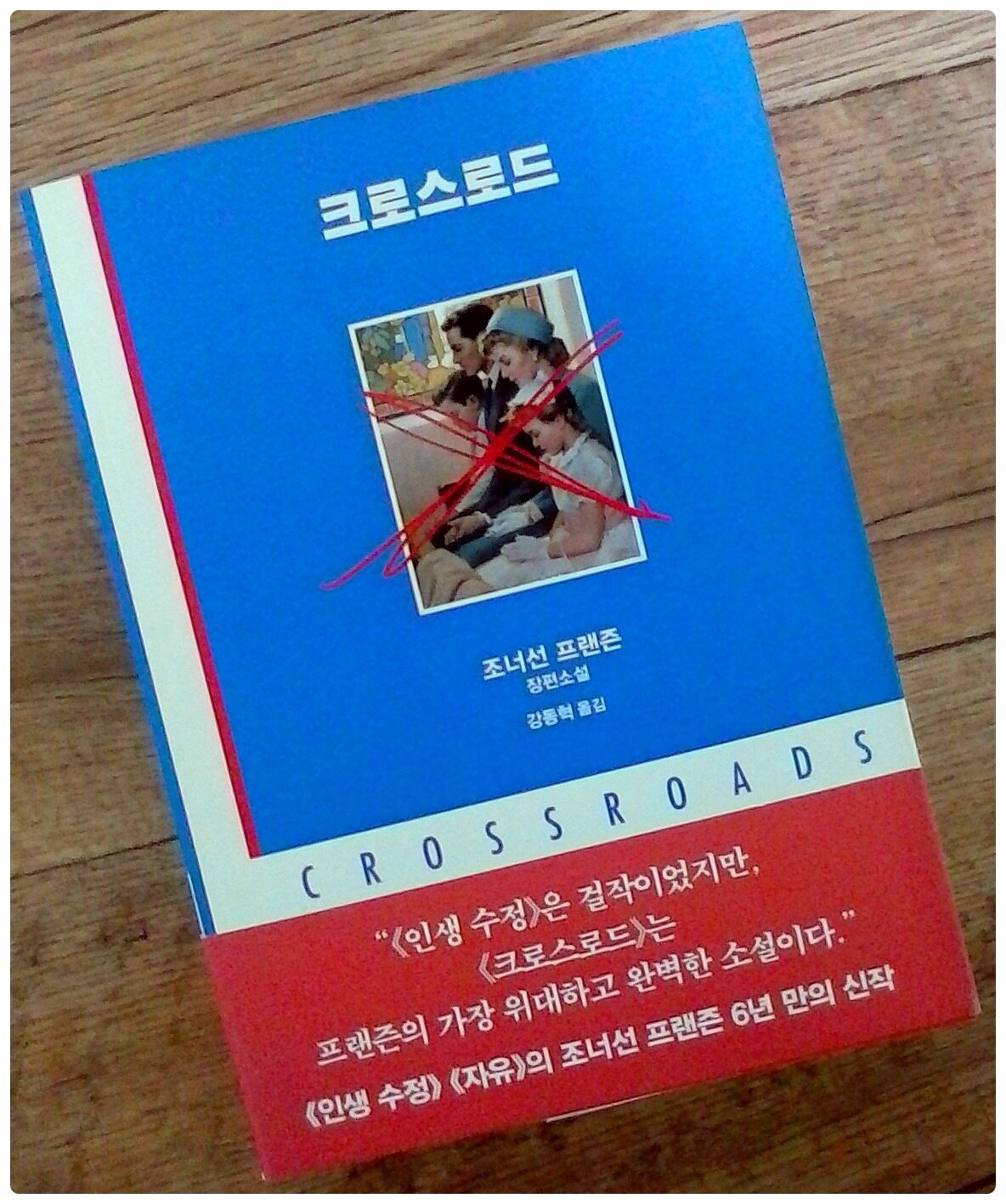-

-
크로스로드
조너선 프랜즌 지음, 강동혁 옮김 / 은행나무 / 2021년 11월
평점 : 


‘1971년 미국의 가상 마을’ 얼마 전만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시도를 안 했겠지만, 한차례 엉덩이 독서의 힘이 조금 쌓였다. 1970년대가 크게 낯설지 않다. 북클럽에서 <유한계급론>을 읽고 있는데 120년 전 출간한 책에도 현대 사회를 지적하는 듯한 문장들이 가득하다.
먼저 읽은 친구들이 <자유>보다 더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를 높였다. 10월의 첫 주말이 하루 더 길어서 여유로운 독서를 즐겼다. 확실히 인간관계 내의 긴장감이 더 크다. 페리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내 친구의 아버지와 놀랍도록 유사해서 다 잊고 살다 몹시 씁쓸했다.
붕괴에 다다른 아슬아슬한 상태의 가족 구성원들의 심상을 이렇게 깊이 내려다보는 일은 나는 경험도 짐작도 못할 고역일 것이다. 더구나 그 원인을 ‘본능’ 등에서 찾지 않고 ‘사회적’ 원인들과 치밀하게 연결해서 따져보는 저자의 지성이 심해처럼 거대하다.
인종 차별, 전쟁, 청소년 문제, 마약 범죄, 빈곤, 결핍, 여성 문제 등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읽고 고민했을까. 이런 노역은 저자가 자신의 세계, 미국사회, 인간에 대해 그만큼의 깊은 애정을 가진다는 뜻이 아닐까, 그 정도의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이다.
싸움을 거의 하지 않고(못하고), 갈등 상황을 불편해하는 겁쟁이지만, 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각자의 절박한 이유로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들이 저자가 투영한 확실한 희망의 여지로 느껴진다. 형태가 무엇이건 여전히 소통할 의사가 분명하다는 의미 같기도 하다.
어쩌면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 이런 싸움을 통과의례처럼 더 진지하게 했어야 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래야 진짜 성장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른답지 못한 나를 돌아보며 하는 자책과 회한이 커서 그런지도. 혹은 오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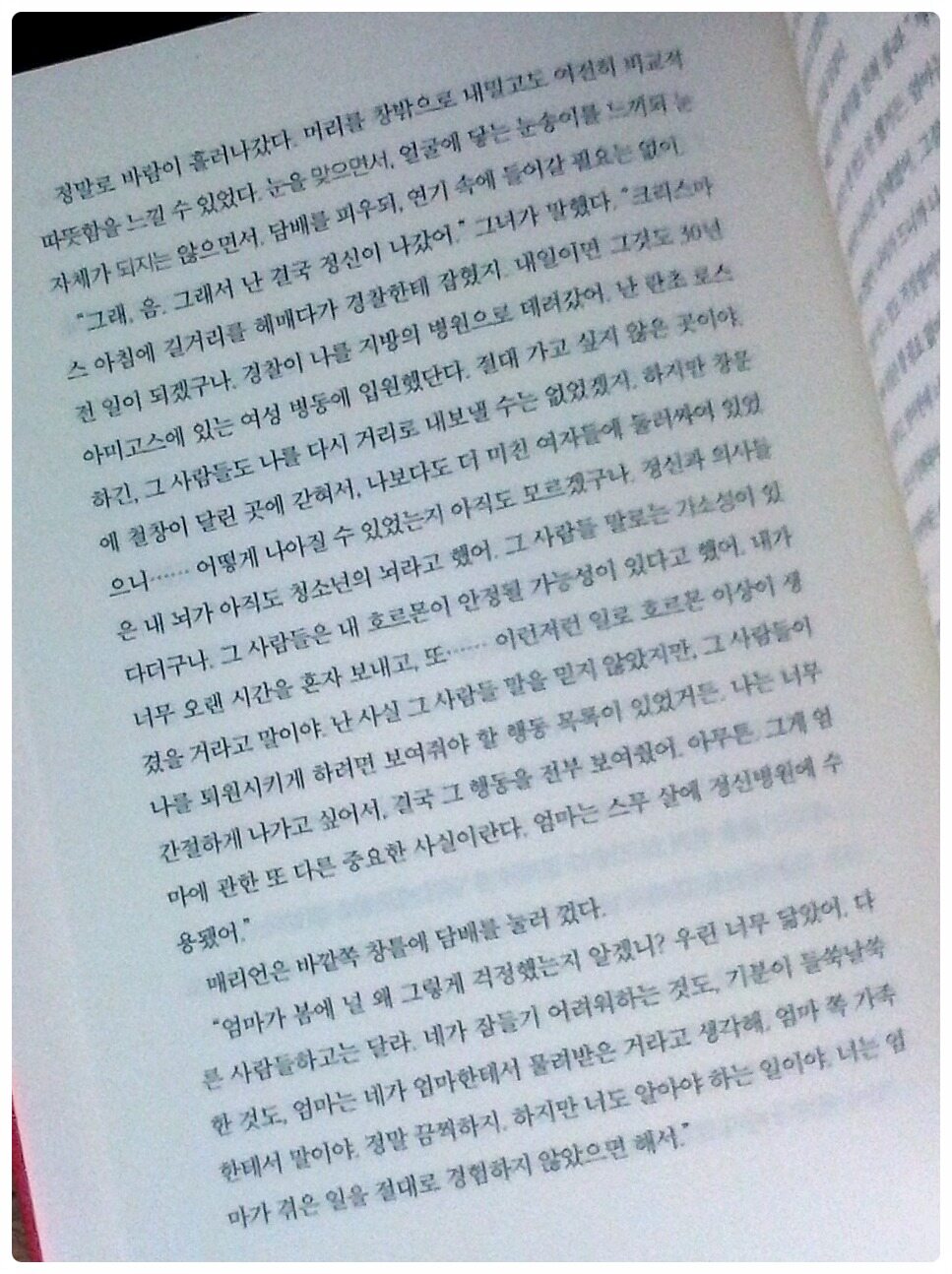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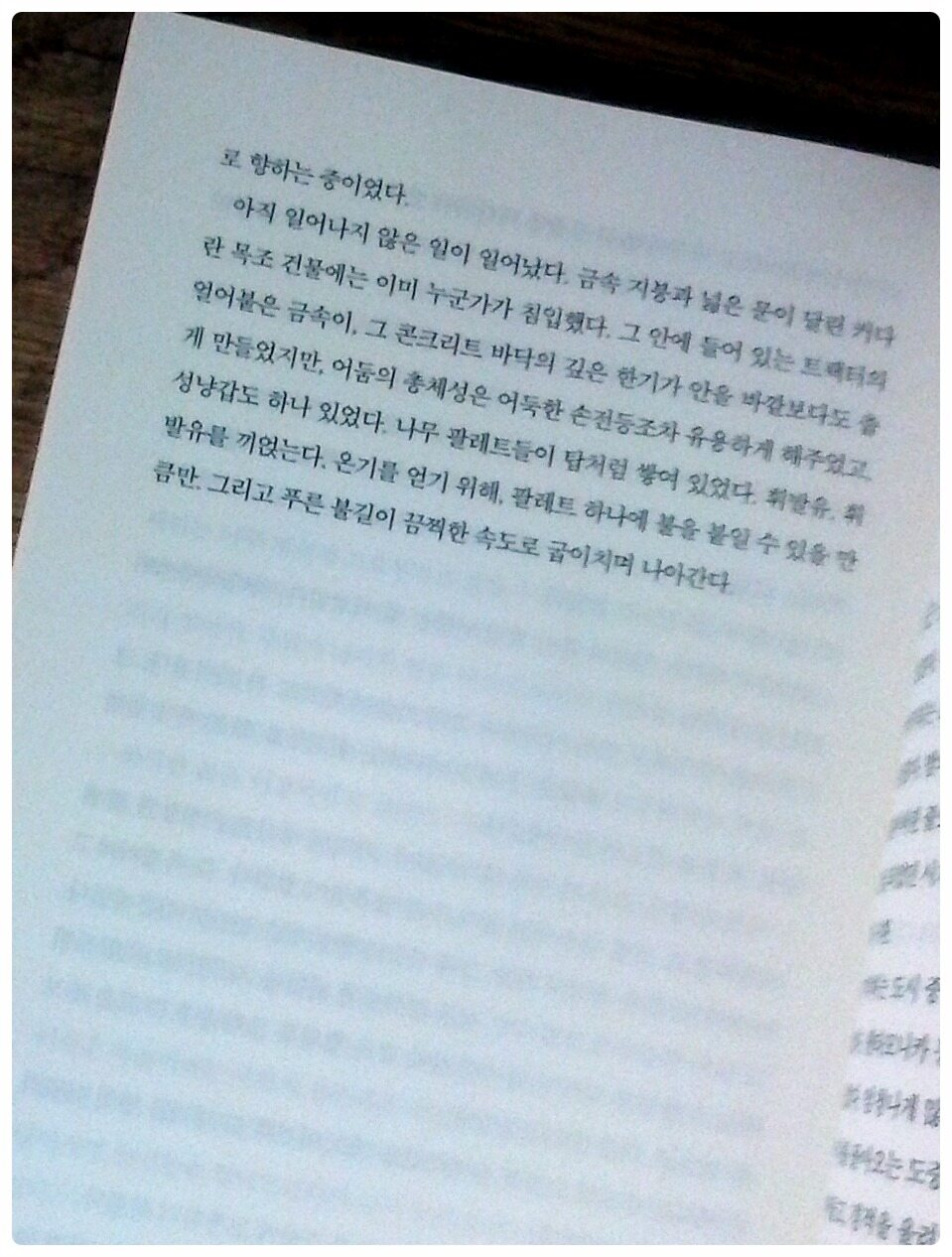
등장인물들 중 누구에게 가장 친밀하게 이입해서 이 세계에 머물다 갈까 몰입해보는 것도 즐거웠다. 인물과 사건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면 해당 이미지들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 상상력이 좀 더 좋았다면 가상현실처럼 대단한 체험을 했을 것이다.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 TV 화면에서 경기 내용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독자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미디어를 찾아 볼 수 있고, 더 이상 한 나라 다른 나라의 일일 수만은 없는, 세계가 얽힌 방식을 조금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1970년대 미국 사회의 한 가정의 가족들’을 다룬 이 소설이 그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비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던 드넓은 하늘’ 그 아래에서 펼쳐진 모든 이야기 밭을 빠져나와 본 지금, 여기의 현실이 몹시 어둡다. 그들은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다.
“우린 광산을 막아달라고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 우린 성스러운 땅에 발전소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았어. ‘미안합니다’라고 하더군. 그러더니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그놈들은 백인 동네를 구하는 데만 신경 쓸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