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지음, 이영란 감수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0년 7월
평점 :



이제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 걱정이 무의미하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가까운 이들과 서로의 짐을 나누며 의지하며 살아갈 밖에. 어리고 어리석을 적 게으른 포기처럼 보여 말없이 경멸했던 풍경이 내 여생이 될 듯하다. 그 시시한 삶마저 무기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의 양보다 훨씬 많이 소비하고 있다. 지구가 줄 수 있는 양이 1이라면 매년 1.75를 사용한다. 그 부족분은 지구로부터 앞당겨 빌리고 있던 셈이다. 슬픈 사실은 지구는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지구가 자원을 더 빌려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다.”
기막히고 막막한 것은 별일 없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해결이 꿈이라고 하는 저자의 빛나는 책을 2년 만에 다시 읽었다. 그래도 2년 전엔 기다림도 희망도 있어서 주제에 집중했는데, 이젠 시간도 여력도 사라지고 ‘꿈’이라는 단어조차 눈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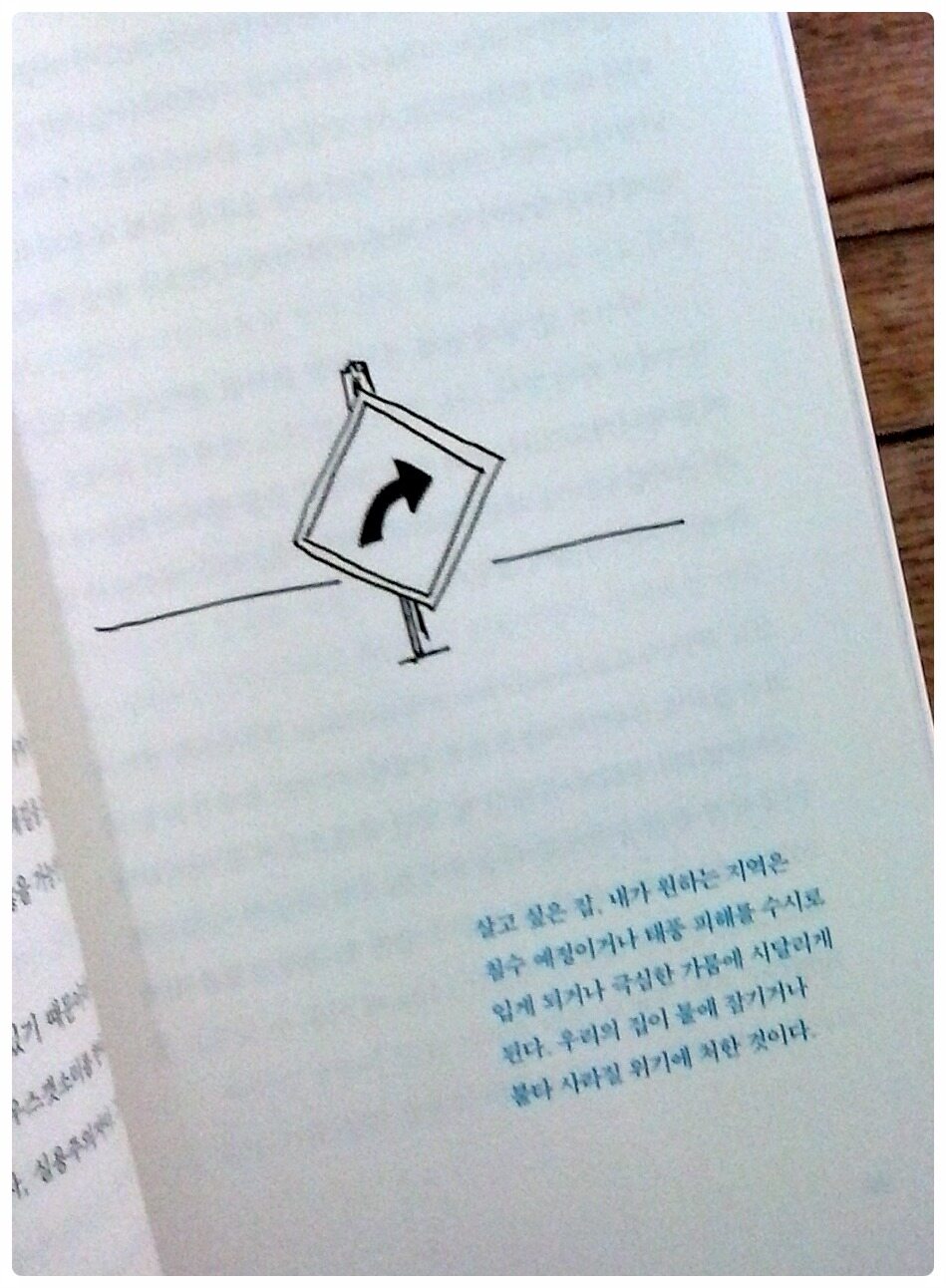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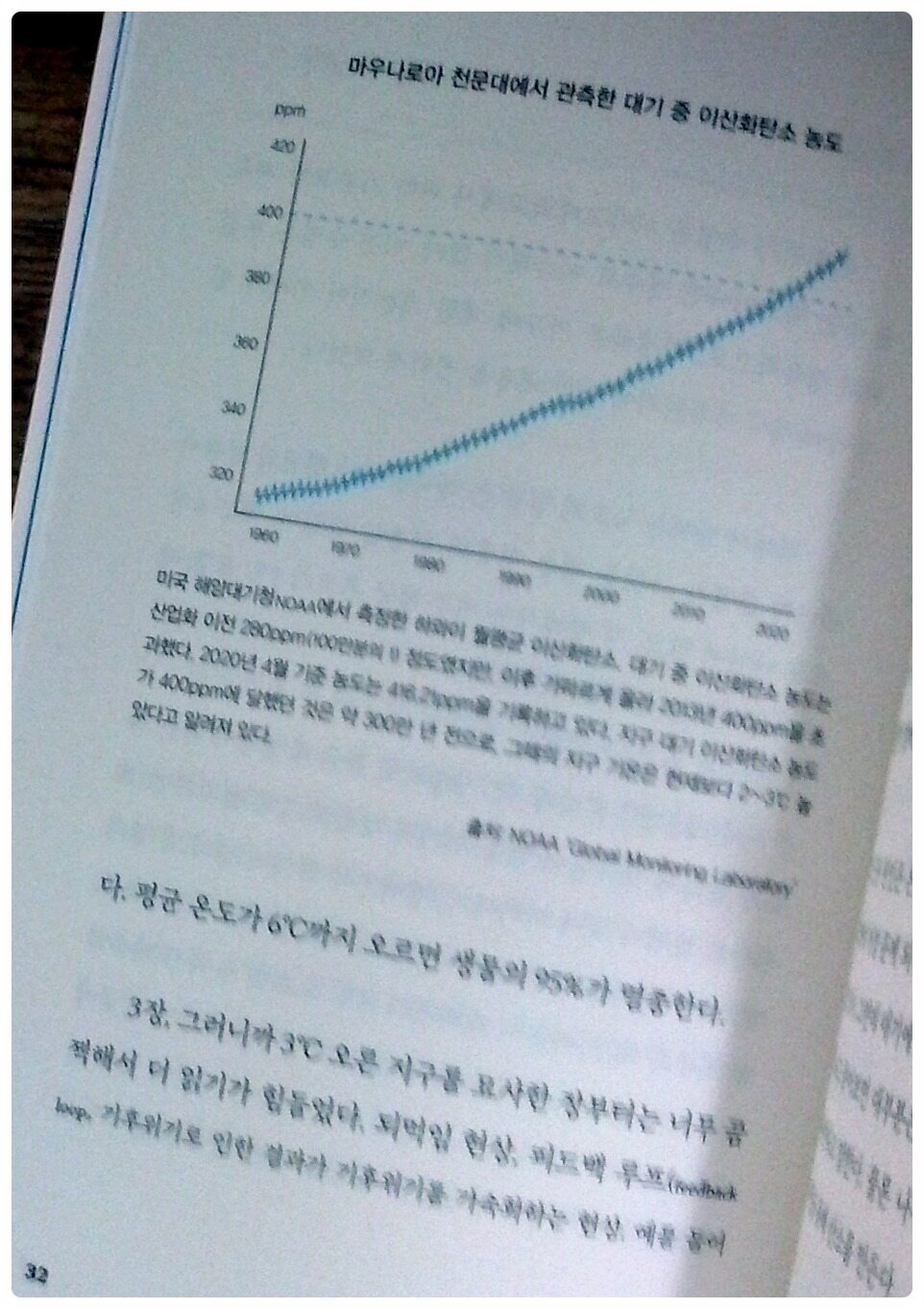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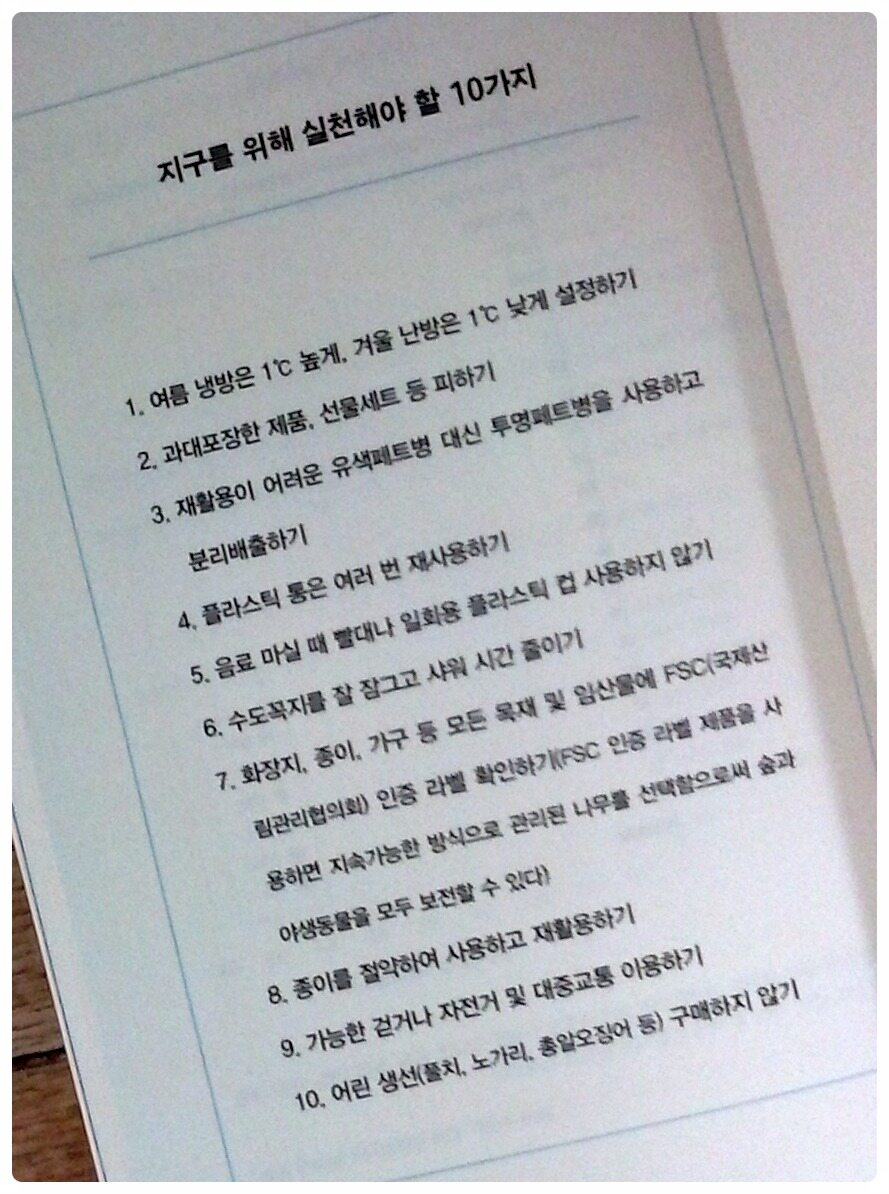
“우리 존재, 우리가 만든 모든 문명은 자연 안에 있기에 자연의 질병은 반드시 인류의 파멸로 돌아온다. 자연은 ‘공존’을 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살펴야 할 우리의 보금자리이다.”
오늘 여기 기록은 모두 내 변명이다. 내 것도 우리 것도 아닌 거대담론에 홀렸다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이들끼리 어울려 살다가... 제 세계의 경계가 늘어나니 감당을 못하고 화만 내다 지친... 줄곧 뭐든... 이론이든 실천이든 희생이든 부족했던 삶에 대한 변명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서 본래 자연이 익숙하고 가장 편하지만, 도시에서 인공 환경 속에 포육되며 사람 사이를 비집고 다니다가 자연과의 연은 끊어진다. 양동이에 갇힌 개구리가 좀비가 된 것처럼, 자연을 잊은 우리도 괴물이 되어 사는 듯하다.”
제 갈 길을 멈춤 없이 가는 삶을 어디서 어떻게 붙잡아 멱살이라도 잡고 왜 이 모양이냐고 따져 물을 수는 없다. 그러니 속에 얹힌 것처럼 들어찬 이 답답한 것이나 뱉던지 토하던지 삼키던지 하고 싶다. 태풍이 다가온다. 덥다. 어떻게들 대비하고 계실까...
“지구에 빌린 것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어디로 쫓겨날 곳이 없어 목숨으로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가 갇혀 사는 박스를 정리하고 쓸고 닦고,
느긋하게 먹고 마시고 머물며...
함께 갇힌 국화꽃들이 하나둘 피어나는 것을 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