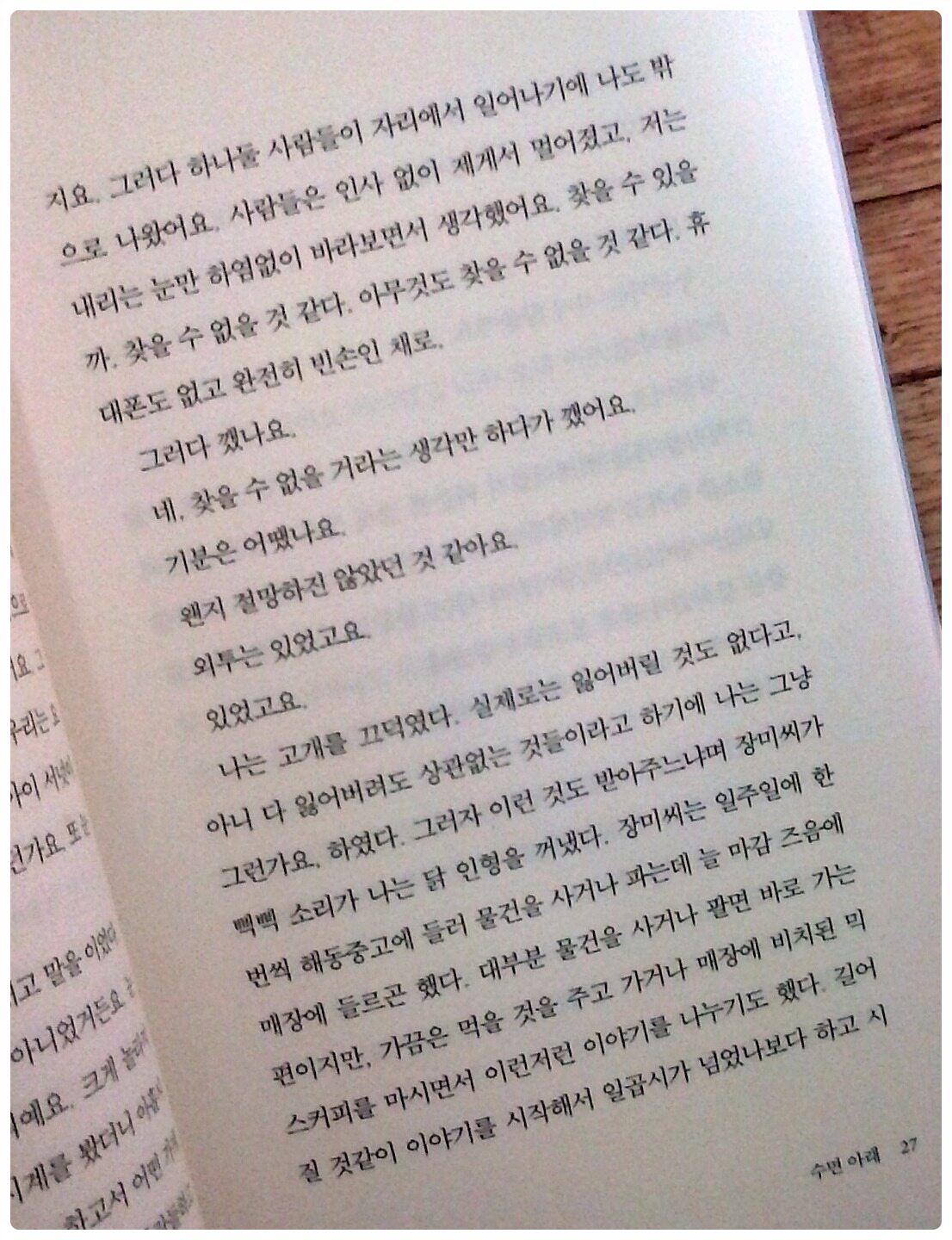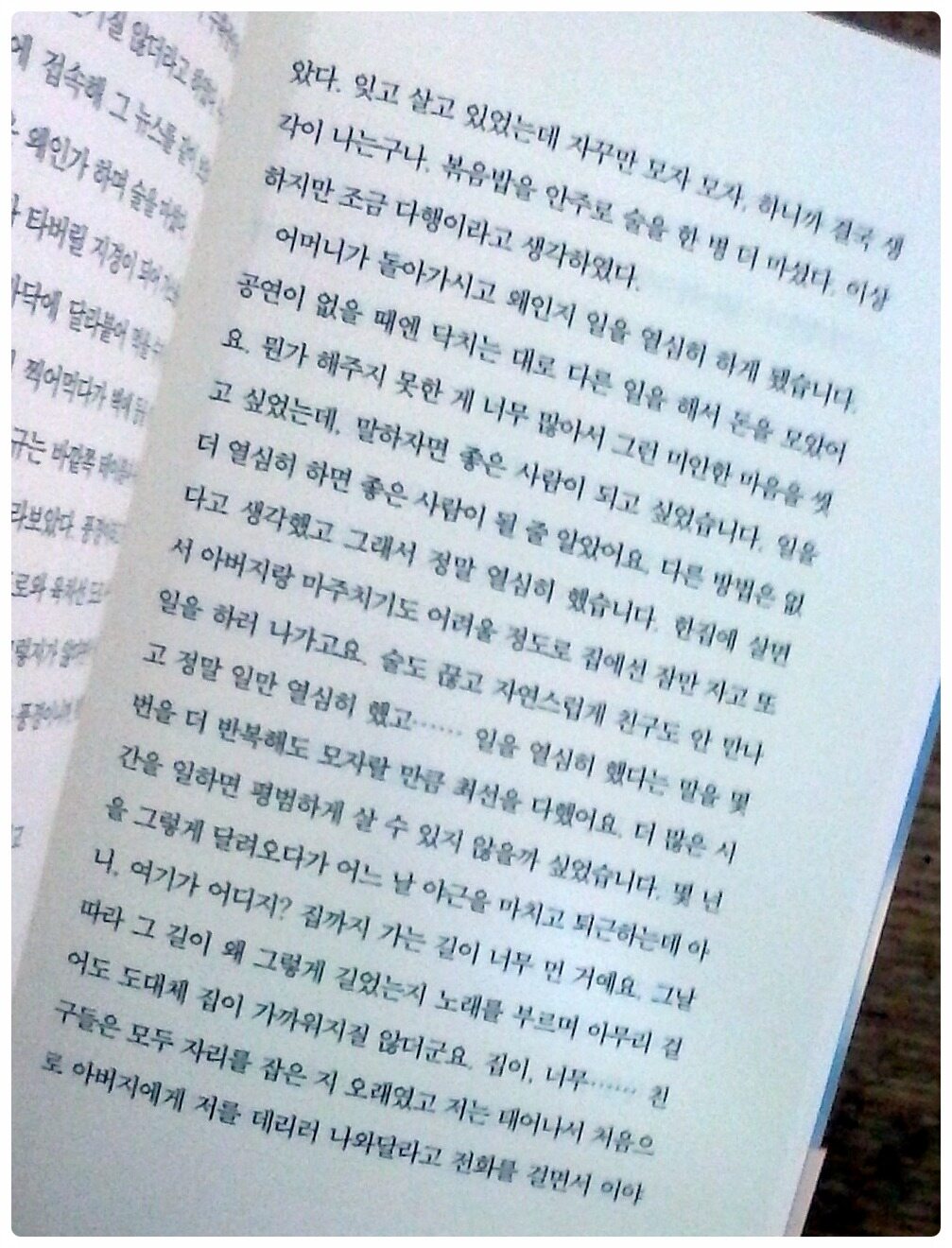-

-
수면 아래
이주란 지음 / 문학동네 / 2022년 8월
평점 :



아이를 잃은 부모의 상태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을 결국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토록 잔인한 경험은 없다. 가족이 사라지고 결혼이 무화되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모른 척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생존자들의 결단처럼 느껴져서 다행이고도 내내 아팠다.
“요즘 나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만 자유로워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냥, 난 우리가 괜찮았으면 좋겠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순간에, 정말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 작품은 이야기의 밀도가 다르다. 왜 수면 아래라고 했는지 그 무게감과 둔중함이 이해되었다. 멈출 수 없었던 눈물 아래에 잠겼다 떠오르는 것만 같다. 천천히 조금씩 일렁이듯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가본다... 함께 울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작품이다.
누구도 죄인처럼 살지 말고, 아파서 힘이 없어도 일상에서 더 자주 웃게 되길 바란다. 오늘도 현실의 도피처로 찾아간 문학 작품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란 일상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다시 만났다. 그래서 모든 문장이 눈물이기도 하고 결기이기도 하다.
“그리운 것은 어쩌면 고마운 것과 닮아 있구나 생각했다.”
나의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 무겁도록 마음을 담아 건네준 호의와 애정과 배려를 잘 몰라서 충분한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지나버린 시간들이 적지 않게 생각난다. 그분들이 그때도 나의 모자란 면을 이미 다 아셔서 크게 섭섭하지 않으셨다면 좋겠다.
세상엔 공짜도 용서도 없다. 그때 나의 부족함이 나이 들수록 아프고 안타까운 감정으로 제 형태를 분명하게 갖춘다. 작품의 분위기가 문득 숨을 몰아쉬어야할 만큼 차분하고 한결같은 이들에게서 비롯되니, 나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더라면... 회환이 짙다.
“나는 우리가 모르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 너무 두려웠는데 모르겠다고 말하면 두려움이 조금 옅어지곤 했던 것 같아. 그런 채로 살아왔고 이런 채로 살 것 같아.”
나는... 이제 좀 달리 살고 싶다. 의지적 결심이라기 보단 내게 찾아온 내적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다. 퇴직과 고령을 준비해야하는 나이기도 하고, 화를 내는 일도 그만 두고 싶고, 무언가의 전복을 바라더라도 놀이처럼 진행되어야... 견디며 살겠다 싶다.
무엇보다 긴장과 울화를 계속 담아두기에는 몸이 아프고 정신이 혼탁하다. 안달복달한다고 뭐가 바뀌지도 않고, 혼자 질주해서 될 일 따위는 없다. 어리석은 열기와 태도이다. 새삼스럽지만 한번 뿐인 삶인데 한결같이 오래도록 가치와 대의에 매진하는 분들이 존경스럽다.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운 좋게도 훈련과 명상 같은 책을 만났다. 제목처럼 나도 심연으로 깊게 가라앉았다가 머물며 호흡을 고르고 바닥의 풍경을 보고 천천히 부상하고 싶다.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은 고래로 탄생의 의미도 있지 않은가. 참 감사한 ‘젊은 작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