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가올 날들을 위한 안내서
요아브 블룸 지음, 강동혁 옮김 / 푸른숲 / 2022년 7월
평점 :



추리나 미스터리 작품의 감상글은 조심스럽다. 작가가 고심한 설정들을 섣불리 노출시켜 망치거나 세계관을 오독해서 잘못된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다 알아차리지 못해서 의문은 이어지고, 문득 의아한 생각이 길게 이어진다. 물론 끝까지 읽으면 페이지들이 연결되고 합체되는 결말에 이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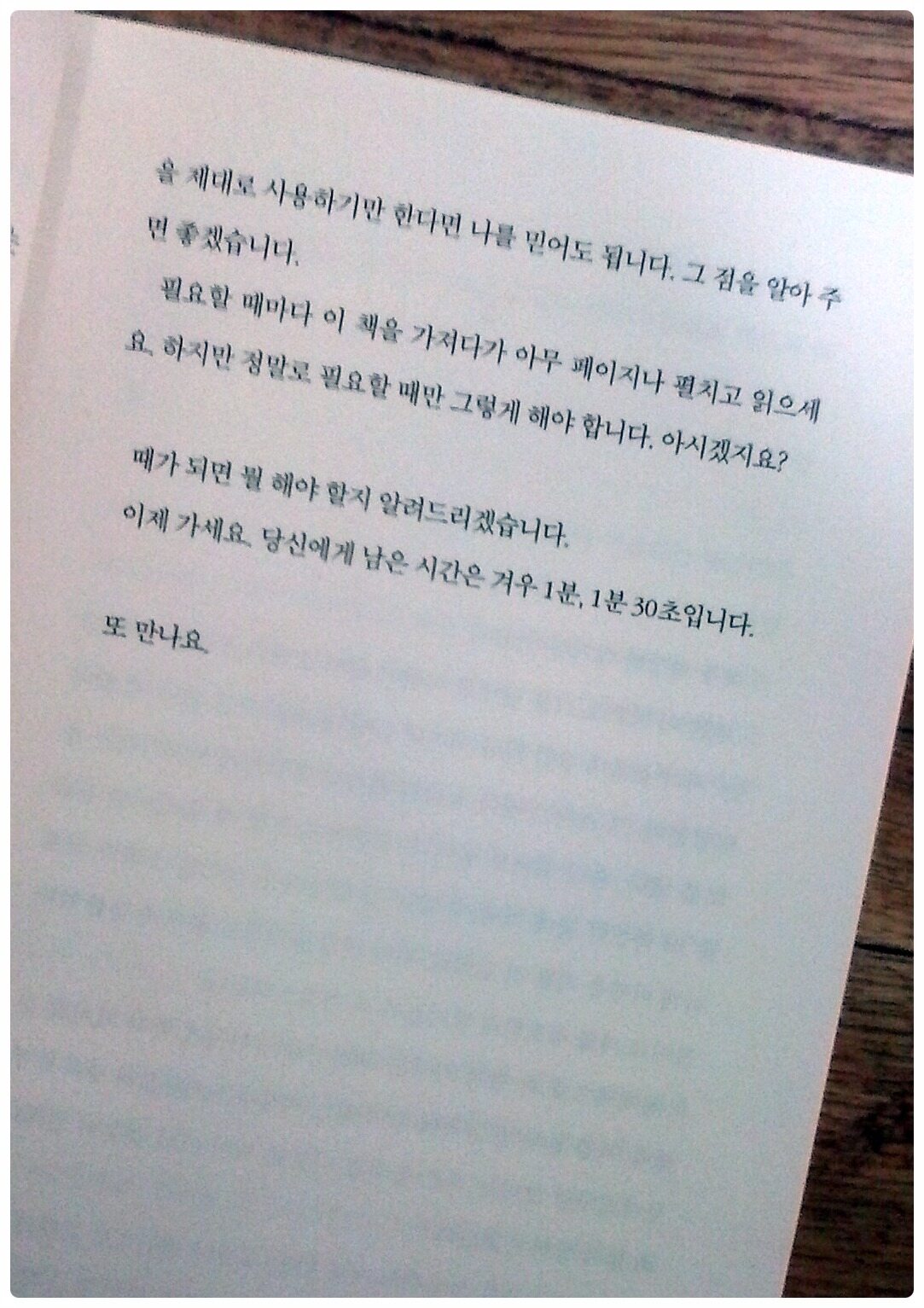
얼핏 범죄물인가 싶게 무서운 장면이 등장하지만 ‘안내서’가 등장하면서 안심이 된다. 주인공 벤은 믿기지 않는 것도 일단 믿고 시키는 대로 하는 캐릭터라 덕분에 전개가 빠르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어제의 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전의 그 벤과 말입니다. 어쨌건, 최소한 당신 안의 널빤지 하나는 그때 이후로 교체되었는걸요.”
우연히 상속 받은 위스키가 희귀해서 가치가 크다면? 경매라도 시도해볼 것 같은데... 욕심이 과한 스테판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마시기보단 판매가 더 합리적일 거란 생각은 어쩔 수가 없다.
스테판이 세상을 증오하는 이유를 읽으며, SNS 허세라는 주제의 글을 지난주에 읽은 것이 기억났다. 의식주를 자랑하는 이들을 팔로우하지 않아 모를 일이지만, 나만 빼곤 다른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세상에 화가 날 것도 같다. 그 세상이 허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책 속의 책 혹은 두 권의 책을 번갈아, 연작처럼 읽은 기분이다. 간혹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것도 재미있다. 장르 문학의 장점은 결론에 이르면 혼란이 수렴된다는 점이니까. 정성스럽게 숨겨둔 비밀을 나만 알게 된 느낌도 나쁘지는 않다.
“모든 책은 암호를 해독하는 암호다. 책이 암호인 이유는 아무도 그 책이 쓰인 방식대로 정확하게 그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조금씩 다르게 읽는다.”
휴가라서 심정적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어떤 책을 만나도 본질적인 오래된 답이 없는 질문으로 돌아간다. 멍하니 사유의 여정을 더듬어간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러 꿈을 꾸었고, 바람을 가졌고, 상상을 즐겼고... 그 모든 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단 하나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책처럼 단 한 작품으로 수렴되는 것이 삶이다.
작가처럼 우리 모두 삶의 계획을 세우고 비밀을 갖게 되고 실패를 거듭하고 무기력에 힘들어하고 의미나 가치를 상실하기도 하고. 생각을 더해본다. ‘위스키와 안내서’와 같은 일들이 현실의 우리에게도 있었을지 모른다. 위스키와 책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어쩌면 사람의 형태로.
“꿈이 곁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애써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되자,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가 문득 명료해졌다. 다른 모든 계획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었다.”
아름답고 두꺼워서 마음에 든 책, 금방 읽혀서 좋고도 서운한 책이다. 처음 만난 이스라엘 작가의 작품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라서인가, 소설도 마치 코드를 짜듯 설정이 정교하다.
“작은 거짓말과 조작이라는 구멍들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지요.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가끔은 무언가가 봉합되고, 가끔은 찢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제 위스키를 맛보며 책의 여운을 더 느껴볼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