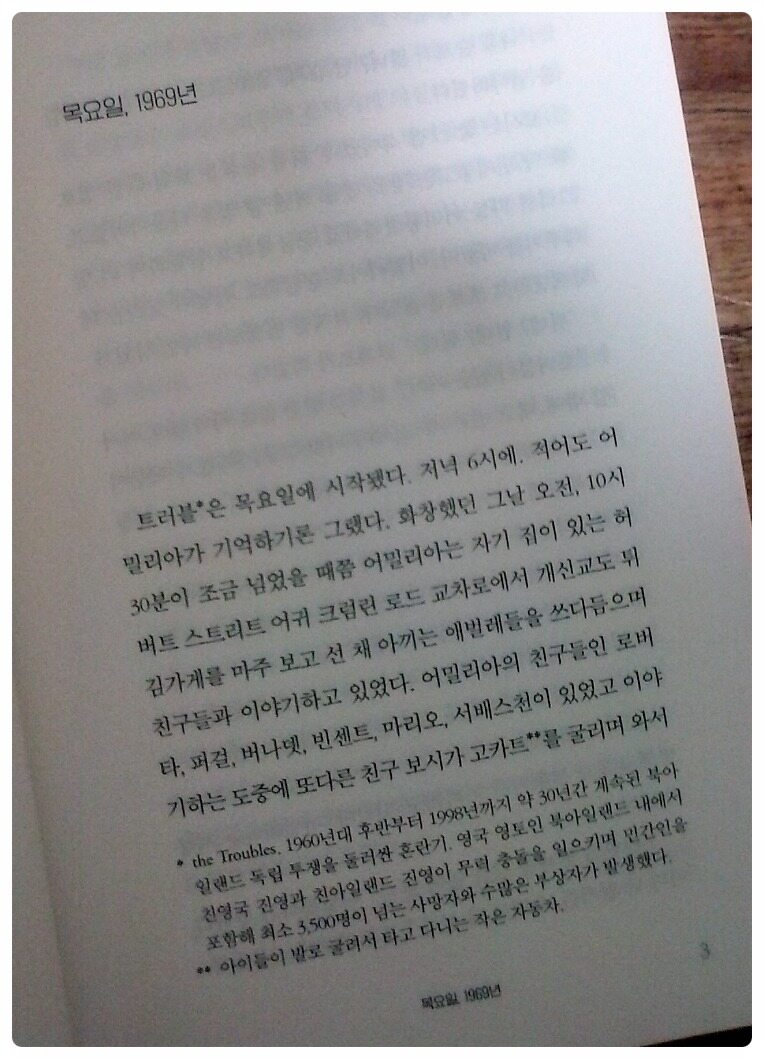-

-
노 본스
애나 번스 지음, 홍한별 옮김 / 창비 / 2022년 6월
평점 :



이 작품을 조금이라도 덜 오독하기 위해 명칭 정도만 알던 북아일랜드 전쟁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 읽으며 중복되는 내용들이 요약으로 기억에 남기를 바랐다. <노 본스>는 귀가 아플 정도로 쾅쾅 울리는 질문들을 던진다.
“모든 일이, 언제나 그렇듯, 그다음의, 새로운, 과격한 죽음에 묻혔다.”
- 일상이 왜 사투여야 하는지 묻는다.
- 폭력의 무게는 왜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 가장 무겁게 내려앉는지 묻는다.
[The Troubles]는 시작되었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잔혹 호러 작품을 읽는 것인지, 정신이 너덜거리는 건 참상을 겪는 그곳의 사람들인지 여기의 나인지 판단이 몽롱해졌다. 손가락을 뻗어 읽고 있는 것이 거친 망상이 아니라 작가가 기록한 상황이라는 것을 문득 확인했다.
폭력이 난무하고 지속되자 사람들 속에서 죄책감이 죽어 사라졌다. 근력의 차이가 삶도 죽음도 관재했다. 힘이 약한 존재들에겐 가차 없는 폭력이 쏟아져 내렸다. 법도 도덕도 윤리도 설득력이 없는 상황에서 독자만이 기막혀 숨이 멈춘다.
“그 아래 노란색 걸레에 싸인 조그만 덩어리가 있었다. 아기 머리의 일부였다. 그때 곤죽 덩어리 속에 오리발처럼 생긴 오그라진 발이 보였다. 가운데는 검은색 탯줄이 있었다.”
구병모 작가의 경고가 이제야 붉게 제 빛을 찾아 머릿속에서 울린다. “쌀알만한 평화도 없는 세계에서, 머리가 울리고 영혼은 옥수수처럼 털릴 테니까.”
어른들이 망가지고 미쳐가니 보호자 노릇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아이들은 그런 어른을 보고 따라하며 농도가 진해진 잔인함을 체득한다. 나는 이 전장에서 발을 옮길 곳이 없다.
미나가 간청했다. "좀 도와줘"
대개는 현실에서 달아나기 위해 책 속으로 도피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인데... 이 책에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진창이 된 기분을 현실로나마 빼내어 올 수밖에 없다.
“사물이나 사람은 네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체되지 않아. (...) 좋아하든 아니든 삶은 계속되고, 사실 등 돌리고 떠나는 건 너 자신일 때가 많잖아.”
현실에서도 학살과 전쟁이 진행 중이다. 전해들은 내용만으로도 참혹함이 덜하지 않다. 눈 감고 사는 와중에도 내 무탈함과 태연함이 소름끼치는 순간들이 없지 않다. 미소와 인사와 함께 나누었던 인간애에 대한 발언이 모두 거짓이 아니라면 멈추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 안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약한 이들이 죽어 나가고, 함께 사는 세상을 가장 확실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려는 듯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사인은 아사 - 굶어 죽었음.
“만약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정신이 팔려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뿔에서 아동 사망이 폭발할 것.” 유엔아동기금
인간의 섭식이란 다른 존재의 생명을 끊고 마는 방식이지만 - 채식이라 하더라도 - 오늘 걸어 지나온 길의 푹푹 고아내는 누군가의 살과 뼈 냄새에 속이 뒤집히려했다. 육식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길러 죽인 인간의 현재 방식이 잔혹하기 그지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도 인간보다 약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 힘의 논리는 인간 사이에도 인간과 다른 생물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슬프다. 슬프다.
“No bones about it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