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 이름은 어디에
재클린 부블리츠 지음, 송섬별 옮김 / 밝은세상 / 2022년 5월
평점 :

절판

장르의 매력과 재미는 긴장 상태로 단서를 따라가며 각자의 분석과 추리를 즐기다가 반전에 놀라고 결말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내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니 작가가 미리 경고한 대로 ‘다른’ 종류의 작품이다.
여성 서사는 현실에서도 작품 속에서도 불안하다. 언제 근육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될지 모를 일이라서. 시작부터 여성의 죽음과 어린 여성의 힘겨운 삶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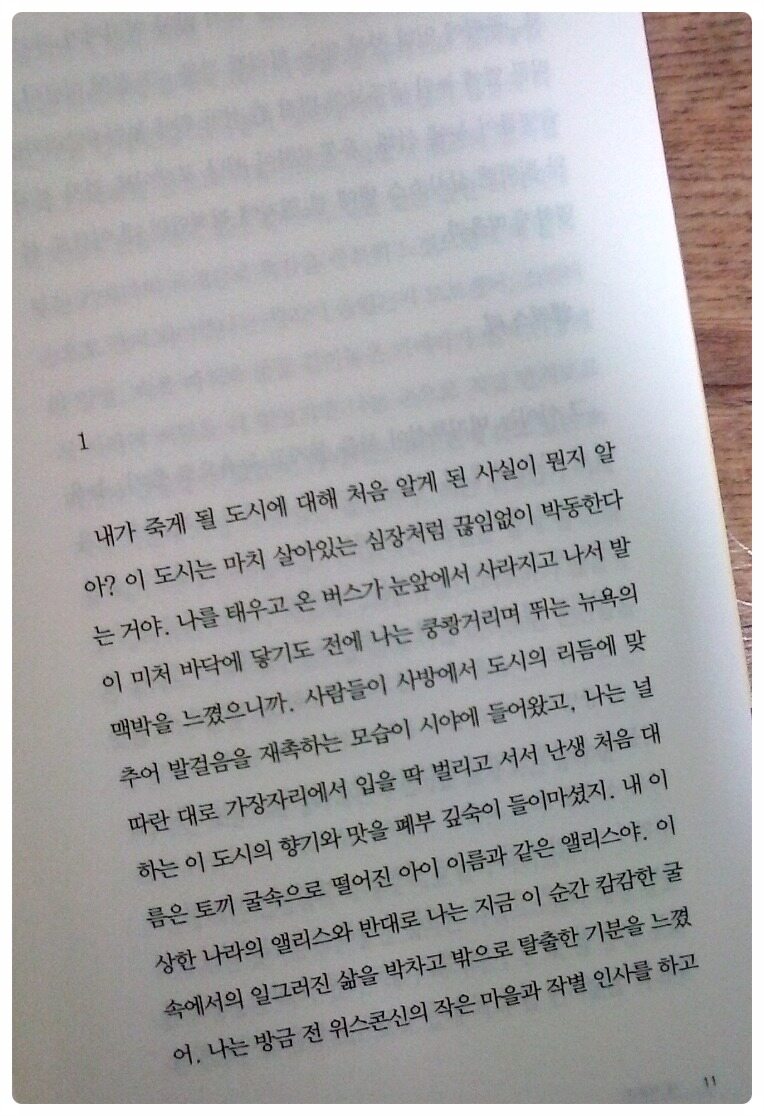
“열네 살, 숨이 끊어진 엄마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 책가방을 손에 든 나는 엄마의 피로 범벅이 된 손가락으로 911에 신고했어.”
예쁜 얼굴의 어린 여성이 낯선 도시 뉴욕에서 마주칠 풍경은 무엇일까. 내용을 아는데도 순간 숨이 멈춘다. 루비와 앨리스의 첫 만남 -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 이 참담하다.
“루비 존스는 허드슨 강가의 자갈밭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한 최초의 목격자야…. 루비는 당연히 나를 볼 수 없었지. 그 대신 자갈밭 위에 엎드린 자세로 널브러져 있는 내 몸뚱이를 볼 수 있을 뿐이었어. 죽은 사람의 모습이 루비의 눈에 보일 까닭이 없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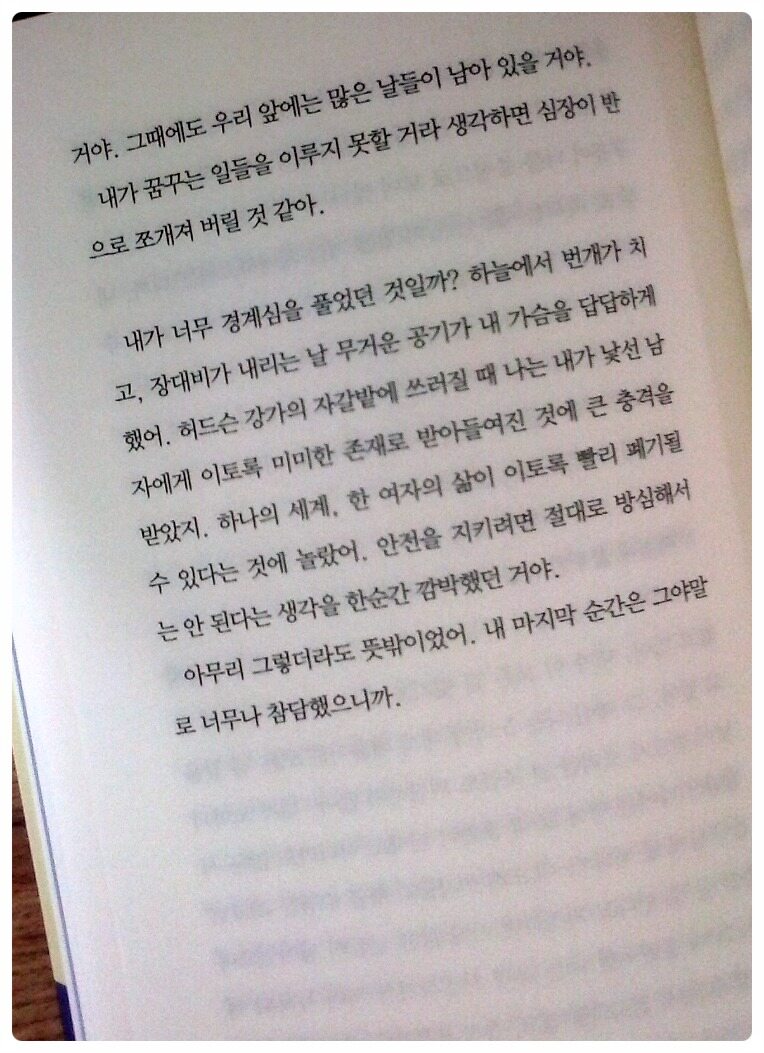
알고 싶지 않지만 때론 숫자로 정확히 파악해야하는 매년 살해된 여성의 수... 전쟁이 아니라도 여성은 한 해 9만 명 정도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여성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집은 여성에게 정말 안전한 장소인가. 거리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면, 집만이 안전할 리가 없다. 생존이 불안한 여성들이 어떻게 꿈을 펼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수사기법이 발전하고 CCTV가 늘어나자 범죄자들은 디지털 공간에 살해와 폭력의 축제 판을 벌였다. n번방은 끝난 적이 없으며, 사건 보도 이후 더욱 정교하게 숨어들고 확장되고 있다.
잇따르는 온갖 생각들로 내 머릿속은 들끓는데, 작가는 아주 담담하게 차분하게 두 여성의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마치 즐거울 일도 웃을 일도 없지만, 슬픔에 빠져 죽거나 분노에 불타지도 말자는 것처럼.
가해자도 경찰도 아닌 피해자의 죽음도 아닌 ‘삶’에 중심을 단단히 두고 마치 못 다한 삶을 기록하듯 전개된 저자의 글에서 힘을 느낀다. 정답이 간절한 질문을 건넨다.
여성은 왜 매일 살해되어야 하는가, 살해된 여성들은 누구였을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어떻게 논쟁을 촉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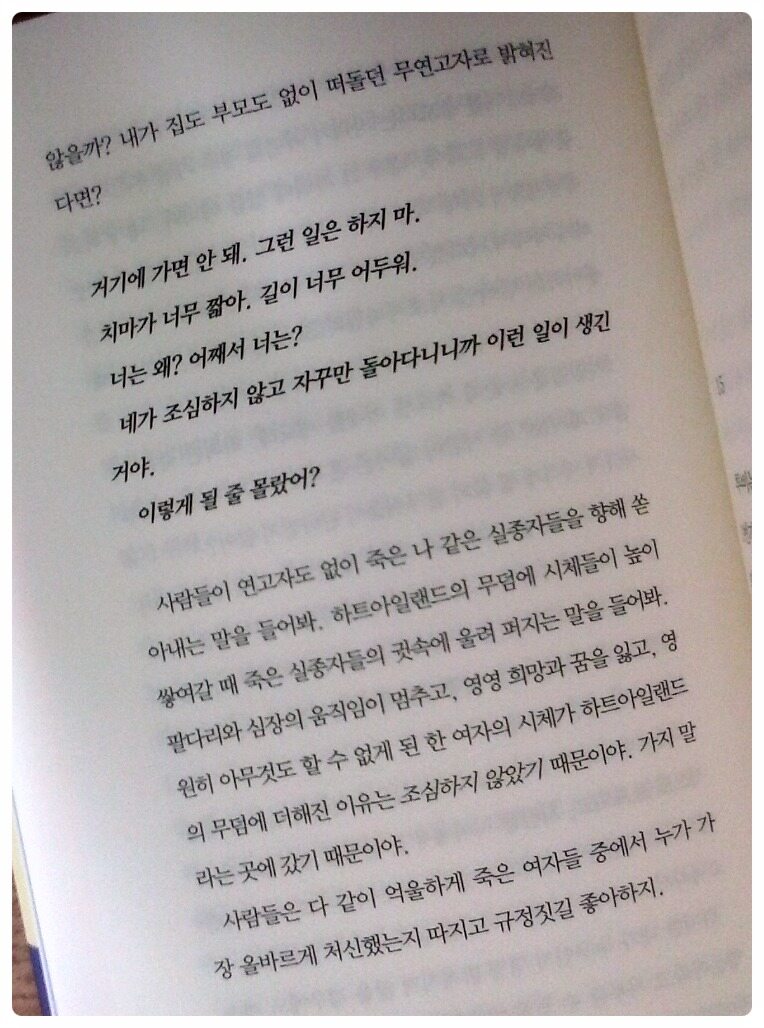
“당신은 이미 나에 대해 알고 있을 거야. 이 세상에는 우리들처럼 죽은 여자들이 정말 많아. 멀리서 보면 우리의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 간혹 우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마치 잘 안다는 듯이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 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당신에게 직접 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 당신은 앞으로 죽은 여자들 모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라게 될지도 몰라. 그 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 (...) 매우 중요한 일이야. 우리가 이미 모든 걸 잃고 난 뒤라고 하더라도.”
